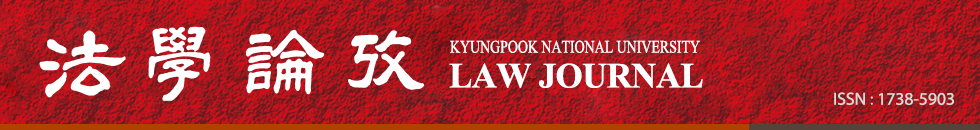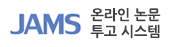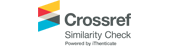Ⅰ. 서 론
2024년 9월 25일,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High-Level Week)에 참석한 26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및 탈레반 ‘사실상 당국(de facto authorities)’에 대해 여성과 소녀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우려하는 국제공동체의 대화 요청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1) 동 성명은 탈레반의 ‘정부’ 지위에 대한 부정을 담아 ‘사실상 당국’이라 지칭하였으며, 관련 조치가 “사실상 당국인 탈레반을 아프간 인구의 정당한 대표로 정치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2) 또한, 아프가니스탄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 의무 위반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사실상 당국인 탈레반이 동 협약에 따른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 철폐를 포함하여, 아프가니스탄의 국제법적 의무를 존중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3) 나아가 26개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9조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협약 위반 중단을 촉구하고자 하는 호주, 캐나다, 독일 및 네덜란드의 구상(initiative)을 지지한다고 밝혔다.4)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당사국 간 교섭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중재재판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재판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에 회부할 수 있다.5)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을 ICJ에서 다룰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6) 특히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ICJ가 협약 위반을 판단한다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7) 이후 2025년 1월 13일 호주, 캐나다, 독일 및 네덜란드는 아프가니스탄 및 탈레반 ‘사실상 정부(de facto government)’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8) 사실상 당국인 탈레반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비협조적 태도를 고려할 때, 동 협약 특별합의 조항에 따라 ICJ로의 분쟁 회부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ICJ로의 분쟁 회부는 탈레반 통치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및 그로 인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 여부라는 실질적 쟁점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국제적 대표성(international representation) 문제도 함께 제기한다. 주지하다시피 2021년 8월 15일 수도 카불을 재장악한 탈레반은 실효적인 지배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가니스탄을 피소국으로 한 ICJ 쟁송사건에서 탈레반이 ‘정부’의 지위로 소송에 참여하고 대리인(agent)을 임명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일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한 ICJ 쟁송사건에서 탈레반이 소송의 실질적 주체가 된다면, 이는 탈레반의 국제적 지위와 아프가니스탄 대표성에 대한 중대한 함의를 내포한다. 현실적으로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확률이 더 높지만, 이 경우 아프가니스탄의 협약 위반 사실을 확인할 뿐 상황 개선의 실익은 없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사안이 ICJ에 회부될 경우, ICJ는 이 문제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이 글은 상기 질문에 대한 논의의 기초로서, ICJ 쟁송사건에 적용되는 당사자 및 대리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대표성 관련 사례를 통해 ICJ가 해당 쟁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 제기를 결정할 국내법상 권한 부재 주장이 제기된 1993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례, 사실상 정부가 제기한 소와 관련된 2009년 온두라스 사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진행되고 있던 소송을 대리하는 2021년 이후 미얀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들 사례 분석을 통해, 탈레반이 향후 ICJ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하여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과 그 전제 조건을 검토하고, 국가 대표성 차원에서의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관련 규정 및 주요 개념의 검토
국제사법재판소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 규정’) 제34조 제1항은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조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내용보다 제외한 내용에 방점이 있다. 즉, 오직 국가만이 쟁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주권국이 아닌 국제기구를 포함한 기타 실체가 ICJ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을 배제하였다.9) ICJ 규정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별도의 정의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유엔 회원국 여부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여 당사자 자격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ICJ 규정의 당연 당사국으로 간주되며, 재판소는 유엔 회원국 모두에게 개방된다.10) 반면,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되거나,11) ICJ 규정 당사국이 아니라도 ICJ 관할권을 수락함으로써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12) ICJ 규정 제40조에 따라 사건은 재판소 사무처장(Registrar)에게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을 통보하거나 서면 신청서(written application)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된다.
ICJ 규정 제42조는 분쟁 당사자인 국가는 “대리인에 의하여 대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항), “법률고문(counsel) 또는 변호인(advocate)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항). 동 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3) 국제재판에서의 ‘대리인’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법률고문 또는 변호인’과의 구별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의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4) 1920년 국제법률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f Jurists)에 따르면, “1) 형식적 통지의 수령 등을 포함한 역할을 수행할 상시 대리인이 필요하고, 2) 정부는 소송의 지배자(dominus litis)이므로 대리인은 반드시 정부를 대표하는 자여야 하며, 3) 개인이 정부를 대신해 절차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지는 전적으로 그 정부와 해당 개인 간의 내부적 조정(internal arrangement) 사항이다.”15)
ICJ는 각국의 상주대표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평상시에는 외교부 장관 또는 네덜란드 헤이그 주재 대사를 통해 재판소 사무처(Registry)와 소통한다.16) 당사자가 되는 경우 당해 소송에 관해 국가를 대표하는 대리인을 임명하여 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17) ICJ 규정이나 규칙에는 대리인을 누가 임명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18) 다만, 대리인으로 임명된 자의 서명이 포함될 경우, 이는 해당 국가의 외교 대표 또는 외교부 권한 당국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19) 대리인은 소송 절차에서 국가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외교부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 등 국제무대에서 해당 국가를 대표하여 발언할 자격이 있는 자가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0)
대리인 임명에 대한 통지는 통상 해당 국가의 헤이그 주재 공관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된다. 한편,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서면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을 명시함으로써 대리인 지정이 통지될 수 있다. ICJ 규칙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은, 신청서 또는 특별협정에 기초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1)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헤이그 주재 대사 또는 외교부의 고위 공무원이 임명된다.22) 한편, ICJ 쟁송사건에서 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으며, 제소국 또는 피소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지명을 받았다면 누구든지 출석할 수 있다.23) 국제법상 ICJ 소송에 관여하는 대리인, 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은 일종의 특별 외교 사절의 수장에 해당하는 지위를 갖는다.24) 또한, ICJ 규정 제40조 제3항은 대리인, 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에게 독립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ICJ 소송의 당사자는 ‘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주체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이다. 정부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임명된 대리인이 소송 절차에서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되며, 해당 정부는 재판에서 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으며, 그 권한 관계는 해당 정부와 개인 간의 내부적 조정에 의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당사자와 대리인에 관한 ICJ 규정은 ‘정부’를 전제로 한다. 절차적으로 당사자인 국가를 ICJ에서 대표하는 대리인은 ‘정부’의 지명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명과 승인은 ICJ가 해당 실체를 그 국가의 ‘정부’로 간주한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하다.
‘정부’는 “국가 권위를 정당하게 담지(legitimate repository of authority of the State)”한 실체로서, 국제사회에서 해당 주권국을 대표하여 발언하고 행위를 할 수 있다.25) 한 국가의 ‘정부’라는 명칭은 국제관계에서의 ‘대표성’에 대한 인정을 내포하고 있다.26) 이러한 인정은 단순히 국내적 실권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국제사회가 해당 실체를 주권국의 대표 기관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국제관계에서의 대표성은 반드시 정부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27) 한편, 여러 실체가 한 주권국의 영토를 나누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더라도, 한 주권국을 국제적으로 대표하는 정부는 오직 하나이며, 나머지는 사실상(de facto)의 실체일 뿐이다.28)
국제법은 국가의 정부 형태나 체제를 규율하지 않으며, 정부의 구성과 성립은 본질적으로 국내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권국 정부의 합헌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국제법상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29) 실제 국제법 질서 내에서 ‘정부 정당성(governmental legitimacy)’의 문제는 국가를 대표하여 발언하고 행위 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기된다.30) 비합헌적인 정부 교체가 발생하거나, 정부 지위를 주장하는 두 개의 실체가 병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31) 전통적으로는 실효적으로 현지를 통치하는 실체(authority in situ)를 ‘정부’로 간주하였다. 반면, 합헌성(constitutionality)이나 정당성(legitimacy)은 그러한 실체가 국제사회에서 해당 국가의 정당한 대표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고려되기는 하였으나,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실효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 또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바탕으로 한 대외적 실효성이 결여된 경우, ‘정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32)
이처럼 국제법상 ‘정부’라는 지위의 정확한 기준이나 결정적인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의 지배자’인 ‘정부’의 지위가 불분명한 경우, ICJ가 국가 대표성(자격 및 권한)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ICJ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사례의 검토를 통해 ICJ의 기준이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국가 대표성 관련 사례의 검토
ICJ에서 당사자 대표 권한의 정당성이 쟁점으로 제기된 사례로는, 국가원수가 ICJ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관련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가 있다.
1993년 3월 2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은 「제노사이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이하, ‘제노사이드방지협약’) 제9조 강제조항에 근거하여,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세르비아-몬테네그로, 이하 ‘유고슬라비아’)을 상대로 협약 위반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3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ICJ 규정 제41조에 근거한 잠정조치 요청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피소국 유고슬라비아는 잠정조치 요청을 심리하는 절차에서 ‘신청국의 정당성(legitimacy of the Applicant)’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대리인을 임명하고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한 알리야 이제트베고비치(Alija Izetbegović) 대통령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도 임기와 정통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34) 유고슬라비아는 관련 이의가 세르비아계 대표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계 대표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제트베고비치 대통령의 임기는 1992년 12월 20일에 만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35) 그러나 재판소는 이제트베고비치 대통령이 유엔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의 국가원수(Head of State)로 인정받고 있고, 국가원수가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관계에서 행위 할 수 있는 권한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므로, 본 사건의 회부를 그 국가의 행위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36)
이제트베고비치 대통령 권한에 대한 이의는 본안 심리 단계에서도 제기되었다. 유고슬라비아는 소 제기의 허용성(admissibility)에 관한 두 번째 선결적 항변에서, ICJ 쟁송사건의 신청과 대리인의 지명은 집단 국가지도부(Presidency) 전체 또는 정부 기관의 결정이 필요한데, 동 사건의 “소 제기 결정은 공화국 국가지도부 의장이 단독으로 내린 것으로, 이는 권한 초과이며 관련 국내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7) 이어 “당시 공화국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집단 국가지도부 의장만이 있었으며, 따라서 위임장에 서명한 기관은 국내법상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라고 주장하였다.38) 이 밖에도 유고슬라비아는 이제트베고비치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39) “일부 국가들이 이제트베고비치를 제소국 대표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법의 중대한 위반이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 구 유고연방 영토에 거주하는 세르비아계 및 크로아티아계 주민들의 대표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무효화(invalidate)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40)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이제트베고비치 대통령이 서명한 공화국의 외교관, 대리인 및 기타 대표들의 신임장이 관련 법과 관행에 따라 국제적으로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41) 따라서 재판소는 이를 주지의 사실(judicial notice of the fact)로 받아들이고, 소 제기의 절차적 유효성을 문제 삼으려는 피소국 측의 시도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2) 나아가 보편적으로 승인받은 정부의 “국내 정치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라는 악의적인 요청을 재판소가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4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헌법적 정당성의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것이며, 이는 피소국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이어 “이제트베고비치 대통령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의 집단 국가지도부 의장으로 정당하게 임명되었으며, 관련 헌법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반박하였다.44)
재판소는 이제트베고비치의 권한 부재를 근거로 한 유고슬라비아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하였다.45) 재판소는 양측 주장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관련 국내법 규정을 직접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46) 재판소는 국제법상 국가원수가 국제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소 제기 당시 이제트베고비치는 특히 유엔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국가원수로서 인정받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후에도 데이턴-파리 협정(Dayton-Paris Agreement)의 서명자를 포함하여 여러 국제기구 및 국제협정에서 이제트베고비치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47)
반면, 피소국 유고슬라비아 측에 의해 임시(ad hoc)재판관으로 지명된 밀렌코 크레차(Milenko Kreća)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상기 다수 의견을 강하게 비판하였다.48) 크레차 재판관은 이 사건이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충돌이 아니라, 양 법체계가 상호의존하는 사안이라고 보았으며, 그 핵심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의 해석에 있다고 강조하였다.49) 또한 유엔에서의 대표성에 초점을 맞춘 다수 의견에 대해,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인 국제적 승인이 헌법에 기초한 법질서를 변경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50) 이에 따라 크레차 재판관은 두 번째 선결적 항변에서 제기된 쟁점에 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 질서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1) 그는 관련 헌법 조항을 검토한 이후, “이제트베고비치는 1992년 12월 21일부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집단 국가 지도부 의장으로서의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52) 그러나 크레차 재판관의 반대 의견은 유고슬라비아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동 사건에서 나타난 ICJ의 기본적인 입장은 정부나 국가원수의 헌법적 정당성은 국내법적 문제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재판소가 고려할 부분은 그 권한에 대한 ‘국제적 인정 여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각국은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국가원수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경우, 국내법상의 직책이나 명칭보다는 그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국가원수로서 인정받고 있는지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53) 따라서 국제사회가 이제트베고비치를 국가원수로 인정하는 이상, 국내적 절차는 그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는다.54) 국제법상 국가원수는 국가를 전면적으로 대표할 권한(ius representationis omnimodae)을 가지며,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행위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한다.55) 따라서 국내법상 특정 사안에 대한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국제법상 국가원수에게 부여된 대표 권한은 다툼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는 추정이 적용된다.56)
당사자 대표 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ICJ가 실제로 고려한 것은 해당 지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는 사실 자체였다. 특히 유엔에서 국가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는지를 주요하게 보았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루이스 도스월드-벡(Louise Doswald-Beck)의 표현을 빌리면, “유엔에서 한 국가를 대표하는 정권의 지위는 단순한 개별 국가의 승인으로는 부여될 수 없는 정당성을 부여한다.”57) 한편, 브래드 로스(Brad Roth)는 “총회의 신임장 표결은 국제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어느 경쟁 세력이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국제사회 내 법적 의견의 균형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였다.58) 실제 다른 국제기구들도 대표성 관련 사안에서 유엔 총회에서의 대표성을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삼고 있다.59) 이는 유엔 산하 여러 기관 내 대표성 문제에 대한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유엔 총회의 결정이 국가 대표성 판단에 일차적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관련 사례는 ‘사실상 정권(de facto regime)’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ICJ에 소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사실상 정권’이라 함은 한 국가의 법적 또는 공식적인 정부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이다.
2009년 10월 28일 ICJ는 온두라스가 브라질을 상대로 “외교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본질적으로 국가의 국내 관할 사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불간섭 원칙과 관련된 양국간 분쟁”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였다.60) 신청서에는 조세 마누엘 셀라야 로살레스(José Manuel Zelaya Rosales)와 그의 일행이 브라질 대사관을 정치적 선전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11월 29일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온두라스의 평화와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61) 또한, 신청서에는 브라질 외교관들이 셀라야 및 그의 일행이 온두라스의 사법절차를 회피할 수 있도록, 대사관의 시설 및 기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62) 따라서, 브라질이 유엔 헌장 제2조 제7항 및 1961년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63) 이 신청서는 당시 ‘임시정부’를 자처하던 로베르토 미첼레티(Roberto Micheletti) 체제하의 외무장관 카를로스 로페스 콘트레라스(Carlos López Contreras)가 ICJ의 대리인으로 임명한 훌리오 렌돈 바르니카(Julio Rendón Barnica) 네덜란드 주재 온두라스 대사가 서명하고 제출하였다.64) 한편, 신청서가 도착한 이틀 후인 2009년 10월 30일, 유엔 주재 온두라스 상임대표이자 셀라야 ‘정부’의 외무장관 명의의 서한이 ICJ 사무처 접수되었다. 이 서한에는 “네덜란드 주재 온두라스 대사는 ICJ에서 온두라스를 정당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Eduardo Enrique Reina) 대사를 유일한 정당한 대표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65)
당시 온두라스는 사실상(de facto) 정부와 법적(de jure) 정부로 분열된 상태였다.66) 소 제기 신청서는 2009년 6월 28일 쿠데타로 셀라야 대통령이 축출되고, 의회로부터 임명을 받아 온두라스를 통치하고 있던 미첼레티의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것이었다. 대통령 축출이 헌법상 정당했다는 미첼레티 정권의 주장 및 온두라스 국내 사법기관의 판단과는 별개로,67) 국제사회는 실효성을 상실한 셀라야 정부의 법적 권한(de jure authority)을 지지했으며, 셀라야 대통령 축출은 국내법상 위헌일 뿐 아니라 국제법상 위법이라고 평가하였다.68) 특히,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총회는 이 사태를 “민주질서의 위헌적 중단”으로 보고, 미주 민주주의 헌장 제21조에 따라 온두라스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69) 유엔 총회도 셀라야 대통령의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며, 온두라스의 합헌적 대통령 외에 어떠한 정부도 승인하지 말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였다.70)
브라질은 실각한 셀라야 대통령을 지지하였으며, 이는 미주기구(OAS) 회원국들과 같은 입장이었다. 브라질은 미첼레티가 이끄는 ‘임시정부’가 정통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ICJ에 소를 제기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보고 해당 사건에 대응하지 않았다.71) ICJ 쟁송사건의 판결은 당사자인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므로, 소송을 수행하는 주체는 국제법상 해당 국가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정부’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자들은 ICJ가 해당 신청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주목하였다. 다포 아칸데(Dapo Akande)는 신청서의 처리가 ‘임시정부’의 온두라스 ‘정부’로서의 지위에 대하여 ICJ가 판단을 내리게 되는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72) 한편, 브래드 로스(Brad Roth)는 온두라스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국제적인 법적 권한과 국내적인 법적 권한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적 규범들에 대한 도전을 시사한다고 평가하였다.73)
미첼레티가 이끄는 정권은 국제적으로 온두라스의 합법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2009년 11월 29일 총선을 통해 포르피리오 로보(Porfirio Lobo)가 집권하기까지 약 7개월간 실효적으로 온두라스를 통치하였다. 2010년 1월 신정부가 출범했으나, 사실상 정권하에서 치른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초기에는 국제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다.74) 점차 다수의 국가가 로보 정부를 승인하였지만, 일부 국가는 끝내 이를 거부하였다.75) 이러한 불확실한 상태는 미주기구(OAS)가 2010년 6월 1일 온두라스의 회원 자격 정지를 해제할 때까지 지속되었다.76)
2010년 5월 3일, ICJ는 온두라스 헤이그 주재 대사관의 임시대리대사(chargé d’affaires)로부터 2009년 10월 28일 브라질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신청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한을 접수하였다.77) ICJ는 브라질 정부가 동 사건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후, 온두라스가 절차를 중단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사건을 목록에서 삭제하였다.78) 만일 이 사건이 철회되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흥미로운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브라질은 온두라스의 소 제기 신청서가 권한이 없는 사실상 정권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점을 들어 소 제기의 허용성 문제를 제기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ICJ는 해당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정부’가 누구인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것이다. 이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건에서 나타난 ICJ의 기준을 볼 때, 온두라스의 사실상 정권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실체가 제출한 신청서로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ICJ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부터 명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79) 통상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도자료 제목에 “국가 X가 소를 제기하였다”는 문구가 사용되지만,80) 이 사건에서는 제목에 단지 “소송을 제기하는 신청서가 재판소에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다.81) 또한, 보도자료 본문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문서(document)’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82) 실제 온두라스의 사건은 신청서가 접수된 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공식 개시는 신청서가 접수된 뒤 일반목록(General List)에 등재되고, 사건명 및 번호가 부여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이는 재판소 사무처장이 재판소장과 협의하여 수행하는 내부 절차이며, 신청서 접수 후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된다면 관할권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사건을 등재한다. 그러나 온두라스의 신청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일반목록에 바로 등재되지 않았다.83) 이는 소 제기 주체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고려한 ICJ의 선제적이고 유보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2025년 진행 중인 「제노사이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이하, ‘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관한 감비아 대 미얀마 사건이다. 이 사례는 앞서 검토한 온두라스 사례와 대조된다.
2019년 11월 11일 감비아는 ICJ에 미얀마 연방공화국을 상대로 제노사이드협약 위반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84) 감비아는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에 대해 채택하고, 실행하며 묵인한 행위”가 제노사이드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ICJ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분쟁의 악화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잠정조치 명령을 요청하였다.85) 미얀마는 국가고문(State Counsellor)이자 외교부 장관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를 대리인으로, 우 쿄 틴 스웨(U Kyaw Tint Swe) 국가고문실 장관을 대리 대리인(alternative agent)으로 지명하였다.86) 수치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진행된 잠정조치 요청에 대한 공개심리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다.87) 로힝야족에 대한 군부의 군사작전을 옹호한 수치의 변론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지만, 미얀마를 대표하는 자격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88) 2020년 1월 23일 로힝야족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실질적 위험이 존재함을 인정한 ICJ는 잠정조치 명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89) ICJ는 미얀마가 제노사이드협약 상 예방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최초 보고서를 4개월 이내에 제출하며, 이후 6개월마다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90) 이에 따라 수치 정부는 2020년 5월 22일과 2020년 1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91) 이후 2021년 1월 20일 미얀마는 재판소의 관할권 및 감비아의 당사자 자격 등 소 제기의 허용성에 관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문서는 당시 미얀마를 대표했던 수치의 서명을 통해 제출되었다.92)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21년 2월 1일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이 이끄는 수치 정부가 쿠데타로 전복되었다. 실효적으로 미얀마를 장악한 군부(타트마도우, Tatmadaw)는 자신들이 2008년 미얀마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력을 얻은 정당한 정부라고 주장하였다.93) 대외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군부는 2021년 4월 12일 ICJ에 대리인과 대리 대리인의 변경을 바로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NLD 정부 전복 이후 해산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민대표위원회는 2021년 4월 16일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NUG)를 수립하고, 구금 중인 수치를 국가 고문 겸 외교부 장관으로 추대하였다. 이에 따라, 군부가 구성한 국가 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 SAC)와 민주적 정당성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NUG 망명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미얀마를 대표할 권한을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94)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ICJ는 2021년 9월 17일 선결적 항변 심리 기일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군부는 COVID-19 상황과 법률 대리인단 구성 변경 등을 이유로 심리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9월 24일 제출하였다.95) ICJ는 미얀마와의 소통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CJ는 형식적으로 사무처에 등록된 브뤼셀 미얀마 대표부 주소로 기한을 통지하고, 군부 측에서 제출한 서한 역시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2월 1일 NUG 망명 정부는 ICJ에 제노사이드협약 적용 사건에 대한 선결적 항변을 모두 철회한다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96) 또한, NUG는 이 소송의 대리인 및 대리 대리인이 군부에 의해 구금되었으므로, 유엔 주재 미얀마 상임대표 쿄 모 툰(U Kyaw Moe Tun) 대사가 ICJ에서 미얀마를 대표할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임시 대리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였다.97) 그러나 ICJ는 NUG 망명 정부의 항변 철회 통지나 임시 대리 대리인 지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결국, 2022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심리에서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새롭게 지명된 국제협력부 장관 코코 흐라잉(Ko Ko Hlaing)이 대리인으로, 법무부 장관 티 다 우(Thi Da Oo)가 대리 대리인으로 출석하였다.98)
당사자 변론에 앞서 재판장 조앤 도노휴(Joan Donoghue)는 “ICJ에서 다투는 사건의 당사자는 특정 정부가 아니라 국가”임을 간략히 언급하였다.99) 피소국 미얀마의 첫 변론에서 흐라잉은 자신이 새로운 대리인임을 밝혔으나,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100) 이후 ICJ는 2022년 7월 22일 선결적 항변에 관한 판결문에서 2019년 11월 20일 지명된 아웅산 수치와 쿄 틴 스웨가 2021년 4월 12일 통지에 따라 각각 코 코 흐라잉과 티 다 우로 교체되었다고만 간단히 언급하였다.101)
임시 재판관(Judge ad hoc) 클라우스 크레스(Clause Kress)는 판결에 대한 선언적 의견에서, 대리인 교체에 대한 판결문의 간단한 서술이 법적으로 자명하지 않은 문제를 마치 자명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102) 또한 2021년 6월 21일 유엔 총회 결의 제75/287호를 인용하며, 해당 결의가 쿠데타를 규탄하고, 수치 및 NUG 정부를 ‘정부 기관’으로 지칭한 반면, 군부는 ‘미얀마 무장군(Myanmar armed forces)’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103) 실제로 2021년 12월 유엔 총회 산하 신임장위원회(Credential Committee)는 미얀마 군부가 제출한 신임장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였다.104) 이에 따라 이전 NLD 정부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유엔 주재 미얀마 상임대표 툰 대사가 여전히 유엔에서 미얀마를 대표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 체제 내에서 미얀마 군부가 합법적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ICJ는 미얀마의 대표성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단지 브뤼셀 주재 미얀마 대표부를 통한 재판 관련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군부의 서한과 군부가 임명한 대리인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105) 이는 대표성 논란에 신중하게 접근했던 온두라스 사례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와 관련해 마크 웰러(Marc Weller)는 ICJ의 이른바 ‘우편함 접근법(letter box approach)’이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한 군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였다.106) 나아가 ICJ의 이러한 접근이 NUG 정부의 존재와 정당성 주장을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미얀마를 국제적으로 대표할 권리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지적하였다.107) 이는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관력을 반환할 것을 촉구한 유엔 체제 내 다른 기구의 입장과도 명백히 충돌한다. 특히 ICJ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건에서 유엔 총회에서의 대표성 여부를 ‘국제적 승인’의 핵심 지표로 간주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할 때, 유엔 총회의 입장이 명확히 공식화되기 전에 ICJ가 대표성 문제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면서 군부를 미얀마 대표로 수용한 것은, 국가 대표성 판단에 있어 유엔 총회의 지침을 참고해 일관성을 추구해 온 기존 관행과도 어긋난다.108)
ICJ에서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를 대표한 것이 곧바로 군부가 미얀마의 ‘정당한 정부’로 승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는 단지 절차상 기존 상태가 유지된 결과일 뿐, 정치적 승인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109) 그러나 비록 명시적인 승인이나 대표성에 관한 공식적 결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ICJ가 미얀마를 국제적으로 대표할 자격이 있다는 군부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였거나 그렇게 보일 위험이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110) 이는 유엔 총회의 향후 판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선행하여, 충분한 숙고와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에서 재판소가 최소한 소극적인 방식으로라도 대표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판소의 이전 관행과 유엔 총회의 일관된 입장과도 명백히 대조된다. 또한, 승인이 외교적·행정적 실무의 일상적 대응을 통해 묵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ICJ에서 군부가 미얀마를 대표하게 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군부의 대표성과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Ⅳ.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사례의 검토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 캐나다, 독일 및 네덜란드가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사실상 정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결정함에 따라, ICJ에 분쟁이 회부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을 당사자로 한 ICJ 쟁송 사건이 진행될 경우, 사실상 당국인 탈레반을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로 간주하고, 탈레반이 임명한 대리인의 대표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2021년 8월 15일 수도 카불을 재장악한 탈레반은 최고 지도자 물라 히바툴라 아쿤드자다(Mullah Hibatullah Akhundzada)와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지도부 위원회(Leadership Council)가 이끄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리트(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의 수립을 선언하였다.111)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대한 실효적 통치에도 불구하고, 집권 4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로 승인한 국가는 없다.112) 이는 탈레반이 1990년대 중반, 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로부터 정부승인을 받았던 1차 집권기보다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113) 한편, 유엔 신임장위원회는 2021년 뉴욕 주재 아프가니스탄 상주대표부가 보낸 9월 14일자 서신과, 탈레반이 구성한 외교부 명의의 보낸 9월 20일자 서신을 모두 접수하였으나, 복수의 신임장에 대한 결정을 유예하였다.114) 이에 따라 여전히 아쉬라프 가니(Ashraf Ghani) 전 대통령이 임명한 나시르 아흐마드 파이크(Naseer Ahmad Faiq) 임시대사(Charge d’Affaires)가 유엔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하고 있다.115) 유엔은 2024년 도하에서 탈레반과 세 차례에 걸친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탈레반을 여전히 ‘사실상 당국’으로만 지칭하고 있으며, 국제적 정통성(international legitimacy)을 갖춘 아프가니스탄의 대표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116)
탈레반의 여성에 대한 차별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ICJ로의 분쟁 회부 가능성을 고려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대표성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은 ICJ가 최근 미얀마 사건에서 사실상 당국인 군부가 국가를 대표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탈레반 역시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과 관련된 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117) 또한, ICJ 쟁송사건은 국가 간 소송이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정부’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118) 즉, 탈레반이 국제사회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송 수행 권한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ICJ에 아프가니스탄을 제소하는 것이 자칫 탈레반을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119)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9조는 협약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이 당사국 간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먼저 중재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에 중재재판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ICJ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ICJ는 유사한 사건에서 특별합의 조항의 ‘교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120) 따라서 제소국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실질적인 교섭을 시도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곧 교섭 상대방의 지위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는 탈레반의 행위가 ‘사실상 당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 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국가책임의 문제와는 다르며, 교섭의 당사자로서 탈레반을 인정하는 것은 정부승인과 직결된다는 것이다.121) 따라서 탈레반의 경우 미얀마 사건처럼 “ICJ 당사자는 특정 정부가 아닌 국가”라는 형식논리로 대표성 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이 통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Ⅱ장과 Ⅲ장에서 검토한 관련 규정과 이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건처럼 국제적 승인, 특히 유엔 총회에서의 대표성이 당사자 대표 권한 판단의 핵심 기준이라면, 신임장위원회의 결정이 유예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정부’의 지위로 관련 소송의 대리인을 임명할 정당한 권한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와 같은 대표성 문제를 ICJ가 절차 진행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아니면 항변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 판단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을 피소국으로 하는 ICJ 쟁송사건이 개시되어 탈레반이 대리인을 임명하고 소송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 권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제소국은 원래 아프가니스탄 내 ‘사실상 당국’의 협약 의무 위반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므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한다는 점에 이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온두라스 사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례 모두 제소국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논의였다.
만일 아프가니스탄을 피소국으로 한 ICJ 쟁송사건에서 탈레반이 관련 항변을 제출하고 출석한다면, 이는 탈레반의 국제적 대표성에 어떤 함의를 가지게 되는가? 현실적으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탈레반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 주권국의 ‘정부’의 지위 또는 대표성의 문제는 개별 국가의 일방적 행위인 정부승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국제기구 관행의 축적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관여는 해당 실체의 ‘국제적 정통성(international legitimacy)’의 형성과 연관되며, 이는 국가 대표성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122) 결국 국제적인 장에서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는 대표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레반이 ICJ 소송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국제적으로 '사실상 대표'하는 하나의 사례로 작용하며, 이러한 사례가 축적될 경우 궁극적으로 탈레반의 대표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Ⅴ. 결 론
ICJ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이지만, 소송을 사실상 수행하는 주체는 해당 국가의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정부’이며, 그 정부가 임명한 대리인이다. ICJ가 정부의 합헌성을 직접 판단한 경우는 없지만, 국제적 대표성이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기본적인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건에서 ICJ는 국가원수의 권한 부재에 관한 항변을 심리하면서 국내법을 직접 검토하는 대신, 국제적 승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특히 유엔 총회에서의 대표성은 국제적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기준으로 보았다. 두 번째 온두라스 사건에서는 사실상 정권이 제기한 소에 대해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정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례는 국제적 대표성이 있는 ‘정부’의 지위가 단순히 국내적 실효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세 번째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를 대표하여 소송에 참여한 상황은 앞선 두 사례에서 보인 ICJ의 기준 및 접근방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ICJ는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이며 특정 정부가 아님을 강조했지만, 군부가 보낸 서신과 출석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대리인으로 인정한 것은 소송 사무 진행에 있어 형식적으로만 접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 사례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유엔 총회의 신임장 관련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이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사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ICJ의 대표성 판단 기준이나 접근방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송은 사실상 당국인 탈레반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의무 위반에 책임을 묻기 위한 압력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탈레반의 협약 의무 위반을 ICJ에서 다루자고 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대표성 문제를 수반한다. 본안 심리를 통해 사실상 당국의 통제 지역 내에서의 협약 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ICJ 소송에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하게 된다면 이는 탈레반의 국제적 대표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는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 특히 유엔 내 대표성과도 충돌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과 소녀를 극단적 이슬람주의 해석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차별하는 탈레반은 아프간 인구를 정당하게 대표하는 실체로 보기 어렵다.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한 ICJ 분쟁 회부 논의는 단순한 조약 해석 및 적용의 문제를 넘어, 국가 대표성 인정과 그 기준에 대한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법적·정치적 함의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