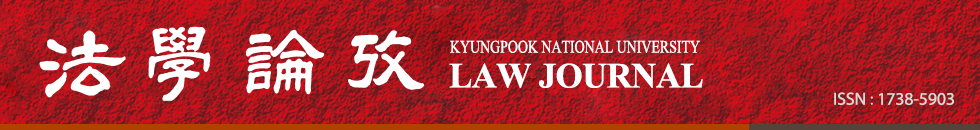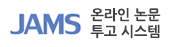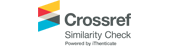Ⅰ. 문제의 소재
젠더 스테레오타입이란 성, 성별 및 성역할 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인식, 선입견, 편견 내지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성, 성별, 성역할 등은 젠더이고, 성에 대한 편향된 인식, 선입견, 편견 내지는 고정관념은 스테레오타입이다. 젠더 스테레오타입은 한마디로 성 혹은 젠더에 대한 편향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성 고정관념 혹은 젠더 고정관념이다.1) 성 혹은 젠더에 대한 편향된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젠더 스테레오타입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젠더평등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3)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 이하 ‘CJEU’ 혹은 ‘재판소’)도 유럽통합 초기부터 판례를 통하여 남녀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재판소는 젠더 고정관념이 유럽단일시장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 내지는 강화한다는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Sabbatini 판결(1972)4)을 시작으로 재판소는 젠더 평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유럽당국으로 하여금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금지하는 법규를 제정하고, 또한 제기된 분쟁사안에서 사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도록 법해석과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근 유럽위원회는 「젠더평등전략 2020-2025」5) 정책과제에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첫 번째 우선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6) 하지만 EU가 이 전략에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이 문제가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개념과 유형은 다양하며, 아직 학문적으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담론이 형성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다. 또한 관련 판례도 풍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판소의 판단태도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면, 재판소는 젠더 평등 전반에 내재해있는 고정관념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일관성 있는 판단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재판소가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판단을 강화하는 입장을 취면서도 성 혹은 젠더평등에 관한 모든 판결에서 전적으로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재판소의 이와 같은 이중적 태도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판단태도에서 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구체적 입장은 무엇인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판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 지, 또한 앞으로 재판소가 당면할 도전과제가 무엇인 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젠더 스테레오타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판례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II), 임신 및 모성보호(III), 적극적 조치(IV)와 간접차별(V)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주요 판례에서 제기된 젠더 스테레오타입 관련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재판소의 판시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기로 한다.
Ⅱ.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CJEU의 판례 동향
동등대우원칙를 비롯한 성평등과는 달리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재판소의 판례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재판소는 이 주제를 차별금지 혹은 대우평등원칙에 포함시키거나 성 혹은 젠더의 일반사항과 결부시켜 판단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판소는 남성과 여성의 대우평등원칙을 보장하고, 이를 저해하는 직접차별의 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판단태도를 보이는 반면,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특히 회원국이 취한 성 차별적 조치에서 두드러진다.
회원국들이 성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조치를 채택할 때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은 지침 76/2077) 제2조 2항이다. 회원국들은 직업 활동과 그와 관련된 직업훈련 분야에서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이나 직무가 수행되는 상황에 따라 노동자의 성별을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이 취하는 조치는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남성지배적인 직업에 대한 여성의 접근에서 취해지고 있는데, 회원국은 성별과 여성의 보호라는 두 가지 이유로 성 고정관념에 의한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하고 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조치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직무의 성격이나 직무가 수행되는 상황에 따라 노동자의 성이 결정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특정 작업의 경우에 남성이 당해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 고정관념이 극명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경찰과 군대이다. Johnson 사건 판결8)에서 보듯이 이 두 가지 직역은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총기를 취급하고 군사훈련 및 전투를 훨씬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강한 분야이다. 통상 국가안보를 위해 경찰과 군대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젠더 스테레오타입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회원국이 채택하는 차별적 조치이다. 이러한 유형의 조치는 여성의 (잠재적) 모성애를 이유로 그들의 ’취약성(vulnerability)’, 특히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에 대하여 여성을 ‘보호’할 때 정당화된다.9)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소는 한편으로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판단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10)
재판소의 원칙적 입장은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판단의 강화(reinforcing gender stereotypes)이다.11) 이를테면, Hofmann 사건에서 재판소는 임신 중과 그 이후의 여성의 생물학적 조건 보호(the protection of a woman’s biological condition during pregnancy and thereafter)에 중점을 두고 여성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임신 기간 동안과 출산 이후 여성과 아동의 특별한 관계를 보호하고, 동시에 취업에 따른 여러 부담으로 인해 양자의 관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2) 이처럼 재판소는 임신 중과 그 이후 여성의 보호를 강조하면서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위 입장과는 달리 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여성의 ‘생물학적 조건 보호 필요성’이란 판시 태도는 전형적인 ‘가부장주의적 접근방식’이다. 이후의 판결에서도 재판소의 이 입장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는데, 그 예로 1997년 Marschall 사건 판결을 들 수 있다. 재판소는 “남성과 여성 후보자가 동등하게 자격을 갖추더라도 남성 후보가 여성 후보보다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성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특히 직장 생활에서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예를 들어, 가사 및 가족에 대한 의무로 인해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임신, 출산 및 모유 수유로 인해 더 자주 결근하며, 또한 경력이 중단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등을 그 판단 사유로 들고 있다.13)
그런데 상기 Marshall 판결과 비교하여 최근 재판소가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대하여 한층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2010년 Roca Álvarez 판결과 2015년 Maistrellis 판결에서 재판소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부모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남성을 여성의 보조적 역할에 한정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기여 상태를 영속화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4) 이 판결에서 재판소는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을 어머니(母)에게 부과하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父)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재판소의 미온적 입장이 강화의 방향으로 전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소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직업에서 여성의 지위에 관한 Johnston v Royal Ulster 판결15)과 여성의 야간작업에 관한 여러 판결16)에서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소도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최근 논의 경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재판소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contesting gender stereotypes)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재판소의 전통적인 입장은 특정 집단의 개인과 관련된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하여 취해진 조치를 직접적인 차별의 표시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젠더 스테레오타입이 명시적으로 발생하면, 재판소는 직접적 성 차별(direct sex discrimination)의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해 왔다. 문제는, 고정관념과 관련한 실제 사건은 직접적 성 차별뿐 아니라 묵시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발생한다는 데 있다. 중립적 규범과 관행은 기존의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한 그 규범과 관행은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할 수 있다. 재판소도 이러한 현상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이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업무에 덜 헌신적이라는 고정관념은 여성을 간접적으로 차별하기 위한 객관적 정당화를 주장하는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재판소는 단시간 여성 노동자(part-time women workers)를 차별하는 전형적인 젠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보고 있다.17)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근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재판소의 입장에는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정체성의 여러 측면이 결합하여 차별을 야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판소는 여전히 이를 성에 근거한 차별(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로 규정하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테면, 나이(연령)는 물론 젠더의 특성을 가지는 임신과 자녀 양육 등에 대해 재판소는 이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와 젠더 정체성에 관한 사안을 판단하면서도 재판소는 이를 ‘성 차별(sex discrimination)’로 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인종 또는 민족 차별에 대한 소수의 사례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재판소는 질병이나 비만을 장애로 볼 것인가에 대해 장애의 경계에 대해 검토하기도 했다.18)
또한 재판소는 간접차별과 교차접근방식을 통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성 평등 관련 지침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판소 판례를 통해 그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19) 이에 반하여, 후자를 언급한 지침이나 이를 다루는 판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는, 재판소가 청구인에게 교차접근방식(intersectional approach)보다는 단일 축 접근방식(single axis approach)에 의거하여 사안에 접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안의 특정 측면에만 집중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교차접근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의 권력 관계가 수직적이 아닌 다각적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가지는 소모적 특성으로 인해 소송 절차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20) 이 점은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법리를 확립하는데 있어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다.
위에서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재판소의 일반적인 판례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젠더 스테레오타입과 관련한 사례 중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임신 및 모성 보호, 적극적 조치, 간접차별을 중심으로 재판소가 내린 주요 판결과 판시태도를 분석한다.
Ⅲ. 임신 및 모성 보호와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CJEU의 판시태도
여성의 임신, 안전한 출산과 건강관리 및 영유아의 생존은 생명권 보장의 핵심이다. 또한 이 문제는 여성이 제공하는 양질의 노동과 생산성의 향상과 직결된다.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든 집에서 수행하는 무급노동이든,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든 일하는 여성이 노동과 모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1) EU는 로마조약부터 남녀평등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임신 및 모성보호와 관련한 조치가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태도는 재판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전형적인 사례로 1984년 7월 12일자 Hofmann 사건 판결을 들 수 있다.22)
이 사건은 1976년 2월 9일자 상기 이사회 지침 76/207의 제1, 2, 5(1)조의 고용 및 취업에 대한 남녀평등대우원칙의 이행에 관한 해석에 관하여 제기되었다. 함부르크에 거주하는 울리히 호프만(Ulrich Hofmann, 원고)은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여성(동거녀)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한 아이(사생아 私生兒)의 아버지이다. 동거녀는 8주간의 의무출산휴가(the statutory protective period of eight weeks)가 끝나자 다니던 직장으로 복직하였다. 원고는 자녀 출생 8주 이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용주로부터 무급휴가를 받았다. 그 기간 동안 원고는 동거녀가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았다. 사건 당시 독일법에 의하면, 여성노동자의 경우 8주간의 의무출산휴가가 끝나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 자녀 출생 후 6개월이 도래하는 날까지 유급휴가로 인정하였다. 원고는 독일법이 여성 산모에게 인정하는 이 권리는 이사회 지침 76/207에 따라 남성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출산휴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독일국내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지침 76/207은 남녀의 법적 평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여성의 필요(women’s needs)’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임신 중 및 출산 후 생리 및 정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성의 생물학적 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둘째,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고용을 추구함으로써 초래될 여러 부담으로 인해 그 관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임신과 출산 이후의 기간 동안 ‘여성과 자녀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보호하는 것’은 합법적이다.23) 이 판결은 이후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EU 성 평등을 판단하는 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Hofmann 사건 판결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24)
첫째, 재판소는 임신, 출산과 양육에서 여성과 자녀 사이의 특별한 관계 보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원칙적으로 ‘모자관계’가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일차적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아동의 주요 양육자는 여성이라는 전제 아래 모성은 보호의 대상이 되나 부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이사회 지침 76/207을 비롯하여 독일 국내법은 아버지의 육아휴직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비한 상태에 있다.
둘째, 자녀 출산 후 여성이 양육과 직업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여러 부담으로 여성과 자녀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방해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문제이다. 다만, 이 시각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면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여성이 남성 노동자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셋째, 재판소의 위와 같은 입장은 이사회 지침 76/207은 고용 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대우에 관한 것으로 '가족 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모 간의 책임 분담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여실히 드러나 있다. 한마디로 재판소는 EU법이 부모에 관한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위 사건 판결에 대해 재판소가 부모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관념을 강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EU의 평등대우원칙에 관한 법제도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를테면, 이 판결 이후 EU당국은 임신 및 모성보호에 관한 “임산부노동자지침(Pregnant Workers Directive, 1992),25) ”개정지침(Recast Directive, 2006)26) 및 “육아휴가지침(Parental Leave Directive, 2010)27)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그리고 Hofmann 판결 이후 모성 보호에 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Roca Álvarez28)와 Maïstrellis29) 사건 판결을 들 수 있다. 두 사건 모두 부모공동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것이다.
Roca Álvarez 사건에서 재판소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여성에게만 인정하는 스페인 국내법은 남성을 차별한다며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가 제출한 바와 같이 고용인의 지위를 가진 어머니만이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육아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반면 동일한 지위를 가진 아버지는 이 권리만 향유하고 그 향유자는 아니라는 주장은, 부모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남성을 여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간주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전통적인 분담을 영속화시키는 책임이 있다.”30)
위 판단태도는 Maïstrellis 사건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부모공동 육아휴직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 정부에 대해 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게다가 지침 2006/54의 제3조와 관련하여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조항은 직장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부모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남성을 여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전통적인 분담을 영속화시키는 책임이 있다.”31)
이 두 판결은 Hofmann 사건보다 한층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후자가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이 여성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의 기반 위에 서있는 반면, Álvarez와 Maïstrellis 판결은 남성도 양육을 분담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판결은 EU 회원국의 국내법에도 영향을 미쳐 부모공동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32)
Ⅳ. 적극적 조치와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CJEU의 판시태도
적극적 조치(혹은 적극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positive action)란 주로 고용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우대하는 사회정책을 말한다. 이 개념은 미국에서 흑인과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 용어는 고용에서 남성과 여성 간 불평등을 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해 행해진 과거의 부당한 대우를 보상하기 위하여 취해진 많은 다양한 조치와 정책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33)
이 조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EU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 의하면, “적극적 조치의 개념은 과거의 차별의 효과를 무효화시키고, 존재하는 차별을 철폐하며, 또한 ... 특히 직업의 형태 혹은 수준과의 관련성 속에서 여성과 남성 간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킬 목적을 가지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34) 이 의미에서 적극적 조치는 과거의 차별의 효과를 무효화시키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을 철폐하며, 또한 남성과 여성, 즉 양성의 기회 평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국 과거 혹은 현재의 차별의 무효화 및 철폐를 통해 적극적 조치는 양성평등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35)
EU 차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최초의 공식문서는 1984년 12월 13일자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촉진에 관한 이사회 권고”36)이다. 이 권고에서 이사회는 회원국에게 고용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아래 두 가지 이유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고용에서 여성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고 상쇄하기 위함이다.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대우평등에 관한 기존의 법률 조항은 남성과 여성 간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전통적 관념에 의거한 정부, 산업계 및 기타 관련 기관이 사회적 태도, 행동 및 구조에서 발생하는 고용상의 여성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거나 혹은 상쇄하기 위한 병행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기존의 모든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37)
두 번째 이유는 고용에서 과소 대표되는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모든 인적 자원의 더 나은 사용을 달성하기 위해 과소 대표되는 현재의 노동 영역뿐 아니라 특히 미래 노동영역에서,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에서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도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38)
이 권고 이후 EU 당국은 이차입법을 통하여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불합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를테면, “작업 중 임신, 출산 혹은 수유를 필요로 하는 여성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제조치의 이행에 관한 1992년 10월 19일자 이사회 지침 92/85/EEC”39) 및 “성에 의거한 차별의 경우에 있어 입증책임에 관한 1997년 12월 15일자 이사회 지침 97/80/EC”40) 등을 그 주요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으며, Kalanke 사건 판결(1995)41)를 시작으로 Marschall 사건 판결(1997년)42)를 비롯하여 다수의 소송이 재판소에 제기되었다.43) 이 가운데 Marschall 사건은 EU법상 적극적 조치에 관한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젠더 스테레오타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다.
Kalanke와 Marschall 사건은 ‘개방조항(saving clause)’이 EU의 남녀평등지침에 위배되는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개방조항이란 여성이 과소 대표되고 있는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여성에게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인 우선권을 허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Kalanke 사건에서 재판소는 개방조항이 남녀평등지침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나 Marschall 사건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44)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인정함으로써 EU법상 남녀동등원칙뿐만 아니라 젠더 스테레오타입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재판소는 여성이 과소 대표되고 있는 영역에서 여성에게 승진과 채용 등 고용에서 할당제를 비롯한 우선권을 보장해야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인정해야 하는 근거로 사회에 만연한 고정관념을 들고 있다.
고용 현실을 살펴보면, 남녀 후보자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도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 후보자가 여성 후보자보다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관행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테면, 직장 생활에서 역할 및 능력과 관련하여, 임신, 출산, 모유 수유 및 자녀의 양육 등으로 여성은 자신의 경력을 자주 중단할 것이며, 가사 및 가족에 대한 의무감으로 인해 노동 시간의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결근할 것이라는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위와 같은 고정관념은 여성의 젠더 역할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나름의 특정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남성보다는 특히 여성의 젠더 역할에 보다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재판소는 고용과 승진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능력에 대한 젠더에 의거한 고정관념이 있다고 보고,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간접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간접차별을 중심으로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재판소의 판시태도에 대해 분석한다.
V. 간접차별과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CJEU의 판시태도
EU법상 “합리적 이유 없이 성이나 연령, 신체조건, 성적 지향 등 개인의 태생적 또는 후천적 속성을 기준으로 그 개인에 대해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45) 직접차별은 엄격히 금지된다. 문제는 간접차별이다.
간접차별이란 “법, 정책, 관행들이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차별금지사유에 따른 권리 행사에서 불균등한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의 차별”을 의미한다. 직접차별과 마찬가지로 간접차별도 ‘동일(혹은 동등)하고 중립적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직접차별과 달리 간접차별은 동일·중립기준을 적용한 결과 오히려 ‘불리한 효과’가 초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균등 혹은 불평등한 영향을 받거나 대우’함으로써 야기되는 차별을 말한다.46) 따라서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근거한 차별을 논의할 때 직접차별보다는 간접차별을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직접차별과 마찬가지로 간접차별도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므로 겉으로는 성별에 따른 모든 차별은 금지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되는 ‘동일하고 중립적인 기준’이 오히려 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결과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47)
간접차별은 업종이나 직종 혹은 지역 등을 묻지 않고(즉,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남성 혹은 여성이 과소 혹은 과잉대표 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48) 2017년 베를린사회과학센터(Berlin Social Science Center, WZB)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견습 기회를 얻을 기회가 더 적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남성 지배적인 산업(male-dominated industries)에서 두드러지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견습생 선발 때부터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49) 또한 2019년 노동경제연구소(Institute of Labor Economics, ILE)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임원들은 여성 노동자(직원)들을 대할 때 칭찬을 해야지 절대 비난하거나 꾸중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결과는 특정 성 역할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50)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따른 간접차별은 재판소의 판례에서 똑같이 확인할 수 있다. Jenkins 사건(1981)51) 및 Bilka 사건(1986) 판결52) 등에서 재판소는 남성보다는 여성, 또한 전일제 노동자보다는 시간제 노동자, 그리고 남녀 모두 전일제 노동자라도 기혼 여성이 빈번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였다.53) 이 판결을 통해 재판소는 ① 성 중립적 차별, ② 차별적 효과로 인한 피해의 발생, ③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와 같은 세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간접차별로 본다는 기본원칙을 확립하였다.54)
문제는 직접차별과 달리 간접차별은 실제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젠더 스테레오타입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열등 또는 우월에 근거한 전형적인 성 고정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어 적잖은 논쟁을 유발시키고 있지만55) 이것이 간접차별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적잖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Achbita 사건56)에서 재판소는 이슬람 여성노동자의 머리스카프 착용 금지의 정당화를 둘러싸고 상당히 흥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57) 재판소는 노동자가 직장에서 눈에 띄는 정치적, 철학적 또는 종교적 표지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회사의 규정은 직접차별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슬람여성노동자에게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간접차별이라며 아래와 판단하였다.
“직장에서 정치적, 철학적 또는 종교적 기호를 시각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기업의 내부규칙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슬람 머리 스카프 착용 금지는 지침 2000/78의 2(2)(a)조의 의미 내에서 종교 또는 신념에 근거한 직접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기 사기업의 내부규칙은 그것이 부과하는 명백한 중립적 의무가 실제로 특정한 종교나 믿음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지침 2000/78 제2(2)(b)조의 의미 내에서 간접차별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가 고용주의 고객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철학적·종교적 중립정책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정당한 목적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지,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국내)법원이 확인해야 한다.”58)
재판소는 노동자가 직장에서 눈에 띄는 정치적, 철학적 또는 종교적 표지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회사의 규정은 직접차별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슬람여성노동자에게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간접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머리스카프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 착용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직원의 외모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중립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머리스카프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 착용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고객과 시각적으로 접촉하는 직원에게만 머리스카프를 금지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직원의 외모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 정책은 고객의 특정 요청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 공개적으로 종교 상징물을 착용하려고 한다면, 고용주는 당해 직원이 고객과 대면 접촉하지 않는 다른 직무에 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 판결의 결과, 고용주는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만 종교적, 철학적 또는 정치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상징물 착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일관되고 체계적이며 모든 정치적, 철학적 및 종교적 중립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측면에서 상당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기업이 정치적, 철학적 및 종교적 중립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머리스카프 착용을 고수하는 여성노동자를 간접차별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머리스카프는 이슬람여성이 착용하는 종교적 상징이다. 이를 이유로 재판소가 기업으로 하여금 당해 여성노동자를 고객과 대면 접촉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없고, 다른 직무에 배정하도록 허용한 것은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의거한 간접차별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남녀대우평등 혹은 양성평등은 공동시장 설립 초기부터 EC/EU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이었다. 사람·상품·자본·서비스의 자유이동을 통한 시장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녀노동자의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어야했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가 수립, 실시하고 있는 「젠더평등전략 2020-2025」은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재판소도 이에 부응하여 젠더 평등에 관한 전향적인 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하여 EU 차원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되어 사람의 실질적 평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당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인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판소의 판단태도를 살펴보면,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판단을 강화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재판소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재판소의 판시태도와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재판소는 성 차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사안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판단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 차별의 금지의 문제에 대해 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관점보다는 EU법상의 차별금지 혹은 대우평등원칙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재판소는 대우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당국이 채택한 다양한 이차입법에 비추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회원국의 조치는 EU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폐지·개선하라는 법해석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Hofmann 사건 판결에서 보듯이 임신과 모성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남성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출산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의 판단태도는 EU의 평등대우원칙에 관한 법제도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Roca Álvarez와 Maïstrellis 사건 판결을 통해 EU에서는 부모공동 육아휴직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소는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남성도 양육을 분담할 책임이 있다는 판시태도를 취하고 있다.
둘째, 재판소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전향적 판단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고용과 승진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기업의 현실을 살펴보면, 남녀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남성후보자가 여성후보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관행이 있다. 비록 남성과 여성의 대우평등원칙이 확립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임신과 출산, 양육 등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경력이 단절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등의 편견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영역에서 승진과 채용 등에서 우대를 받는 적극적 조치를 인정함으로써 젠더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보장하려는 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단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문제는 간접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다. 그동안 재판소는 EU법상 확립된 차별금지와 양성평등원칙에 의거하여 남성과 여성을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차별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되는 동일하고 중립적인 기준이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간접차별에 대해 재판소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직접차별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고 법해석을 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적다. 이에 비하여 간접차별로 인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젠더 스테레오타입은 편견과 고정관념 등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 사고의 영역이다. Achbita 사건 판결에서 보듯이 재판소는 이슬람 여성노동자의 머리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회사의 규정은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당해 노동자를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절충적 혹은 이중적 판단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재판소의 고민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 의제는 당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인식과 사회현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은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 혹은 젠더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고 확립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성 혹은 젠더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EU는 성 혹은 젠더를 포함하여 사람에 대한 직접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점은 국제인권규범도 마찬가지다. 사회가 복잡다단하게 발전하면서 인권의 특정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재판소는 젠더 스테레오타입과 관련한 사안을 판단하면서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간접차별과 교차접근방식을 통합하여 젠더평등유럽을 보장하기 위한 법리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재판소는 모든 사안에서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확고한 판시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 점은 상당히 아쉽고 비판의 여지가 많지만 재판소 역시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논의를 무시할 수많은 없을 것이다. 젠더평등유럽을 향한 유럽당국의 정책에 따라 재판소도 점진적으로 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시태도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