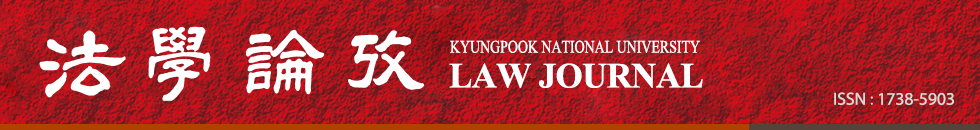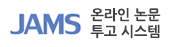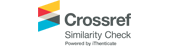Ⅰ. 들어가며
2023년 10월 20일 중국 국무원이 통과시킨 「인체장기기증 및 이식조례」(人体器官捐献和移植条例)」(이하 “「기증 및 이식조례」”)는 기존의 「인체장기이식조례(人体器官移植条例)」(이하 “「이식조례」”)를 대체하여 2024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새 조례는 「이식조례」 제2장의 인체장기기증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제목에 ‘기증’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다수의 장려 규범을 신설하여 인체장기기증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장기기증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1) 또한 새 조례는 현재의 사회상황과 2021년부터 시행된 중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이하 “「민법전」”)에 따라 주목할 만한 개정을 진행했다.
첫째, 「기증 및 이식조례」 제3조 제1항은 “인민지상·생명지상(人民至上、生命至上)”이라는 인체장기기증 및 이식의 기본 원칙을 새로 추가했다. 이 원칙은 장기기증 및 이식 분야의 구체적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증 및 이식조례」의 구체적 규범을 해석하는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다.2)
둘째, 인체장기기증의 의사표시 형식이 다양화되고 구체화되었다. 「기증 및 이식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은 유언의 형식으로 자신의 장기기증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기증 및 이식조례」 제13조 제2항은 공민이 중국적십자회 총회가 구축한 등록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사체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기증 및 이식조례」 제12조 내지 제14조는 국가, 언론매체, 중국적십자회 총회 및 그 산하 분회, 그리고 국무원 위생건강부문에 대해 일련의 새로운 임무를 규정하여 장기기증에 유리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촉진했다.3)
위의 개정사항들은 국가가 개인의 장기기증을 장려하는 입법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만, 「기증 및 이식조례」의 장기기증 결정 주체 및 그 능력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실질적 개정 없이 구 「이식조례」 제2장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기증의 결정 주체 및 그 능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러한 구 조례에서 이어져온 규정들은 새로 도입된 “인민지상·생명지상” 원칙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먼저 장기기증 결정 주체 및 능력의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이어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성 법률가부장주의 배경하에서 “인민지상·생명지상” 원칙을 지향점으로 앞으로는 입법적 변화 가능성을 분석한다.
Ⅱ. 「기증 및 이식조례」 및 관련 법률의 인체장기기증 자기결정권 규정
중국의 장기기증 결정 주체 및 결정권 행사는 주로 「기증 및 이식조례」 제8조 내지 10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증 및 이식조례」 제8조 제2항 전단은 공민이 장기기증 결정에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중국 「민법전」 제990조 제1항에 따르면, 자신의 기관에 대한 처분은 개인의 인격권 범주에 속하며, 더 정확히 말하면 「민법전」 제1003조가 규정한 자연인의 신체완전권에 속한다. 자연인 인격 존엄의 연장으로서 「민법전」 제994조도 사망자 사체의 인격이익 보호를 규정했다.4) 이 조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장기기증 및 결정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제도적 배치를 진행했다.
「기증 및 이식조례」 제8조 제1항과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장기기증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자원성(自愿性) 및 무상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원칙을 기초로 「기증 및 이식조례」 제8조 제2항 후단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을 강박, 기만하거나 유인하여 인체장기를 기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민법전」 제1006조 제1항 제2문에도 동일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타인을 강제로 기만하여 인체장기를 기증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히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자원성 원칙에 위배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타인을 유인하여 장기기증을 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는 것이다. 무상성 원칙은 인체 장기기증이 상응한 대가를 받고 이루어져서는 안 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유인행위는 확대해석해야 하는데, 즉 장기기증자에게 보상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급부를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이하 “「형법」”) 제234조의1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무상성 원칙과 자원성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구체적 행위방식과 위해결과에 따라 인체장기매매조직죄, 고의상해죄 또는 고의살인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체장기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은 「기증 및 이식조례」의 두 조항으로 확인된다.
첫째, 자신의 사체장기기증 결정과 관련하여, 「민법전」 제1006조 제1항 제1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 만이 장기기증 및 어떤 기관을 기증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증 및 이식조례」 제9조 제1항 제1문은 「민법전」 제1006조 제1항 제1문의 장기기증 결정에 관한 규범 내용을 재확인한다: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은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그 인체장기를 기증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둘째, 자신의 사체장기기증을 거부하는 결정과 관련하여, 「기증조례」 제9조 제2항 전단은 사체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공민이 생전에 사체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사후에 타인도 그 시신의 장기를 적출할 수 없다. 장기기증자 사후의 인격 이익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해당하는 유효한 동의가 존재해야만 기관획득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민법전」 제994조).5) 주목할 만한 것은 법조문의 의미에 따르면, 여기서 인체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시할 수 있는 주체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형법」 제234조의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 행위방식과 위해결과에 따라 시체, 유골, 골회 절도·모독·고의손괴죄 혐의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폐지된 「이식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상술한 장기기증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관한 규정 외에도, 중국 현행법에는 타인의 사체장기기증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특별한 확장규정이 존재한다. 「기증 및 이식조례」 제9조 제2항 후단은 “공민이 생전에 그 사체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민 사망 후 그 배우자, 성년 자녀, 부모가 공동으로 기증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식조례」 제7조 제2항 후단에서 개정 없이 계승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민법전」 제1006조 제3항도 자연인 사망 후 생전에 사체장기기증에 대한 이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배우자, 성년 자녀, 부모가 공동으로 기증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언급한 장기기증자 본인이 한 명시적 동의와 달리, 근친족이 본인의 생전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사체장기기증을 결정하는 것의 정당화 근거는 사망자 근친족으로부터 얻은 잠재적 장기기증자의 추정 동의에 있다.6)
근친족이 본인의 생전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사체장기기증 여부를 결정하는 이러한 입법례는 확대동의방식(Erweiterte Zustimmungslösung)이라고 불리며, 일종의 절충방안에 속한다.7) 한편으로는 일본 1997년 「장기이식법(臓器の移植に関する法律)」(구법)의 엄격동의 방식과 다르다. 일본 「기관이식법」(구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망자가 생전에 그 인체장기기증에 대해 유효한 동의결정을 한 전제하 에서만 그 사후에 그 기관을 적출할 수 있었다.8) 하지만 2010년 일본 「기관이식법」 개정안의 통과와 함께, 이러한 엄격한 동의방안도 신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포기되고, 중국 현행법과 일치하는 확대동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9)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기증 및 이식조례」 규정은 오스트리아의 이의방식과도 다른데, 즉 사망자가 생전에 인체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후 인체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본 설정하는 것이다.10)
「기증 및 이식조례」 제9조 제1항 제1문과 「민법전」 제1006조 제1항 제1문의 인체장기기증 자기결정권에 관한 규정은 마찬가지로 권리자에게 생체기관을 기증할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 적용된다. 하지만 생체기관의 기증은 사체기관 기증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기증 및 이식조례」 제10조가 만 18세 미만 공민에 대한 특별보호조항을 규정했다. 만 18세 미만 공민의 생체기관을 획득하는 행위를 예외 없이 금지한다. 이 규정은 「이식조례」 제9조에서 계승된 것으로, 동시에 「형법」 제234조의1 제2항이 규정한 제2종 행위유형의 반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증 및 이식조례」 제11조가 생체기관의 수용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이식조례」 제10조의 규정과 비교하여, 「기증 및 이식조례」는 “생체장기기증자와 부조 등으로 인해 형성된 친정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는 인”"을 삭제하고, 생체기관의 수용인을 인척 또는 혈족의 형태로 “생체장기기증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대 이내 방계혈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상술한 중국 현행 법규의 인체장기기증 결정 주체 및 결정권 행사에 관한 규범은 잠재적 장기기증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인체장기기증사업 발전 촉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을 보면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히려 장기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공민의 보건의료에 유리한 인체장기기증사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Ⅲ. 인체장기기증 자기결정권 주체 규정의 문제점
중국 「민법전」과 「기증 및 이식조례」의 용어를 비교해보면, 장기기증 자기결정권 주체에 관한 규정이 법체계 내에서 모순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민법전」 제1006조 제1항 제1문이 규정한 장기기증 자기결정권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 행사하는 구체적 인격권에 속한다. 하지만 「기증 및 이식조례」는 이를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으로 더욱 제한했다. 중국 「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공민이다. 이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를 「기증 및 이식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한다. 하지만 중국 국내의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중국 국내에서 장기기증을 결정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11)
이에 대해 법률해석학적 방법을 통해 장기기증의 자기결정권에 인권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면, 「기증 및 이식조례」 규정의 법체계 내부 모순도 해결할 수 있다. 유사한 법 해석 방법의 적용은 「독일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에서도 나타난다.12) 예를 들어 「독일기본법」 제12조가 규정한 직업의 자유의 권리주체는 모든 “독일인”으로만 한정된다.13) 하지만 이것이 독일에서 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직업의 자유를 향유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후자는 「독일기본법」 제12조에 직접 의거하여 직업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을 뿐, 「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일반적 행위자유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일반적 행위 자유와 직업의 자유는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의 관계에 속하기 때문이다.14) 따라서 헌법해석을 통해 여전히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독일기본법과 달리 중국 「헌법」에는 관련 일반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헌법」 제38조가 규정한 인격권도 중국 공민으로만 한정된다. 중국 국내의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주로 「헌법」 제32조 제1항의 국내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규정 및 제33조 제3항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규정을 적용한다.15) 하지만 인권적 성격을 가지는 구체적 권리 규범은 다른 영역의 구체적 입법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 국내의 외국인과 무국적자 권리의 법률 보호의 주요 법률 근거는 구체적인 법률과 법규이다. 이에 대응하여 기본권과 관련된 입법은 가능한 한 해당 권리의 인권적 성격을 중시해야 하며, 공민적 권리 즉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민법전」의 인체장기기증 자기결정에 관한 주체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자연인으로 표현된다. 「기증 및 이식조례」의 제정이 「민법전」보다 늦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민법전」처럼 치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증 및 이식조례」의 신분 제한은 명백히 상위법과 배치된다. 또한 그 관련 내용이 「민법전」의 관련 규범과 실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기증 및 이식조례」의 장기기증에 관한 조항이 완전히 「민법전」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증 및 이식조례」는 향후 개정 시 「민법전」과 통일된 용어, 즉 “인” 또는 “자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Ⅳ. 인체장기기증 자기결정권 행사 규정의 문제점
인체장기기증 결정 주체의 문제는 「기증 및 이식조례」에서 공민 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민법전」의 인격권 규범을 적용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기증 결정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들은 법률해석에서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장기기증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인체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표시하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사체장기기증 결정권과 만 18세 이상의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생체장기기증 결정권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장기기증 자기결정권의 행사 능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일정한 문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민사행위능력과 장기기증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장기기증 자기결정은 타인이 자신에게 침해를 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결정, 즉 피해자 동의로 볼 수 있다.16)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생체장기기증의 경우 기증자의 신체완전성을 침해한다는 점이 명백하다. 사체장기기증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인격적 이익뿐만 아니라, 생자가 사후에 자신의 시체와 유골이 타인에 의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와 기대도 침해받기 때문이다.17) 이로 인해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두 개념은 성질상 차이가 있다. 민사행위능력은 유효한 의사표시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구성적 규범과 관련되어 권리의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동의제도는 목적이 다르다. 동의제도의 목적은 규제적 규범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다. 즉, 본래 보호받던 법익이 권리주체의 동의로 인해 상실되게 하는 것이다.18) 반면 동의제도의 목적은 규제적 규범의 효력을 배제하여 본래 보호받던 법익이 권리주체의 동의로 인해 상실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인지 기초가 다르다. 민사행위능력이 요구하는 인지능력은 일반적 이성을 기초로 한다. 반면 동의, 특히 의료 및 생명과학과 관련된 동의는 그 전문성으로 인해 반드시 사전의 충분한 정보제공을 기초로 해야 하며, 인지 수준이 사회 평균 수준에 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인식능력만으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장기기증 자기결정권은 실질적으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권이라고 할 수 있다.19)
다른 한편으로는 무민사행위능력자나 제한민사행위능력자가 사체장기기증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도 규칙상의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미 위독한 무민사행위능력자 갑(甲)이 자신의 사후에 무상으로 신장을 기증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이 경우 현행 중국법에 따르면 갑은 인체장기기증 자기결정의 행위능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갑이 한 의사표시는 법률효력이 없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후에는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갑이 생전에 사체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갑의 부모는 공동으로 갑의 사체장기기증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갑의 부모가 공동으로 사체장기기증을 결정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무민사행위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내린 결정의 효력이 본인의 의사를 완전히 능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전에 한 기증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당연한 내용이다. 현행 「민법전」과 「기증 및 이식조례」는 그 제한에 대해 모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기증자가 임의철회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 이론상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일부 견해는 생체장기기증의 상황에서 이전의 기증 결정 철회가 생체기관 수용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야기한다면, 이미 한 기증 결정은 신의성실원칙과 손해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20) 반대로 다른 견해는 생체장기기증자가 임의 철회권을 가지지만, 사체기관을 공동결정 방식으로 기증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21) 또 다른 견해는 사체장기기증의 동의권은 일회 사용으로 소진될 수 없으며, 기관이 특정 개인에게 배정된 후에야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22) 이러한 이론적 논쟁의 원인은 실정법 규정의 부족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성질과 범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에도 있다.
「기증 및 이식조례」 제9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목적은 추정동의제도를 통해 적당히 사체장기기증을 촉진하여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다. 하지만 너무나 간략한 규정으로는 사망자의 진실한 의사를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
첫째, “배우자, 성년 자녀, 부모” 범위 규정을 통해 너무 많은 구성원에게 공동결정권을 부여했다. 「민법전」 제1127조가 규정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제1순위 상속인에 속한다. 하지만 사체장기기증의 공동결정은 사망자 인격권의 상속(「민법전」 제992조)이 아니라 그가 사체장기기증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사 추정 또는 확인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규정은 사망자 생전의 진실한 의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결정권자 간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망자와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성년 자녀나 부모가 그 일부 사체장기기증을 거부하지만, 사망자와 함께 생활하던 배우자는 그 일부 사체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경우이다. 또는 사망자와 그 근친족 사이에 모두 경제분쟁이 존재하여, 최종적으로 그 근친족이 개인적 원한이나 보복의 목적으로 공동으로 그 사체장기기증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이때 첫 번째 상황에서는 사망자와 관계가 더욱 밀접한 배우자의 의견을 채택할 수 없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사망자의 인격 이익을 침해할 것이다.
둘째, 동시에 여러 근친족에게 공동결정의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직면하는 문제는 사망자의 배우자, 성년 자녀와 부모가 그 사체장기기증 여부 결정에 대해 일치된 의견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문언 해석을 근거하여 모두가 동의해야만 사망자가 생전에 사체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중 한 근친족이 동의하기만 하면 되는가? 혹은 조문의 주체 순서 - “배우자, 성년 자녀와 부모” - 에 따라 사망자 배우자에게 더 높은 순위의 동의권을 부여하는가? 아니면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가? 만약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제도적 설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장기기증 및 이식사업 발전 촉진에도 유리하지 않다.23)
셋째, 공동결정의 규칙도 마찬가지로 후견인의 권리와 상충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인 을(乙)이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당한 후 기본적인 인지능력을 상실했다고 하자. 이때 을의 배우자는 「민법전」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견 능력을 구비한 경우 을의 법정후견인이 된다. 그리고 얼마 후 을이 불행히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을이 생전에 그 사체장기기증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았다면, 현행 규정에 따라 을의 배우자, 부모 및 성년 자녀가 그 사체장기기증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때 을의 부모와 성년 자녀가 모두 그 사체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배우자만 동의한다면, 최종적으로 을의 부모와 성년 자녀의 결정에 따라 사체기관적출수술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피후견인의 인신 권리를 보호하는 후견직책(「민법전」 제34조 제1항)과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Ⅴ. 인체장기기증 자기결정권 행사의 연성 법률가부장주의 구성
칸트에 따르면, “법(法·Recht)은 한 사람의 자의가 그 하에서 보편적 자유 법칙에 따라 다른 일방의 자의와 일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의 총합”이다.24)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자유권은 타인의 자유권에서 그 한계를 갖는다. 이런 의미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 하지만 자유권은 권리주체 외부의 다른 사람의 행위의 간섭을 받을 뿐만 아니라 권리주체 자신에 의한 침해도 받는다. 법률가부장주의는 개인의 자유권에 대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섭하거나 형사처벌을 가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25) 그것은 개인의 대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개인의 현재 의사에 위배되더라도 그 장기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6) 이러한 강제성과 제한성을 가진 보호방식이 실질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이러한 강제와 제한이 어느 정도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및 인권과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27)
장기기증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민법전」이든 「기증 및 이식조례」의 규정이든 모두 경성 법률가부장주의(hard paternalism)의 입법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즉 전통적 사회 가치나 윤리도덕을 이유로 개인의 인체장기기증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으며, 권리자가 그 인체장기를 처분하는 행위의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28) 하지만 연성 법률가부장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기증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자체도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상치되는 경성 법률가부장주의와 달리, 연성 법률가부장주의(soft paternalism)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오직 권리자가 더 잘 자기결정을 하도록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만 합리성을 갖는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일정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의 민사행위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연성 법률가부장주의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개인의 자율성을 지향으로 하는 연성 법률가부장주의의 주요 목적은 자기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인지능력 결함으로 인하여 불리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 환언하면, 연성 법률가부장주의 입장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로 결정 주체가 그 제한된 인식능력으로 인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인지가 부족하거나 인식 착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생체장기기증을 금지하는 것은 주로 미성년인의 인지능력 부족으로 이러한 자기손상행위의 심각성과 의사가 고지한 사항의 영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진정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친족관계의 영향도 받아 진정으로 자유로운 결정을 하기 어렵다. 해당 결정 자체가 권리 주체에게 불리한 영향을 가져오는지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29)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권리자의 자율성 자체와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성 법률가부장주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원칙적으로 자기결정능력이 있는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분권을 제한하는 규범을 설정할 때 권리주체의 자율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비례원칙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30)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정 주체가 자신의 결정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행위가 충분히 이성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해 법률상 부정적 평가를 할 수 없다. 오히려 법률이 이 범위에서 발휘하는 작용은 홍보와 교육 등 수단을 통해 개인이 더욱 이성적인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흡연이 건강에 해롭지만 이를 이유로 전면금연을 할 수는 없으며, 담배회사가 담배제품 포장에 경고문을 표기하도록 강제하여 소비자가 점차 흡연행위를 포기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둘째, 결정 주체에게 해로운 행위를 모두 법률가부장주의를 이유로 금지한다면, 이 자체가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법률은 권리처분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되며, 비록 관련된 권리가 신체 건강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등 감염병 유행 기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을 신체에 해로운 부작위로 본다면, 입법을 통해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반대의견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감염병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이 예방접종제도를 규정했지만, 접종대상을 보면 강제접종을 요구하는 면역계획백신은 주로 특정인군(예: 아동)과 관련된다. 이와 유사하게 독일 「감염방호법(Infektionsschutzgesetz)」 제20조 제6항과 제7항이 규정한 감염병 유행 기간의 강제 백신접종도 모든 사람의 의무가 아니며, 특정인군, 즉 위협받는 일부 민중으로만 한정된다.31)
셋째, 권리주체가 결정을 내릴 때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지더라도, 법률이 행위자의 자유결정을 규제할 때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 범위 내로 통제되어야 한다.32) 예를 들어 상술한 백신 접종의무제도에서 구체적 필요성과 긴급성을 본인의 자기결정권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것은 실제로 비례원칙의 요구에 해당한다. 반대로 단일하고 절대적인 기준만을 통해 권리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기계적이며, 동시에 경성 법률가부장주의의 범주에 속한다.
“인민지상·생명지상” 원칙은 중국인이 코로나19 퇴치 과정에서 정리해낸 중요한 가치 정신이며, 「기증 및 이식조례」 개정 시의 지도이념이기도 하다. 이 원칙은 본질적으로 연성 법률가부장주의 입장과 부합한다.
“인민 우선”의 민본이념은 연성 법률가부장주의 특질을 갖는다.33) 인민 우선의 가치이념은 순수한 공리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최대한 개인 수요의 만족을 존중하는 것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인민 우선”의 가치 정신은 바로 인민 이익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데 있다. 여기서의 이익은 개인이 그 생명과 신체 건강 방면에서 향유하는 권리와 이익일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이익이기도 하다.34) 구체적으로 인체장기기증 방면에서는 개인의 생명 건강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개인이 행위능력에 흠결이 존재할 때 그가 생명 건강이나 사체완전성에 손해를 주는 결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개인이 인체장기기증 여부에 대한 결정이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생명지상'과 '인민지상'의 개별 인민에 대한 실천적 요구는 반드시 개별 인민이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발전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35) 자유권과 발전권 관련 입법을 설계할 때, 항상 권리주체를 중심으로 삼아 개인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파테-모그하담(Fateh-Moghadam)은 동의제도로 대표되는 자기결정권의 기능을 방어, 발전, 보장기능으로 요약했다.36) 그중 발전기능은 동의제도가 개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의사의 침습적 의료행위에 동의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성형수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체장기기증에 동의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가치추구를 실현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자신의 신체를 처분하는 자기결정의 헌법적 기초는 바로 인격권에 대한 보호(중국 「헌법」 제38조 제1항, 「민법전」 제990조 제1항)에 있다.37)
종합하면, “인민지상·생명지상” 원칙 자체가 연성 법률가부장주의 입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기증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개인의 장기기증 자기결정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장기기증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의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 여부를 인체장기기증 자기결정 가능 여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고, 더욱 실질적인 기준, 즉 만 18세 이상이며 인체장기기증에 대해 충분한 판단력을 가진 것을 채택해야 한다38) 이러한 실질적 판단방안이 더욱 연성 법률가부장주의의 한계 및 “인민지상·생명지상” 원칙의 요구에 부합한다.
첫째, 성년의 제한행위능력자가 여전히 인체장기기증이라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성년의 제한민사행위능력자가 생체기관을 기증하여 자신의 근친족을 구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둘째, 연성 법률가부장주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완전한 민사행위능력 보유 여부와 해당하는 결정 판단능력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과 관련된 자기결정행위능력의 유무에 대해서는 더욱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민법전」 제22조 후단이 성년의 제한민사행위능력자가 그 지적 상황, 정신건강상황과 상응하는 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허용한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234조의1 제2항이 만 18세 미만자의 기관적출을 금지한 규정에도 부합한다.
셋째, 「민법전」상의 완전한 민사행위능력 규정과 분리된 방식의 장점은 또한 장기기증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더욱 충분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증자가 충분히 알고 고려한 후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보장하는 데 있다. 만약 자신이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라는 것만으로 유효한 기증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어느 정도 의사의 정보제공의무의 중요성을 줄인다.
둘째, 만 18세 미만인의 사체장기기증에 대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만약 18세 미만인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민법전」 제1006조 제3항(「기증 및 이식조례」 제9조 제2항 후단) 규정의 반대해석에 따라 완전히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그의 동의 의사표시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사체장기기증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그의 동의 결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물론 사망자의 법정대리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다면,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 결정에만 근거하여 사체기관을 적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장기기증에 대해 자기결정권 실시능력이 없는 사람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여전히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당연히 제한도 받는다. 예외 없이 기증자나 그 근친족의 임의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일부 상황에서 기관수용인의 생명건강을 침해할 것이다. 따라서 생체장기기증과 사체장기기증의 상황에서 기관수용인에게 인신 손해를 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철회를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도 “생명 우선” 기본원칙의 정신에 부합한다. 따라서 사체기관이 특정 개인에게 배정된 후라 하더라도, 기관수용인이 관련된 실질적 준비작업을 전개하지 않았거나 동의 결정 철회가 수용인에게 신체상해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 모두 생체장기기증인이나 사체기관의 공동결정인이 여전히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배우자, 성년자녀, 부모가 생전에 사체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시하지 않은 사람의 장기기증 여부에 대한 공동결정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칙을 통해 규범화하여 사체장기기증의 인격권 속성을 부각하고 상속권 속성과 구별해야 한다.
첫째, 사망자와 어떤 친족관계가 존재하든, 공동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친족의 범위는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여전히 사망자와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는 사람으로만 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 「장기이식법(Transplantationsgesetz)」 제4조 제2항 제1문은 근친족이 잠재적 기관이나 조직기증자가 사망하기 전 2년 내에 그와 개인적 접촉이 있었던 상황에서만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한다.39) 여기서의 “개인적 관계”는 공무상 왕래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접촉과도 다르다.40) 물론 2년으로 제한해야 하는지는 완전히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둘째, 배우자, 성년 자녀와 부모 세 주체 간의 관계에 대해,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들이 공동으로 동의하는 상황에서만 사망자의 사체기관을 기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망자의 배우자, 성년 자녀와 부모가 그 사체장기기증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중의 어떤 친족과 연락을 취할 수 없거나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공동의 결정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체장기기증의 유효한 결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세 주체 간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 「기관이식조례(Verordnung uber die Transplantation von menschlichen Organen, Geweben und Zellen)」 제5조 제2항은 어떤 주체와 사망자 간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다른 신분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는 결정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한다.41)
우선 배우자, 등록된 동반자나 생활 동반자, 다음으로 자녀, 다시 부모와 형제자매, 재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마지막으로 사망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타 사람이다. 이때 동일 순위의 결정권자가 복수일 때만 공동결정의 문제가 존재한다. 물론 공동결정의 틀 내에서도 반드시 일치된 동의 결정이 존재해야만 여기서 논의하는 사체기관을 기증할 수 있지만, 사망자와의 서로 다른 친밀 정도에 따라 다른 결정 순서를 배치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정도로 공동결정 시의 의견충돌을 줄일 수 있다.
셋째, 후견권이 공동결정권에 우선한다. 앞서 언급한 성년의 무민사행위능력자가 생전에 사체장기기증 동의 또는 비동의 결정을 하지 않은 사례에서, 현행 법률의 틀 내에서라도 후견인의 결정이 우선성을 가진다고 인정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해 갖는 권리에는 “피후견인 신분행위 및 신상 사항의 동의권”이 포함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해 “피후견인의 인신권리를 수호하는, 즉 인권을 수호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42) 따라서 후견인이 이행하는 인신후견권리 자체가 그 사체장기기증 여부의 권리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앞서 제안한 대로 결정권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후견인이 그와 사망자 간의 친밀관계로 인해 제1순위의 결정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때 후견인이 복수일 때, 예를 들어 부모 쌍방이 모두 후견인일 때만 일치를 얻지 못하는 공동결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여전히 공동결정 결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체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 존재한다고 추정해야 한다.43)
Ⅵ. 결론
인체장기기증 자기결정권은 인격권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에 속하며,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인체장기기증 자기결정권의 법률규범은 권리자가 그 의사에 따라 유효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적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여 그가 필요한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결정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는 연성 법률가부장주의 입장에서의 “인민지상·생명지상” 원칙 정신에 부합한다.
따라서 인체장기기증 자기결정권 관련 구체적 규칙을 설정할 때는 연령적 요소를 출발점으로 하여 당사자의 판단과 결정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 보유 여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장기기증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손해금지원칙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인체장기기증 결정 후의 철회권에 대해 필요한 제한을 해야 한다. 생전에 사체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시하지 않은 사람의 장기기증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을 설정할 때도 인체장기기증 자기결정권의 인권적 성격에서 출발하여, 구체적 친족과 사망자 생전의 서로 다른 친밀관계를 기초로 해당하는 친족에게 서로 다른 우선순위의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간섭 요소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