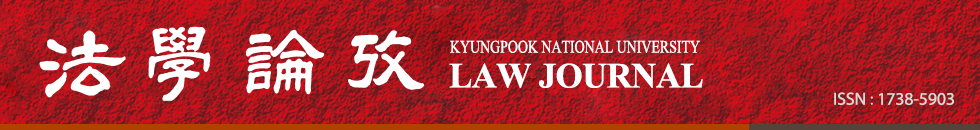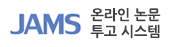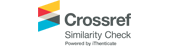Ⅰ. 글의 배경 및 목적
형사사법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국가기관의 강제력 행사로 여겨져 왔던 수사처분의 외주화(外注化), 즉 사적 영역(사인 또는 단체)에 위탁(민간위탁1))하는 것을 둘러싼 사실적·법적 문제들은 아직 국내 전문가적 논의에서 현실적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2) 물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해서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기업(私企業)을 국가의 범죄수사사무, 그것도 강제처분 사무의 위탁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현행법은 이러한 수사처분의 외주화를 통한 공무집행방법도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한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사목적으로 특정인의 위치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정보수집은 결국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영위자 등 사인(私人)·사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또한 국가기관의 사무가 사적 영역에 위탁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Public-Private-Partnership(PPP; 민관협력)과 같은 전략적인 공조·협력도 국내법률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01년 7월 1일 시행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민영교도소3)의 장은 무기의 사용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동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비록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인·사기업이 대행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형 집행의 범위가 국가의 공권력 행사의 최정점(무기사용)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미 현행 법률들에서도 대표적인 국가의 권력독점(Gewaltsmonopol) 영역의 사무들을 민간에 외주·위탁하거나 이들과 협업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사실상 가장 외주화가 시급한 분야인 디지털 증거의 확보와 관련한 디지털·IT 포렌식 분야에서조차 국가기능의 외주화나 PPP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4)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의미있는 국가들에서는 이미 검사의 소추 기능을 외주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사인에게 위탁하거나, 기업 수사를 사인인 변호사에게 위탁하거나, 기업내부인의 조사를 수사와 재판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영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전문영역에서 사인·사기업의 역량에 대한 국가공무원의 상대적 역량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된 사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국가기능을 사인에게 위탁하거나 계약을 통해 외주하거나 협업이라는 이름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등의 일처리가 어떤 헌법적·법률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지, 충돌하는 이익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해법은 무엇인지, 어떤 것은 위탁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국가의 고유한 업무영역인지 등을 구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러한 피할 수 없는 현대국가의 형사사법의 난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몇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는 국가권한·기능 행사의 외주화 및 그들의 고민들을 요약해 보고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Ⅱ. 미국 검찰의 기소기능 외주화
공적 영역의 자원부족, 심각한 예산의 제한은 대부분의 현대 국가의 형사사법영역의 업무집행에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검찰의 예산 부족과 이로 인한 법집행역량의약화는 불가피하게 형사기소기능을 사적 영역의 변호사들에게 외주화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소개된다.5)
사실, 기소기능의 외주화는 특히 미국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조치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이러한 형사사법에서의 외주화의 경향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영교도소의 운영이나 수사활동의 외주화와 기소의 민간위탁이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법질서를 배경으로 할 때, 기소기능(criminal prosecutorial function)의 민간위탁은 무엇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헌법과 실정법률과 긴장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윤리, 공정, 투명성, 책임성, 수행역량에 대한 우려들과 공적 기소와 관련한 규범들에 의해 발전되어온 중요한 가치들과도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 반론의 핵심이다.6)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형사사법영역에서 사인·사기업 등 민간영역의 역할이 의미있게 증가하였고, 특히 교정(corrections)과 수사·경찰작용(policing) 영역에서 활동이 두드러졌다. 초기에는 주로 국가에서 공급해 오던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국가와 사인·사기업 사이의 계약 형태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졌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 강화된 서비스, 비용절감 등이 이러한 형사사법기능의 사적 수행의 이유·장점으로 언급되곤 했다. 이러한 외주화의 대부분의 장점들은 기소기능을 민간 법률가·변호사에게 외주하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특히 국가재정의 위기로 공적 자원의 감소가 일반화된 시대에는 상당히 유혹적인 제안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2010년경 미국 전역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관할(jurisdiction)을 가지는 지역정부에서는 민간 변호사들에게 기소기능을 위탁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넓은 관할지역을 가지는 지역까지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외주화는 부분 외주화와 완전·전부 외주화로 나누기도 하는데, 전자의 경우 여전히 국가기관의 관리나 책임이 유지되는 형태라면, 후자는 위임받은 민간에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재산의 보호에 투입된 재원의 사용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러한 완전한 사적 영역에의 위탁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여전히 다수는 형사사법에서의 외주화는 단지 부분적인 외주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교도소의 수용자들을 위한 식사의 제공을 외주화하거나, 교도소의 운영을 민영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국가가 교정을 제공할 의무를 면하고, 개인들의 감금여부나 감금방법 결정까지 사적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이나 우리의 경우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고, 결국 형사사법영역에서의 민영화(privatization), 외주화(outsourcing), 사적 영역과의 계약을 통한 위탁(contracting out) 등은 단지 국가기능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메츠거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기능을 외주화한다고 해서 국가가 자신들의 의무를 면하거나 책임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외주가 허용될 수는 없고, 단지 공사(公私)의 협업(public-private collaboration) 또는 공사가 혼합된 행정권(a regime of mixed administration)7) 행사 정도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형사사법 기능의 외주화의 예는 민영교도소나 수사활동에서 사인의 참여를 들 수 있는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7개의 주정부 산하의 민영교도소들과 1개의 연방정부 산하의 민영교도소(13,834명)에 총 90,873명의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이 수치는 미국의 모든 교도소의 수용인원의 약 8%에 달한다. 2000년 당시 85,027명의 수용인원과 비교하면 2022년 민영교도소 수용인원은 약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8) 1800년대 소년범에 대한 교도행정을 민간과 계약으로 위탁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마약사범에 대한 국가정책 강화로 교도소 수용인원의 폭발적 증가가 현재까지의 민간교도소의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형사사법기능이 사적 영역에서 수행되는 또 다른 예는 법집행영역, 즉 경찰의 수사영역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미 2010년 전후 미국에서는 민간인인 경찰이 연방, 주, 그리고 지역 공무원인 경찰을 모두 포함한 인원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9)
정부의 예산삭감은 검찰청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많은 관할지역에서는 인적 자원의 감소로 인해 형사집행기관의 역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한다. 앞서 간략히 언급한 교도소의 민영화나 수사 영역에서의 민영화를 넘어서, 이제 기소 기능도 외주할 수 있는지가 현실적 쟁점이 된 미국에서의 논의를 요약해 본다.
이미 미국의 검찰 중 소규모의 관할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 검찰청은 형사 기소 기능을 사설 변호사·법인 등에 위탁한 경우가 적지 않다.10) 종래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받는 사인기소(private prosecution)나 시간제 기소(part- time prosecution)와 같이 사인이나 민간에서 공적인 형사기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해당 정부들이 직접적으로 형사기소를 사인인 변호사에게 외주하는 현상이 최근 들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소 위탁 협약(prosecution outsourcing arrangements)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사설 법무법인과 시간 단위의 비용을 기준으로 형사 소추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의 부분 위탁으로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Davis)시가 해당 시 규범위반행위의 기소를 포함한 다양한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시간당 18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캘리포니아 법무법인과 계약한 사례가 있다.11)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워싱턴 세킴(Sequim)시의 예처럼, 형사 기소 건마다 비용을 사설 변호사나 로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형사 항소심 매 건수마다 3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도 활용되었다.12)
이 외에도 사설 변호인에게 또는 법무법인에게 모든 형사사건을 일정액의 연간 비용을 지급하고 모두 처리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의 외주화가 사용된 적이 있다. 그 예로는 오레곤주의 알바니(Albany)에서는 연간 2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기소 및 기타 법적 서비스를 사설 로펌에 위임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13)
선출된 시장이나 지역의 행정가들은 자주 민간 로펌을 이용하여 형사 기소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특히 소규모 주민을 가진 검찰청은 공적 기소, 즉 검사를 고용하여 이용할 정도의 세금·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범죄 발생 건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일제(Full time) 근무할 검사를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 있는 관할지역 시장이나 관료들은 형사 기소를 사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오히려 형사기소역량(criminal prosecution capacity)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는 다시 효율성(efficiency), 공중의 안전(public safety), 그리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공정성(fairness by speeding criminal case processing)을 강화하며, 범죄발생을 줄이고, 법원의 행정비용(court administration costs)도 감경시키고, 소송전 구금(pretrial detention)의 인적·재정적 비용의 축소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14)
미국에서는 최근까지 이러한 형사소추기능까지 외부와의 협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주로 소규모의 지방 검찰에서 행해진 실무적 현상이지만 향후 보다 큰 규모의 검찰도 외주화의 장점 활용을 고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에서 과연 그러한 방향이 적법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행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기능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임성과 업무집행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검찰조직의 장은 대부분 선거로 선출된다는 점, 그 아래의 인원들은 그에 의해 직접적으로 임명된다는 점, 때때로 입법기능을 하는 기관에 의한 승인절차를 거친다는 등의 권력행사의 정당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검사의 이름으로 형법을 집행하는 그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책임성에 기초하여 엄청난 권한 행사가 인정된다는 점 등에서 쉽게 사적 영역의 도움을 받거나 권한 행사나 기능 수행을 사인·사기업등에 위탁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수사와 기소여부에 대한 결정, 법집행 기관의 장기에 걸친 수사 전략의 결정, 형집행기관의 관리, 사회적 형사정책의 결정 등 무수한 권한과 기능들이 검찰에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민간위탁·외주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부분 민영화도 쉽게 결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기관인 검찰과 검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과 비교할 때, 사인인 변호사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계자들의 정보접근권이 현저하게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시민들이 공적 영역의 검사와 관련하여 누릴 수 있는 정보접근권과 투명성이 현저히 약화된다는 것이다.15)
결국 사인인 변호사나 법인에 위임된 소추기능의 행사가 검사에 의해 감독 또는 통제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검사에게 그대로 유보되는 것이 필요하고, 공공지출은 공중에 의해 감시받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외주받는 변호사나 법인은 그들의 내적 사무처리 절차와 의사결정 절차를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증대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진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검찰과 검사에서 기대가능했던 책임성과 투명성이 유지되는 민간위탁·외주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검사의 기능을 위임받은 자가 기존의 검사에게 기대가능했던 것에 상응하는 업무수행능력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입장도 중요한 반론으로 등장한다. 그 중요 근거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나 로펌과 같은 사법인에 기소 업무가 위탁된 경우 그 개인이나 법인은 검사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송사건에 보다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윤추구의 욕구는 검찰의 기소 기능에 대한 위임사무를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게 하고, 많은 수임료가 기대되는 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재판의 지연, 수사상(공판전) 구금의 불공정한 처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범인의 처벌에 대한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반발이 적은 수준에서 타협적인 구형으로 그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16)
민간 변호사나 사설 로펌이 검사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가 항상 지적된다. 특히 이들 민간 변호사나 기업의 영업지역이나 활동범위가 위탁된 검사의 관할과 동일하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이해충돌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17). 부패의 문제가 정부의 관료인 검사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기소 기능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영역에 외주하는 것은 우선 미국 헌법에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예를 들어 적정절차(due process), 동일한 보호(equal protection), 권력 분립(separation of powers), 대리불가원칙(nondelegation principle) 등의 헌법정신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18)
나아가 사인인 변호사로 하여금 기소 권한을 행사케 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들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이익을 관리할 능력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검사의 기소결정과정의 부패문제, 편향성의 문제, 선입견의 문제도 적정절차나 동일한 보호원칙에 충돌할 수 있고, 결국은 국가 권한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2인의 반대 당사자인 변호사들이 소송을 추행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19) 이것은 피고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대해 윤리적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대통령이건 시도지사이건 선출된 권력이 해당 부서의 공직자를 임명하게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정부에 대해 사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민주주의를 관철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20), 문제되는 권한이나 기능이 정부 외부의 제3자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정책결정권한의 행사를 함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행정각부의 기능이나 내적 기능을 위임할 수 있지만, 국가와 사회를 위한 소송을 수행하는 권한을 사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21)
정부의 공적 기능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행정법규들이 발전되어 왔지만 그 규범이 검사의 기소권한의 외주화까지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22) 검사의 소추기능을 외주화하는 것은 이러한 규범들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1998년 연방활동재고개혁법(FAIR; The Federal Activities Inventory Reform Act of 1998)은 고유한 정부의 기능과 다른 기능들을 구분하고, 후자는 잠재적 외주화를 위해 사적 영역과 경쟁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3) 미연방조달국에 적용되는 연방취득규정(FAR; Federal Acauisition Regulations)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추는 연방외주화법(Federal outsourcing law)에서 규정한 고유한 정부의 기능이라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계약을 통해 정부의 고유한 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24) 특히 이 규정에서는 국가의 고유한 기능으로 언급되는 첫 번째 기능이 범죄수사, 두 번째가 기소통제기능이다. 군대나 외교기능 보다 더 앞서 국가의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25) 수사와 기소의 외주화는 가장 큰 위험을 내재한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기능들은 계약으로 사적 영역에 위탁할 수는 없는 기능이라는 것이다.26)
기소 기능은 아주 포괄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검사들은 기소여부, 무엇을 기소할 것인지에 대해 제한 없는 권한(unfettered discretion)을 가지고 있고 그 결정들은 피의자,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미국과 우리의 검사가 다를 바 없다. 물론 plea bargain이 주요 사건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대 미국사회의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는 그야말로 가장 영향력이 큰 형사사법행정기관(organ of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는 경우. 결국은 검사가 그 범죄를 규정한 법률이 집행되게 하거나, 설령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해도, 그 법을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27)
검사가 정의를 위하여 특정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경우나, 특정한 법률이 자신의 선호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또 다른 주권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과연 그러한 주권자의 특권과 같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와 무관하게 이러한 기능을 사적 영역에 넘겨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19세기에 미국도 사적 기소체계가 우세하였다면 현대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사가 두드러진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검사는 공정성과 무당파성에 대해 공중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권한을 차지한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이 형사사건에서 정부의 이해관계는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justice shall be done28))는 것에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과연 사인의 소송추행을 보고 정의를 실현한다거나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반문인 것이다.29)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검사의 권한과 기능을 사인·민간에게 위탁하고 이를 관리하거나 제한한다는 것은 쉽게 구현되기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그것은 결국 민주주의적 책임성과 검찰의 전문성은 사적 영역에서 찾기 어려운 특성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검사는 단지 형사사건을 법원에 가져가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정의를 실천할 의무를 지는 자이고, 이러한 정부의 권한과 의무는 계약법적 합의를 통해 사인에게 위탁할 성질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다.30) 민영교도소나 사적 수사나 경찰작용과 검사의 기소기능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없다는 평가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에서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제한하고 있고, 동법 제6조를 구체화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제11조 제1항 제1호)이나,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제2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제3호),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제4호)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의 기소기능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현행법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Ⅲ. 법인·기업 수사의 위탁
복잡하고 거대한 기업 내부의 인적·물적 대상에 대한 수사가 유능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사회적인 혐의가 매우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수사결과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검찰은 물론 국가·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은 현대국가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다. 적법절차를 통한 사실규명이라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형사사법기관의 인적·물적 역량의 한계,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국가의 의무, 기업의 존립이나 형사처벌로 인한 타격을 줄이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일처리의 한 유형이 형사범죄의 혐의를 받는 기업이 고용한 변호사나 기업 내부의 준법경영(corporation compliance) 관련 부서가 자체 조사·수사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고, 그 내용이 실체해명에 기여하였다면 형량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이른바 기업에 수사를 위탁하는 것이다. 외국의 몇 가지 예를 간략히 보기로 한다.
이러한 유형의 수사의 외주화는 예를 들어 2019년 6월 4일 네덜란드 경제신문인 Dutch Financial Times가 보도한 기사를 통해 공중의 관심을 자극하기도 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미래에 검찰은 사기와 부패범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고용한 변호사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경제·재정분야의 수사전문가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게 되고, 검찰은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네덜란드의 재정·경제·환경범죄에 대한 국가검찰에 소속된 검사가 그러한 공조사실을 확인하면서 해당 변호인의 수사가 충분히 건전하게 이루어졌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31)
이러한 수사기관과 기업이 고용한 변호사 사이의 협업의 형태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수사당국의 개입이 예측될 수 없었던 수사 시점에 변호사의 수사보고서(investigation report)를 개시(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실시간 협업, 즉 국가수사기관이 수사 개시시부터 관여하는 실시간 협업(real time cooperati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결국 수사당국은 범죄의 협의를 받는 기업의 변호사에게 그들의 수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 영역과 민간의 협업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 그 협업이 핵심이 되었던 사례의 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네덜란드 정보의 담당 장관은 혐의를 받는 회사에 의해 제공된 문서를 인정할 것인지와 수사에 관한 최종의 결정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32)
물론 범죄수사에서 혐의자의 협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네덜란드의 경우 범인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때 종종 고려되는 것이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국가의 양형사유에 고려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형사제재에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협업의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네덜란드에도 아직 이러한 주제에 대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검사에 대한 주요 지침에도 사건해결을 위한 요건으로 협업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달리 말해 이렇게 되면 기업측에서 협업할 동인이 약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18년 ING 회사의 수사 관련 합의는33)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인 기업의 협력 없이는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검찰의 입장에서도 그 합의가 기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요구되는 협업의 정도가 분명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결국 회사들로 하여금 수사당국과의 대화에서 불확실성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수사기관에 협업하는 회사 내부의 개인의 권리 측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피고용인이 이른바 좋은 노동자로 인식되고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조사할 때 사정에 따라서는 그들의 고용주와 협업해야 할 수도 있고,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해야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범죄수사에서 혐의를 받는 자나 피의자는 묵비할 권리가 있고, 자기부죄금지의 권리를 가진다는 근본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러한 협업에서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 헤이그 항소법원은 내부의 조사에 관련된 서류나 기록은 직접적으로 형사기소에 사용될 수 없다고 확인했고, 그 이유는 수사절차와 다르게 내부 조사절차에서는 당해 피고용자 등이 혐의자인지, 목격자인지, 아니면 징계대상자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진술·협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34)
또한 기업 변호사들도 변호사로서 법적 특권을 누리는 것인데, 조사과정 동안 법집행기관과의 협업이 이루어질 경우 그들의 특권을 포기할 것이 요구될 수도 있고, 통상 변호인의 특권에 포함되는 문서나 보고서 등도 협업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호인의 특권의 포기를 둘러싼 상황들은 회사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법인의 형벌을 규정한 오스트리아 법인책임법 제5조(법인벌금형; Verbandsgeldbuße35)) 제3항 제3호의36) 경우 법인이 범행 이후 진실발견을 위해 중요하게 기여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일수를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니고 법인 내부의 변호사나 조사역이 그들 내부의 범행을 조사하여 진실발견과 형사소추, 심리 등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경우에 형벌을 감경해 주겠다는 것이다.
독일도 형법적으로 중요한 위법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법인·기업 내부의 조사·수사(Verbansinterne Untersuchungen)가 이미 수년 전부터 점증하고 있고37), 그 주요 동인은 카르텔법이나 질서위반법 때문만은 아니고, 독일 의회에서 수년에 걸쳐 도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인제재법에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형벌감경조항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그것이 결국 기업에게 유리한 결과가 된다는 인식 때문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인 내부의 준법경영(verbandsinterne Compliance)은 이미 주식회사법, 유한책임회사법 등의 관련 법규정에서 기업 경영인의 주의의무, 감사의무 등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재완화의 전제조건으로 기업 전반에 걸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추기관에 의한 국가의 사안해명과 기업 또는 그 조력인들38)(변호사, 경제심사역 또는 포렌식전문가 등 외부인39) 또는 기업내부의 준법경영관련 부서의 소속 직원 등)에 의한 사법적인 조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법규가 필요한 상황에서40) 최근까지 도입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법인제재법에서 내부 수사에 대한 법적 규정을 도입하려 하는 것이다. 법안에서는 제16조의 법인내부의 조사(수사; Untersuchung)와 제17조의 법인내부의 수사의 경우 법인제재의 감경, 제18조의 감경의 범위 등의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97조와 제160조의a 등에서 압수금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41)
이렇게 기업 스스로 또는 수사기관이 아닌 외부인(변호사 등)을 고용하여 법인의 형사범죄를 조사·수사하게 하고 그 결과가 형사사건의 해명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형벌감경의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이를 조장하는 것은 결국 사전적으로 기업의 준법경영문화를 정착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기업 범죄수사의 어려움이나 인력의 부족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외주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수사는 검사, 경찰, 경제·재정 관련 국가기관의 공무원(세관, 조세, 금융감독원 등)이 수행해야 할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간접적으로 내부 조사결과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형벌의 혜택을 주는 것은 현재 독일 여러 법률에서도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조사·수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조사·수사의 대상이 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도 명시적인 관련 규정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42)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기업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업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부담과 역량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의 혐의를 받는 기업·법인에 의해 고용된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수사업무를 대신하는 형태의 법집행기관의 업무 외주화는 이미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익숙한 모습인 듯하다. 문제되는 기업·법인과 이를 수사하는 수사기관·법집행기관 사이의 협업(collaboration/ partnership)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현상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처리 방법에서는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 검찰의 인정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협업의 정도와 법적 특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논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법집행기관과 협업하는 경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각국마다 제기되는 쟁점들은 상이하고, 아직도 안정된 제도로 운영되기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완전히 논의되지 못한 상태이다.
Ⅳ. 빅데이터 시대의 사인의 수사활동
미국의 경우, 만약 사인에 의해 수행된 수사활동이 법집행공무원의 사무를 대체하는 것이라면, 즉 정부가 외주화된 법집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 또는 사인이 국가의 요원이나 도구·기구로서 활동한 경우라면,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심사를 받게 된다. 그것은 마치 국가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수정헌법 제4조가 적용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국가가 개입 또는 조장하거나 지원한 사인의 수사활동은 국가 공무원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법리는 여러 판결들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43) 다른 한편 만약 사인이 어떤 부추김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국가기관을 돕겠다고 결심한 경우라면,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리로 정착되어 있고, 이를 흔히 ‘사인수색법리’(private search doctrine/rule)라고44) 부른다.
이러한 사인수색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민간 행위자가 다른 민간 행위자를 감시하면서 효과적으로 법집행기관의 입장에 들어선 것인지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수색의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침해행위가 기능적 관점에서 법집행기관의 공무원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행위와 유사하고,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인인 행위자가 국가의 요원으로서 또는 기구나 도구로서 행동하였다면 제4조의 적용이 가능하며, 그 이유는 법집행이 명확하게 외주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5) 물론 이러한 경우만 외주화가 아니고 사인이 자발적으로 경찰업무를 맡을 경우도 외주화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달리 말해 사인·사기업의 행위가 수사절차의 특정 단계에서 법집행 기관의 개입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대체(supplant)하였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되는 수색을 함으로써 사인이 법집행기관의 수사활동을 지원(assisting)한 것인지, 사인이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전적으로 대체(displacing)한 것인지를 물어서 후자의 경우에는 수정 헌법 제4조의 적용이46)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적·사인수색법리를 재구성하자는 배경에는 특히 빅데이터 시대에서 사인은 엄청난 양의 타인의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전통적으로 경찰의 전유물이었고, 따라서 수정헌법 제4조의 통제를 받았던 조사나 수사업무가 점점 더 개인 행위자에게 맡겨지고 있고, 그럼에도 어떤 종류의 헌법적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는 것이다.47)
사인수색법리를 국가의 대리인이나 요원, 도구나 수단으로 구성하는 방법은 정부 공무원이 광범위한 수색을 수행하는 세상에서는 손쉽게 이해되고 그 핵심 관심사는 사인이나 사적 주체가, 종종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국가의 꼭두각시가 될 수 있다는 염려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요인·대리인 또는 기관이나 도구라는 개념설계는 실제 감시나 수색이 사적 영역에 뿌리를 두고, 한때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수사활동이 사실상 사적 행위자에게 상당 부분 위임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이 그러한 세상에서 법 집행기관이라고 할 것이며, 어떤 규범이 법집행기관을 규제하는 규범으로 보이는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결국 누가 수사활동을 하는지를 외부에 드러나는 모습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활동이 기능적 관점에서 민간에 외주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수색과 감시 또한 급증하게 되고, 이러한 작업을 수사기관이 전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빅데이터를 다루는 개인이나 사적 단체(기업, 법인)가 국가기관을 도와줄 수밖에 없으니,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에 준하는 법적 통제와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48)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소재의 한 컨설팅업체에서는 포렌식 수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을 20개로 요약하고 있다.49) 즉, 문제되는 공적 사무를 위임받은 해당업체의 전문화된 기술에 접근하고 전수받을 수 있는 가능성, 공공부문에 비교할 때 비용의 효율성, 유연한 조직구조를 활용한 대상 범죄에 사응한 즉각대응팀 구성·활용가능성과 확장성, 최신기술·도구 활용가능성, 검사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중립성과 객관성 증대, 가장 효과적인 자원 배분의 신속성, 반응시간의 단축 가능성, 국제적인 전문인력활용과 국제적 지식활용가능성, 제3의 기관의 이해관계의 부존재로 인한 보안성과 기밀성의 강화, 전문업체로서의 해당 사무의 질적 보장, 전문적인 사례관리, 전문가 감정의 확보 용이성, 해당 분야의 준법경영 및 작업프로세스의 표준성 보장을 통한 획득정보의 증거가치 확보, 장기협업과 수사요원의 관련 사무 훈련과 발전 기회보장, 국가기관 사무의 투명성·신뢰성·염결성 강화, 제3자의 시각에서 개선가능성, 승소률 상승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장점 뒤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상당한 위험과 불안,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위법성의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이 여러 국가들에서 현안이 되고 쟁점이 되는 이유라고 할 것이다.
Ⅵ. 맺는말
형사사법영역에서의 국가기능의 외주화 또는 민간위탁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영역인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소개한 바 있으므로,50) 이 글에서는 어쩌면 민간위탁의 본질과 한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검사의 소추기능의 외주화를 미국의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어서 현대사회에서 거대 기업에 대한 수사에서 국가 법집행기관의 인적·물적 가용성의 한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업 내부의 수사공조와 이에 대한 형벌감면 제도를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험을 소개하며 접근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1인 방송국이자 언론매체가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수사기관의 수색·압수 능력을 뛰어넘는 개인의 검색·수색 능력을 이용하는 국가의 업무방식이 사인수색법리라는 기존의 이해를 수단으로 제대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인지를 미국의 예를 통해 음미해 보았다.
이러한 몇 개국 제도의 비교 검토를 포함한 국가기능의 민간위탁에 관한 서술을 통해, 민영교도소, 통신감청이나 위치정보 등 개별적인 형사사법 관련 국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의 규정이 현행 정부조직법 제6조의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동조 제3항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인지,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수사사무나 수사처분은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이므로 개별법률로 해당 국가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언제든지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인지 등과51) 같은 근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독자들의 인식이 환기되어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또한 이 글을 통해 현대국가의 형사사법 관련 사무의 처리가 종래와 같이 국가공무원에 의해 모두 처리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만연한 낙관주의로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어 우리의 현실과 조건에 맞는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의 전제와 조건, 사후 관리와 같은 구체적 문제들이 논의의 장에 등장하기를 기대한다.52)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성숙되어 개별 쟁점들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