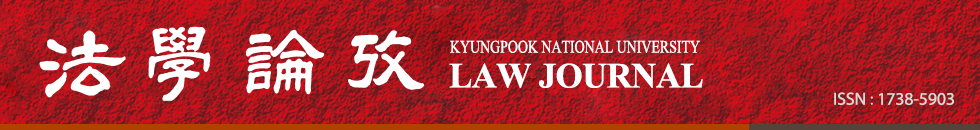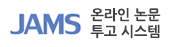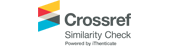Ⅰ. 들어가기
사용자의 영업비밀의 보호와 근로자의 전직이나 창업의 자유와의 이해관계 조정은 오랫동안 논의가 거듭되어 온 쟁점으로 지적재산법 분야와 노동법 분야 및 헌법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최근 영업비밀의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은 강하게 인식되어 왔다. 1991년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이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에 도입되었다.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성립요건(법 제2조 제2호)의 하나로서 ‘비밀관리성’ 요건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정의되었다. 그런데 소송실무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지적에 잇따랐다. 이에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5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015.1.28. 법률 제13081호)에서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개정되었다. 나아가 201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019.1.8. 법률 제16204호)에서는 다시 비밀관리성 요건이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되었다.1)
한편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는 종신고용제에 기초한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시장도 고용형태 다변화 내지 취업형태 다변화로 인하여 노동유동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 IMF 이후 최근까지 불경기가 거듭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해고가 행해지고, 근로자의 자발적·비자발적 전직(轉職)이나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취업형태 다변화 문제는 종종 비정규직 문제로 치환되곤 한다.2) 정규직 중심의 전통적 고용관계 모델이 해체되고 고용관계가 다양화·다변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퇴직 후 근로자의 전직이나 창업의 자유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퇴직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하는 절실한 과제이고, 우리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의 관점에서 중요하므로, 퇴직 전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와의 법익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3)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자유”이다.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협의의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 종사(수행)의 자유, 전직(轉職)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즉 직업을 변경할 ’전직(轉職)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에 포함된다.4)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여러 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자유 즉 겸직(兼職)의 자유도 가진다. 나아가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5)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그 법률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직업결정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로서의 성격을 띤 것이므로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직업종사의 자유는 법률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경업금지도 할 수 있다.6) 즉 경업금지 등도 헌법상 법률유보와 비례원칙이 적용되는 장면이다.
따라서 직업종사의 자유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에는 부정경쟁방지법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따른 전직금지 내지 경업금지 조치 청구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된다.
이 글의 목적은 보유자인 전 사용자의 영업비밀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나아가 퇴직한 근로자의 유연한 전직이나 창업 내지 기업(起業)과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확보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쟁점에 유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론의 전개에 목적이 있다. 특히 고용계약(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익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다.
Ⅱ.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근거한 영업비밀 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한 제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이 규정은 정당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규정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것,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 ③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7) 여기서 부정경업 등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나 본원적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요건으로 한 이유는 당초에 적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한 취득자와 본원적 보유자와의 이익 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8)
행위주체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이다.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는 계약 뿐만 아니라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9)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10) 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고용기간 중 사용자가 자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종업원이 지득한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에 대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11)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전직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청구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지청구의 인용범위에 대해서 보면 전직 자체에 대한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가 허용된다고 하여 한정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래 미국, 독일, 및 일본과 우리 판례를 비교한 선행논문12)은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주요국가 중 양자 중심의 비교법적 고찰이 많으므로 여기서는 주요국 모두를 검토한다.
(가) 미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보통법(common law) 국가이므로 영업비밀 보호는 민사법 체계에서는 판례법에 근거한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주로 관련되어 있어 오랜 세월에 걸쳐 발달해 왔다.13)
그런데 1979년 통일법위원회(ULC)에 의해 모델법으로 통일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s Act : UTSA)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뉴욕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州)가 UTSA를 채용하여 통일영업비밀보호법을 입법화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또 미국 형사법에서는 주(州) 차원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절도죄 등(대상이 되는 무체물에 포함하거나 혹은 영업비밀을 조문에 명기한다)으로서 처벌되어 왔다. UTSA 작성 후에 UTSA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1996년 연방경제스파이법(Eonomic Espionage Act of 1996; EEA)에 의해 영업비밀 침해를 연방법(連邦法)상 중범죄로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6년 연방법으로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DTSA)이 제정된 이후,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 대해 주(州) 법원뿐만 아니라 연방법원에서도 민사상 법적 구제를 요구받을 수 있게 되었다. DTSA는 연방법원에서의 구제 부여 이외에도, (ⅰ) 영업비밀법의 통일, (ⅱ) 외국인, 외국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의 실효화, (ⅲ) 일방적 증거품 압수절차(ex parte seizure)에 의한 입증방법의 용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DTSA의 이러한 입법목적 중 연방법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는 목적과 외국인, 외국법인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부여라는 목적은 동법 시행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다만, 영업비밀법의 통일, 일방적 증거품 압수절차(ex parte seizure)의 점에 대해서는 실현 혹은 이용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견해가 강하다.14)
영업비밀의 정의에 관하여 많은 판례를 감안하면, DTSA의 정의가 UTSA의 정의와 같다는 점을 중시하여, UTSA를 채용하여 제정된 각 주(州) 영업비밀법에 근거한 각 주(州)의 판례는 불변이며, 과거의 판례를 계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5)
DTSA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행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DTSA의 영업비밀 침해 정의에는 영업비밀 부정사용을 '달성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 점에 대해 법원은 용어가 의미하는 행위는 범죄행위 계획이 개시된 후 범죄 완료에 이르기까지 범죄가 수행 중임을 밝히는 어떠한 행위도 포함해 해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피고가 많은 국내 전시회에서 부정 취득된 것으로 알려진 영업비밀을 구체화한 제품을 선전, 촉진, 판매해 온 이상, '부정 사용'이 되었다고 인정했다.16) 그러나 이 DTSA의 '달성시키는' 행위에는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조(幇助)하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하급심 수준의 판결도 존재한다.17) 결국 현재로서는 DTSA에 관한 판례에서 침해행위를 광의로 해석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판례의 발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피해자인 보유자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으로는 이전부터 금전적 배상, 부당이득 반환, 항구적 금지명령, 잠정적 금지명령, 일시적 억제명령이 인정되어 왔다.
우선 금지명령이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품의 파괴, 침해품의 인도, 침해자로부터의 영업비밀의 반환이나 소거를 금지로 요구해야 하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으면 침해행위를 실효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한편 구제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른 법익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 입각하여 UTSA와 DTSA 모두 침해자가 당초는 영업비밀의 침해 사실에 대해 선의인 경우에는 금지명령에 갈음하여 합리적인 로열티 지불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몇몇 주(州)에서는 판례를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반증(反証)은 가능한 것, 금지명령의 요건인 '돌이킬 수 없는(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추정(推定)된다.18)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州) 연방지방법원은 DTSA와 일리노이 영업 비밀보호법 사건에서 반증 가능한 추정을 적용했다.19) 오하이오주(州)와 캘리포니아주(州)의 판결에서도 비슷한 것이 발견된다.20) 반면 다른 많은 주(州)들에서 반증가능한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1)
다음으로 금전배상이다.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근거하여 영업비밀보유자인 원고가 침해자인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제방안이다. 미국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일반규칙에 따라, 손해배상은 위반행위와 사실적 인과관계가 있고, 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그리고 침해행위가 없으면 원고가 가지고 있었을 원래의 지위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부여된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영업 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22) 이런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명확히 나타낸 판결이 연방제9순회항소법원에 의해 내려졌다.23)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영업비밀 부정사용과 부당이득을 이유로 전 종업원과 그 신규 고용주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지만, 연방지방법원은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고, 또 연방제9순회항소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인용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손해 입증을 하는 대신 침해자에 의해 얻은 이익의 인도, 라이선스 한 경우 지불해야 할 사용료(로열티) 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 사용료(로열티) 비율이 입수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나아가 UTSA와 DTSA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損害賠償)을 채택하여 침해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액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 변론단계에서는 영업비밀 해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영업비밀보유자인 원고(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사용자)는 특정한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업계의 일반적 기술과 지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 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24)
(가) 독일의 경우는,25)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U의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정비·개정이 이루어진다. 독일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the German Trade Secret Act (TSA),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GeschGehG)}은 2016년 6월 9일 EU 지침{EU Directive 2016/943 (Directive)}의 국내 실시를 위해 제정되어 2019년 4월 18일 발효하였다. 2019년까지 독일에서는 다양한 법률과 규제가 영업비밀 보호에 적용되어 왔다. 이 중에는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 독일 형법, 독일 재정법(財政法), 독일 민법(BGB), 독일 주식회사법, 독일 경쟁제한법(ARC)이 포함된다.
1896년부터 2019년까지 주로 영업비밀보호에 적용된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Gesetz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26)으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판결에 의해 영업비밀의 보호가 이루어졌다.27)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에는 특정한 부정유용행위(不正流用行為)에 대한 영업비밀보호에 초점을 맞춘 제17조, 제18조, 제19조가 규정되어 있었다. 종업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제3자에 대한 위법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9조는 공범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또한 산업스파이, 즉 종업원이나 제3자에 의한 기술적 수단의 적용에 의한 영업비밀의 부정사용(不正使用)도 금지되어 있었다. 신법(新法)이 이들 규정을 대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법(TSA, GeschGehG)에 영업비밀의 정의규정을 두고, 규제·구제의 대상이 되는 부정한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공개행위를 명확히 하였다.28) 신법(TSA, GeschGehG)이 종래 부정경쟁방지법(UWG)을 대체한 것이다.
신법(TSA, GeschGehG)에서 영업비밀의 정의(GeschGehG 제2조)는 비밀성(秘密性)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즉 비밀관리성이 취해지고 있는 것임을 명확히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전의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의 제17조-제19조에 관하여 발전한 판례법 즉 구법(舊法)에서는 영업비밀로 여겨지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게 될 가능성은 있었다. 즉 종전에는 영업비밀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 법원은 최적의 보호조치가 취해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상당성(相当性)의 관점에서 판단한다고만 말하고 있었다.29)
이 점과 관련하여, 슈투트가르트 항소법원(Stuttgart Court of Appeal)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최저기준에 관한 판례를 확립하고자 했다.30) 슈투트가르트 항소법원(Stuttgart Court of Appeal)이 제시한 요건은 중요하다. 영업비밀을 알 필요가 있는 관계자 사이에서만 공유되었는지,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었는지, 패스워드(비밀번호) 관리가 되었는지, 기재된 유체물의 관리가 엄격하게 되어 있는지는 영업비밀 해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검토될 것이다.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정의에 대해서도 독일의 구법과 신법은 차이가 있다. 즉 종전의 판례법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보면,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종업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공개, 취득 또는 사용한 경우이며, 종업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교사 등의 적극적인 의도·의욕(단순히 영업비밀이라는 인식, 고의뿐만 아니라)이 수반되고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31)
그런데 신법(GeschGehG)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행위(GeschGehG 제4조)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확대된 개념으로 결정되게 되어, 종업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도·의욕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 영업비밀의 부정한 공개, 취득, 사용했을 경우에도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정하게 취득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 판매, 수출입, 시장에 제공하는 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민사적 구제조치(금전적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32)
한편 침해에 있어서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근거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신법(GeschGehG) 제10조(1)에 따라 침해자가 적어도 과실로 행동했을 필요가 있다.33)
신법은 제외규정(除外規定)을 두고 있다. GeschGehG 제5조는 어떠한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또는 공개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규정하고 있다. 내부고발을 위한 정보의 개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침해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동법 제5조).
결국 신법(GeschGehG)에 의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범위는 영업비밀보유자와 직접의 거래관계가 없는 제3자(이른바 轉得者)의 행위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의 고의가 통상 없는 전득자(轉得者)가 침해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도 침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한 그러한 제3자에 대해 민사적 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되었다.
(다) 민사적 구제방안으로서, 신법(GeschGehG)에 의하면 영업비밀보유자는 침해자에 대해, ① 침해 배제 조치(제6조), ② 침해품의 파괴, 리콜 등의 특별 조치(제7조) 및, ③ 회계 정보 및 보상 (제8조)과 같은 구제수단을 정하고 있다.34) 즉, 제6조에서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잠정적 조치로서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의 금지와 정지 및 문서, 물건, 재료, 물질 또는 전자파일의 압류를 명할 수 있다. 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本案)에 관하여 내려지는 법원의 결정에서는 손해배상(損害賠償)35) 등 구제방안을 명할 수 있다.
또 형사적 구제방안으로 형사벌을 신법(GeschGehG) 제23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라) 영업비밀침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도 규제책을 두고 있다.
첫째,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이다. (ⅰ) 종업원은 BGB 제242조의 일반적인 성실한 이행조항에 따라 고용주의 영업비밀 및 사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종업원은 관습을 고려하여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용 중 수비의무위반(守秘義務違反)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解雇)하고 손해배상(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의 특별한 이익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무효(無效)로 된다. 종업원은 고용 후에도 영업비밀에 대한 수비의무(守秘義務)를 지지만, 업무에서 얻은 스킬이나 지식은 수비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ⅱ) 거래관계를 의도하고 교섭을 실시하는 기업은 영업비밀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기밀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BGB는 제311조 및 제241(2)조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권리 및 법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 법원은 고용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611조(고용계약에서의 전형적 의무)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근거를 찾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독일 민법 제823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6)
둘째, 독일 상법(Handelsgesetzbuch, HGB)이다. 독일 상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업금지약정은 영업주가 경업금지 1년에 대해 최소한 상업사용인 직전에 계약상 수령한 급부의 절반(1/2)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상업사용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비밀유지계약이 폭 넓게 규정되어 실제적으로 경업금지계약과 동일시 될 수 있다면 그 유효성은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이론에 의해 결정되므로,37) 이 조항은 제한적으로 비밀유지약정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항의 특색은 퇴직 후 전 종업원이 합의된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일정한 보수(보상)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또, 독일 상법 제74조의a 제1항에 의하면, 상업사용인에 대한 경업금지조항에 대한 법정의 상한기간 내지 제한은 2년이다. 즉 경업금지약정은 고용관계의 종료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결국 최대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38)
셋째,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StGB)이다. 독일 형법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또는 공개행위를 범죄로 처벌한다. 독일 형법은 제203조, 제204조, 제202(a)조 및 제355조(1)항에 근거해 영업비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개인비밀의 침해, 타인의 비밀의 악용, 데이터 스파이 및 세무비밀의 위반을 처벌한다.
(마) 독일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으로서 종래 금전배상, 부당이득반환, 침해제품의 파괴가 인정되어 왔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금지에 의한 구제, 금전배상, 보호된 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손해배상을 계산하는 기초로 하는 이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 수색 명령, 특정한 문서제출명령, 잠정적 조치 등의 구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구제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른 법익과의 균형이 중요시되고 있다. 피용자에 대하여 노동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는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또 고용기간 종료 후에 피고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약(예를 들면 거래처를 자신의 고객으로서 권유하거나 다른 종업원을 종업원 등으로서 권유하는 것의 금지)은 종전의 3년간의 평균 급여의 약 50%의 지불을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구제조치는 GeschGehG의 발효 후, GeschGehG에서 허가된 상기 구제책과 병행하여 계속해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6항에서는 영업비밀이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① 비밀관리성, ② 유용성 및 ③비공지성이 요건이지만 이들 요건은 상호 관련이 있다. 여기서 정의되는 3가지 요건, ①비밀관리성, ②유용성, ③비공지성에 대해서는 1990년 개정에서 도입된 이후 아직 변경되지 않고 있다.39) 이 유형의 부정행위는 신의칙상의 수비의무(守秘義務) 위반행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서 신의칙은 계약종료 후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채권관계에 있었던 자는 계약종료후에도 계약 상대가 계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풀이된다.40)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침해행위(부경법 제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하여 금지(제3조), 손해배상(제4조), 신용회복조치(제14조)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지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보유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것(제2조 제6항), ② 피고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할 것(제2조 제1항 4호부터 제10호까지), ③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것(제3조)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한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 ③ 요건에 갈음하여, ③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와 이에 따른 손해의 발생(제4조)이 요건이다. 또, 신용회복조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③ 요건에 갈음하여, ③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영업상의 신용을 해할 것”(제14조)이 요건이다.41)
소송 실무에서는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6항의 영업비밀의 정의규정에서 요구되는 3가지 요건 중 특히 ‘비밀관리성’ 요건이 문제 된다.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인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 혹은 ②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42) 다만 정보의 성질, 내용에 따라서는 유용성이 지극히 높고, 비공지인 것이 분명하며 영업비밀이라고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예컨대, 남성용가발의 고객명부43)이나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44)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는 비밀관리조치(秘密管理措置)는 다르다. 예컨대 사원 10여명 정도 규모의 적은 기업이라면 사내의 종업원에 대하여 정보의 반출이나 업무 외의 이용 등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45) 이와 관련하여, 위 ①②의 요건은 경직적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46)
지금까지의 재판례도 “실제로 강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비밀관리조치(秘密管理措置)에 관해서는 해당 정보의 성질, 보유 형태, 정보를 보유하는 기업 등의 규모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성이 있는 비밀관리조치가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 되어진다.47) 이들 사정은 상관관계에 있고 해당 사안에서 무엇이 합리성이 있는 비밀관리방법 인가에 관해서는 개개의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일본의 경우,48) 부정경쟁방지법은 1990년 개정이후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중 내지 종료후에 근로자가 행한 영업비밀의 부정한 사용·개시에 관하여 금지청구 등 민사상의 구제조치를 두었다. 결국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제시된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図利加害目的)으로 사용 내지 개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의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였다(법 제2조1항7호). 그리고 사용자는 이러한 영업비밀의 사용·개시행위에 대하여 금지(법 제3조1항), 손해배상(법 제4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침해행위에 제공한 설비의 제거(법 제3조2항), 신용회복(법 제14조)을 각 청구할 수 있다.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제재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재직 중의 근로자와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부정사용·개시등에 관한 형사벌이다. 즉 재직 중의 근로자의 수비의무위반(부경법 제21조1항5호) 및 퇴직 근로자의 영업비밀의 부정사용·개시에 대한 처벌규정이 그것이다(법 제21조1항6호).49)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형사벌의 대상으로 되는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 사이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에 관하여 민사상 금지청구 등의 대상으로 되는 것과 비교하여 특히 위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침해행위에 관하여 2003년 개정에 따라 형사벌(영업비밀침해죄)이 도입되기에 이르렀고, 그 후 퇴직자 처벌규정의 도입(2005년개정), 법정형 인상(2006년), 처벌대상범위의 재검토(2009년) 등의 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50)
(다) 2015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공포 2015년 7월 10일, 2016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영업비밀의 누설의 실태나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의 증대 등을 배경으로 영업비밀의 보호를 형사·민사의 양면에서 한층 강화한 것에 주안이 두어졌다.51)
민사면에서는 우선 부정사용행위에 따라 생긴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한 전시,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에 추가되었다(부경법 제2조1항10호). 또한 침해의 입증부담의 경감이 도모되었다. 즉 고의·중과실에 의해 기술상의 비밀에 관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한 자가 당해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의해 생기는 물건의 생산등을 한 경우는 그 자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생산등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부경법 제5조의2). 그 외 부경경쟁 중,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는 권리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그 행위의 개시의 때로부터 20년(개정전 10년)으로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부경법 제15조).
형벌면에서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관한 벌금액이 종래 개인에 관하여 최고 1000만엔, 법인에 관하여 최고 3억엔에서, 법인에 관하여 최고 5억엔(일본부경법 제31조1항)으로 인상되었다. 또 해외중과에 따라서, 영업비밀의 해외로 누설한 데 대한 벌금은 개인에게 최고 3000만엔(동법 제21조3항), 법인에게 최고 10억엔(동법 제22조1항1호)로 개정되었다. 종래의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누설한 자와 그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그 자로부터 직접 개시를 받은 자(2차적인 취득자)까지만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5년 개정부경법에서는 전전하여 부정하게 유통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개시한 자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였다(동법 제21조1항8호). 종래의 영업비밀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기초로 행해지는 친고죄이었지만, 이것이 고소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미수행위도 새롭게 형사벌의 대상으로 되었다(동법 제21조4항). 그리고 일본국내에서 사업을 행한 보유자의 영업비밀을 일본국외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등이 처벌의 대상으로 되었다(동법 제21조3항3호). 기타 영업비밀침해에 따라서 생긴 재산등의 몰수도 가능하게 되었다(동법 제21조10항).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퇴직한 종업원이 종전의 사업장에서 지득한 영업비밀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특히 문제된다.52)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퇴직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원칙(過剩禁止原則)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①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②침해의 최소성, ③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의 전직이나 창업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종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의 직종이나 업종을 선택하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획득에 대한 노고가 가장 적고, 얻게 되는 수입도 가장 높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근로자가 고액의 대가와 교환으로 경쟁사에 전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위법한 것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합리적인 특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전직이나 창업할 때 동종의 직종이나 업종을 선택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한다는 것이 아닌 한 자유이어야 한다. 그 자유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퇴직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하는 절실한 과제이고, 우리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의 관점에서 중요하다.53)
우리 헌법은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종사의 자유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에는 부정경쟁방지법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따른 전직금지 내지 경업금지 조치 청구는 과잉금지의 원칙릉 위배하지 않아야 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된다.
근로자가 생계 수단인 직장을 퇴사한 후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에 기초하여 전직이나 창업할 때 동종의 직종이나 업종을 선택하는 것은 원칙상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에 포함된다고 기대된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조항은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에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및 기술을 토대로 전직이나 창업할 때 동종의 직종이나 업종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침해되는 사익(私益)이 매우 크다. 이에 반해 퇴직후 근로자에까지 미치는 영업비밀보호조항은 영업비밀보유자인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 보장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公益)은 있다고 해도 미미하거나 심지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퇴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대상조치(代償措置)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특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기간, 지역, 업종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전직이나 창업 자체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여 영업비밀침해라고 해석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과잉금지원칙(過剩禁止原則)에 위배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
(가) 소송의 변론단계에서는 원고가 영업비밀보유자임을 주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자신의 기술상 정보나 경영상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의 증명이란 영업비밀이 담긴 증거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심리를 반드시 거쳐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영업비밀보유자의 상대방은 원고 주장의 해당 정보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든지, 해당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다.5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용인이 퇴사 후에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정보가 동종 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55)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에 수반하는 규제의 결과로써 퇴직한 근로자의 원활한 전직이나 창업 내지 기업(起業)과 재정적 수입의 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유자인 전 사용자가 전 근로자에 대해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정보를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이나 기술·경험(skill and experience)과 구별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시하거나 또는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지 않으면, 퇴직한 근로자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사용이나 공개를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통상적으로 볼 때,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이나 기술·경험(skill and experience)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고용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정보이므로 영업비밀로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업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정보로서 회사로부터 특별히 습득한 것이 아니라 다년간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정보56) 등이다.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이나 기술·경험(skill and experience)은 이를 종업원이 기억하고 있어서 영업비밀로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정책적 이유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57) 이 견해는 이런 점에서 기억(memorization)을 통한 취득 문제와 구별한다.
경쟁법적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가 퇴직 전 직장에서 습득한 일반적 지식과 경험, 기억 및 기술을 새로운 직장에서 사용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사회 발전을 유인시킬 수 있다. 즉 근로자가 퇴직 전 자신의 직장에서 습득한 일반적 지식과 경험, 기억 및 기술을 사용할 권리(The “right [of an employee] to use [his] general knowledge, experience, memory and skill”)는58) 노동 이동성(labor mobility)과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을 수행할 자유(the employee’s freedom to practice his profession), 독점 완화(mitigating monopoly)에 대한 공익을 증진한다.59) 더구나 근로자가 한 가지 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 지식이나 기술과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노하우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개발할 때에는 동시에 자신의 지식과 기술도 향상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된 정보는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60)
(다) 한편, 업무상 제시할 필요가 없는 말단의 근로자까지 일반적 정보와 혼연일체로 된 모양으로 만연하게 비밀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그 사용·공개가 부정한 것이라고는 알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를 비롯하여 구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의 점에서 문제가 있다. 나아가 근로자의 전직이나 창업·기업(起業)이나 그 후의 재정적 수입의 확보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함으로써 퇴직후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안은 비밀관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밀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보호되어야 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의 구별이 불명확함으로써 비밀관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그러한 비밀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 나아가서는 경제활동의 안정성의 확보의 관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판례가 있다.61)
또 일본의 경우 근로자에 의한 비밀정보의 사용·공개에 관한 판례에서 비밀관리성이 문제로 되었던 것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용이하게 인식가능한 정도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인 객체의 범위 및 당해 정보로의 접근이 허용된 주체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화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고에 입각하여, 당해 정보에 접근하는 자에게 당해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인식가능성),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되어 있는가(접근 제한) 등이 그 판단요소로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62) 그 어느 쪽이 흠결되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도 많다.63)
일본의 노동법 학계에서는 비밀관리성에 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정도로 비밀관리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비밀의 인식가능성 유지라는 것을 가리키며, 비밀의 인식가능성(특정·표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자의 제한(인적 제한), 접근의 장소적·물리적 제한(물적 관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분석되고 있다.64) 그리고 판례는 엄격하게 비밀관리성을 요구하는 경향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65)
요컨대 비밀관리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계약 종료 후의 자유로운 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극히 중요하다.66) 향후에도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주시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 또 한편, 일본의 경우는 영업비밀이 기업측에서 공개된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업무에 종사한 과정에서 스스로 개발·취득한 것인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우선, 平成2년(1990년) 개정 당시의 입안담당자의 견해는 해당 영업비밀이 애초 보유자가 기업과 종업원의 어느 쪽으로 되는 것인가, 즉 해당 영업비밀이 어느 쪽에 귀속하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해당 영업비밀이 종업원에게 애초 “귀속”하는 경우에는 기업으로부터 공개된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67) 이러한 영업비밀의 귀속에 관해서는 영업비밀의 성질에 따라서 각 지적재산권의 실체법상 규정을 참고로 하여 결정해야 하고, 예컨대 영업비밀이 발명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 특허법 제35조, 저작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 저작권법 제15조의 이념에 비추어, 개개의 영업비밀의 성격, 해당 영업비밀의 작성 시의 발안자나 종업원의 공헌도 등, 작성이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 귀속을 판단하는 것으로 된다.68)
학설 중에는, 종업원이 스스로 발명·취득한 영업비밀에 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69) 이 견해는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7호70)의 “제시받은”(示された) 이라는 문언을 글자의 뜻(字義)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고, 종업원에 의한 정보의 이용·개시(開示)에 관해서는 계약법의 문제로 될 뿐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71)
한편, 사업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제시받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72)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업자의 승계취득을 인정해도 좋다고 생각되지만, 종업원의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약(制約)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후의 경업행위의 금지는 경업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합리적인 범위(기간, 활동 등) 내에서의 경업제한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특약을 근거로 행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재판례는 특약에 있어서 제한의 기간, 범위(지역, 직종)을 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나 일정한 대상조치(代償措置)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에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73)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고용계약 등에 있어서 경업피지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자유경쟁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없는 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74)
요컨대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종업원의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영업비밀의 승계에 관한 특약의 효력은 부정(否定)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업자가 거래관계를 가지는(전 종업원이 담당하지 않았던 고객도 포함하는) 모든 고객에 관하여 고객정보의 이용에 대해 퇴직 후는 제한한다는 취지의 특약(特約)에 기초하여, 이들 고객과의 관계에서 전 종업원이 경업하는 것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제한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술상 정보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잃는 경우가 없도록, 예컨대 상당한 대가(對價) 등 합리적인 대상조치(代償措置)를 요구하는 것 등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75)
(가) 앞서 보았듯이, 퇴직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원칙(過剩禁止原則)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은 영업비밀의 특정에 대한 쟁점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과잉금지원칙(過剩禁止原則)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①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②침해의 최소성, ③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영업비밀의 특정 문제는 법원의 입장에서 확정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나 강제집행의 대상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어느 정도 특정하여 영업비밀보유자인 원고가 소장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76) 즉 소송상 영업비밀의 특정이란 법원이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민사사건의 경우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글로써 해당 정보의 특징을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77)
나아가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는 영업비밀로서의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78)
결국 소장(訴狀)의 청구원인에서는 원고가 보유하는 영업비밀 내용을 어느 정도 특정하고,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의 응소 태도에 따른 것이지만 영업비밀의 전부를 분명하게 할 필요는 반드시 없다. 예컨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영업비밀을 어느 정도 특정하여 주장 입증하는가에 관하여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79)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가 침해하였다고 하는 영업비밀의 일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80)
(나) 한편, 미국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실무를 보면, 영업비밀보유자(A trade secret owner)인 원고가 제출하는 소장(complaint)에서 영업비밀의 특정(特定)이 의무(the owner's obligation to identify)로서 요구되고 있다. 영업비밀의 특정 여부가 소송의 승패(勝敗)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소송 개시 단계에서 법원의 원활한 심리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무가치한 주장을 억제하며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상대방(피고)의 사려 깊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영업비밀보유자인 원고에게 영업비밀의 특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이 요구된다.81) 만약 보호가능한 영업비밀을 제대로 충분히 특정하지 못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82)83)84) 그 이유는 원고가 일반적인 영업비밀 범주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피고와 법원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만약 존재한다면 부정취득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85)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됨으로써 가치를 얻지만, 영업비밀보유자(A trade secret owner)는 소송 중 어느 시점에 피고에게 어떤 정보가 부정이용 되었는지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영업비밀을 밝혀야 한다. 이는 영업비밀 유지와 공개 사이에 내재적인 갈등을 야기한다. 미국의 대부분 주(州)의 영업비밀법의 기반이 되는 통일영업비밀보호법(UTSA)이나 2016년 연방영업비밀보호법(DTSA)에는 영업비밀의 특정 시점이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통일영업비밀법(UTSA,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3426.5조)에 의하면86), “본 조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주장된 영업비밀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여기에는 증거개시절차와 관련하여 보호명령을 내리고, 비공개 심리를 개최하고, 소송기록을 봉인하고, 소송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주장된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87)
한편,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 법원은 원고가 영업비밀 관련 증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합리적인 구체성"을 가지고 영업비밀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2019.210조(2024)에 의하면,88) “통일영업비밀보호법{UTSA, 민법 제4편 제1편 제5편(제3426조로 시작)}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증거개시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3426.5조(UTSA) 아래 적절한 명령에 따라 합리적인 구체성을 가지고 영업비밀을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9) 나아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주의 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문제의 영업비밀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까지 피고의 증거 조사 응답을 유예하는 명령을 내렸다.90)
영업비밀의 특정(特定)의 정도와 관련하여 종래 미국 판례91)에 따르면, 소장에서 원고가 설명해야 하는 영업비밀의 특정의 정도는 영업비밀로서 보호 객체를 해당 영업에 관한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이나 해당 영업에 숙련된 사람들의 특수한 지식(special knowledge)과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고, 피고가 최소한 그 영업비밀이 속하는 경계(the boundaries)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만약 청구된 영업비밀의 대상이 제조 공정(방법)인 경우, 원고(the plaintiff)는 제조된 최종 제품(the end product manufactured)을 특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세부 사항(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공정(방법)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은 재판 시 충족해야 할 쟁점들을 법원과 피고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알리고, 또 적절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범위(the scope of appropriate discovery)를 확인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Ⅲ. 비밀유지약정에 근거한 영업비밀 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한 제한
근로계약의 기본적 의무(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에 더하여 근로관계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의 성실의무와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이는 근로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의무이다.92) 근로자의 성실의무의 내용으로서 흔히 영업비밀유지, 경업금지의무(경업피지의무), 사고대처의무 등이 거론되고 있다.93) 즉 재직 중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신의칙에 따라 영업비밀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다.94) 따라서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알게 된 근로자는 신의칙상 이를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렇다.95)
근로자가 재직하면서 알게 된 모든 사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노동법학계에서는 비밀유지약정의 대상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의 정의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이어야만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견해96)가 있다. 이 견해는 영업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에 반해 근로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미치므로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97)가 있다.
나아가 노동법학계에서는 근로계약상의 신의칙 의무로서 영업비밀유지 의무는 원칙상 근로계약의 존속 중(재직 중)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98)와, 비밀유지의무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원칙적으로 존속한다는 견해99)가 대립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전직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질서(민법 제103조)에 어긋나 무효가 아닌 이상,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100)
한편 비밀유지의무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원칙적으로 존속한다는 견해101)에 따르면, 근로관계 종료 후의 비밀유지 존속이 실질적으로는 퇴직 근로자 자신과의 경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요컨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 재직 중 영업비밀유지 약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서 사용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침해행의 금지·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의 전직금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사실상 영업비밀유지 의무는 퇴직 후까지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102)
노동계약 등에서 침해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진다는 합의가 존재하고,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서 영업비밀 또는 기밀정보 유지의무 위반을 호소하는 경우 각 주(州)의 판례법에 따라야 한다.
각 주(州)의 판례는 기업 간 비밀유지 조항과 노동자와의 비밀유지 조항으로 달리 접근한다. 우선 기업 간 비밀유지 조항에서는 계약조항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해석한다. 반면 기업과 노동자와의 비밀유지 조항에서는 종업원이었던 사람의 자유로운 시장참가에 대한 구속이 비합리적인 시장거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밀하게 조사하게 된다.103) 구체적으로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밀 정보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에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104)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조항이 너무 광범위한 경우에는, (ⅰ)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밀성이 높은 정보뿐이라고 하여, 문제의 정보는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거나, (ⅱ) 금지명령을 좁은 범위에서만 발령한다는 조치를 취한다.105) 또는 (ⅲ) 비밀유지조항은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106) 따라서 넓은 정보를 '기밀정보'로서 커버할 수 있는 정의를 마련하는 것은 보유자에게 중요하지만,107) 너무 무제한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역효과다.
일리노이주, 펜실베이니아주,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 등 몇몇 주에서 전 고용주의 중요한 기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종업원이 경쟁 상대의 영업상 중요한 지위로 전직(이직)해 버리는 것을 '영업비밀을 필연적으로 공개해 버리는 것'으로 추정(推定)하여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른바 ‘불가피한 누설 이론’(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IDD)에 기초한 판례법리이다. 예컨대 제7순회연방항소법원은 2건의 사례에서 보통법(common law)에 의하여108) 또는 일리노이주 영업비밀법(The Illinois Trade Secrets Act, ‘I.T.S.A.’)에 따라서,109) 불가피한 누설 이론(IDD)을 논의하고 있다.110)111)
이처럼 미국의 경우 보통법에 의하여 '불가피한 누설 이론'(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IDD)을 인정하고 발전시켜 오다가, 1990년대 중반의 PepsiCo 판결112) 이후에는 UTSA(Uniform Trade Secrets Act)의 영업비밀에 대한 유용이 우려되는 경우(Threatened Misappropriation)에도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불가피한 누설 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PepsiCo 사례’의 경우에는 UTSA에 근거하여 사업을 모든 형태의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경쟁자에 고용된 종업원이 전 직장에서 얻은 지식을 사용할 잠재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전직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동 사건에서 언급된 주요 요소는, (ⅰ) 전직 사용자와 현직 사용자 간의 경쟁의 정도 (ⅱ) 종업원의 직책이 전후 직장에 걸쳐서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의 정도 (ⅲ) 전직 종업원이 갖고 있던 기술적 또는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의 정도 등이다.
한편, 미국의 '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입법론상 시사점이 없지 않지만, 반면 미국 내에서도 각 주(州) 별로 학설별로 논란이 많다. 학계에서는, 제7순회항소법원 판례의 분석과 펩시코 판결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하면서, 궁극적으로 고용주가 경쟁사를 위해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불가피한 누설(공개)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근로자의 이동성을 저해하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협상력을 박탈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또 불가피한 누설 이론의 일반적인 수용이 광범위한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일반적인 기술 지식의 보급과 경제 성장(general technical knowledge and economic growth)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존재한다.113) 또 이러한 "불가피한 누설 이론“을 사용하면 일리노이주 법원과 같이 고용주의 정보가 실제로 또는 위협적으로 악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준경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나 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114)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비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법제에 바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와의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생각건대, 미국의 '불가피한 누설 이론'을 입법론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는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와의 이익형량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이익형량의 원칙 내지 법인균형의 원칙상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아야 비로서 영업비밀의 공개 등이 추정된다고 해석하는 접근방법이 판례상 먼저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불가피한 누설 이론'의 전제는 종업원이 사용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사용자만이 가진 영업비밀은 종업원이 퇴직한 뒤에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종업원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은 사용자가 독점할 수 없는 것이므로 퇴직 후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국의 '불가피한 누설 이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요컨대, 미국의 '불가피한 누설 이론'에 대해서는 소극적 접근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전 종업원 등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자가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사용해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발령될 수 있지만,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비해 그 타당성이나 범위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115)
비밀유지계약(Confidentiality Clause in Germany)은 독일에서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116)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약이 실제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특정 정보와 관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구체적 합의가 그 범위에 있어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117) 만약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비밀유지계약이 폭 넓게 규정되어 실제적으로 경업금지계약과 동일시 될 수 있다면 그 유효성은 경업금지이론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 모든 고객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종업원이 부담하는 내용이 비밀유지계약에 포함된 경우 등이 경업금지계약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118) 한편 비밀유지계약에 대해 법원이 구제를 제공하는 데에는 다른 법익과의 균형이 중요시되고 있다. 피용자에 대하여 노동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유효하게 체결된 비밀유지계약상의 의무는 중요한 검토요소로 보면서도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의무(nachwirkende Verschwiegenheitspflicht)의 위반여부와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 제1조(현행 제3조)에 의한 책임의 성립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시하고 있다.119)120)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개시(공개)하는 상대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비밀관리성의 하나의 증식(證式)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비밀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것에 관한 비밀유지의 특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영업비밀에 관하여 보유자인 전 사용자가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하여 청구하지 않고, 전 근로자와 사이에 체결한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약정 위반의 채무불이행에 기초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를 행하는 예도 있다.121)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청구가 사용·공개의 태양 등의 관점에서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비밀유지약정에 기한 청구는 근로자의 영업비밀의 사용·공개에 의해 바로 의무위반이 성립하여 청구가 인정된다.122)
우선 근로자와 사이에 명시적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기초하여 금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였다. 또한 그러한 특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노동계약계속 중에는 근로자가 신의칙상 부수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이런 의무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금지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123) 일본 판례 중에서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124), 징계해고125)를 합리적이라고 한 예가 보이고, 또한 채무불이행과 함께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예126)도 존재하였다. 학설도 비밀유지의무를 노동계약에 부수하는 성실의무의 하나로 위치 지웠다.127) 이 점은 현재의 일본 학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128)
노동계약이 종료한 후에 특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지는가, 그에 위반에 대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직접 문제로 된 사안이 없고,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았다. 일본 학설에서도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가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존속하거나 혹은 약간의 여운으로서 잔존한다는 견해129)와 특약이 없는 한 해소한 이후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모두 자유롭다는 견해130)가 대립하고 있다.
영업비밀이 적절히 보호되고, 게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원활하게 전직·기업(起業)하여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지 않기 위하여, 비밀유지약정에 관하여 다음의 2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비밀유지약정이 유효로 되기 위해서는 보호에 가치 있는 영업비밀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해서는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의 범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보다 광범위하게 미칠수 있지만,131) 그러한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약에 의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의 전직·기업(起業)의 자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영업비밀 등에 관한 비밀유지약정의 효력은 보유자인 사용자에 따라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의 직업선택 또는 영업의 자유에 비추어, 그 비밀의 성질·범위, 가치, 당사자(근로자)의 퇴직전의 지위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공서양속에 반하고,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해석된다. 학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132) 판례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
Ⅳ. 경업금지약정에 근거한 영업비밀 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한 제한
일반적으로 경업금지의무는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용자에게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근로자는 재직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신의칙으로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만, 퇴직 후에는 근로계약이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로부터 자유롭다. 이처럼 근로관계 존속 중에 취득한 지식 등을 퇴직 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이다.133)
즉, 경업금지의무는 사용자의 업무부류와 경합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경업금지의무는 비밀유지업무와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가진 의무이다. 비밀유지의무는 영업비밀의 침해를 금지하는 것이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 직업활동을 제한 한다. 이와는 달리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 자체를 금지받게 되는 의무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134)
비밀유지의무는 종업원에 따른 정보누설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는 정보누설에 “관련 있을 수 있는 행위”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회사의 신용을 해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을 매스컴 등에 누설하는 경우는 비밀유지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경업회사에 취직하더라도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경쟁사에 전직하거나 경쟁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경업회사에 취직하여 영업비밀을 부정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일부 범위에서 양자는 제한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중복한다. 그렇지만, 경업금지의무는 비밀유지계약을 보전(補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35) 기술이나 노하우는 무형(無形)이고 비밀유출이 용이하다고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유지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다고 판시한 일본 판례도 있다.136)
요컨대, 경업금지의무는 비밀유지계약에 의해 충족되지 못한 사용자 이익의 부족 부분이나 결손 부분을 메워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 약정은 적법하여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아래에서 보듯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일관되게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근로관계 당사자는 부수적 의무(Nebenpflicht)로서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의 성실의무와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각각 부담한다.137) 이는 근로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의무이다.138) 근로자의 성실의무의 내용으로서 흔히 영업비밀 유지, 경업금지 의무(경업피지 의무), 사고대처 의무 등이 거론되고 있다.139)
그러나 근로자가 재직하면서 알게 된 모든 사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의 정의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이어야만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140)
이러한 근로계약상의 신의칙 의무는 근로계약의 존속 중(재직 중)에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유지 의무가 퇴직 후에도 인정되는지는 근로계약상 신의칙과는 무관하고 판례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별도 약정 위반 등과 관련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141)
하급심의 경우142),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나아가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그 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약정을 유효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판례를 보면, 우리나라 법원은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전직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용자와 종업원이 전직금지를 위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ⅱ)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ⅲ) 경업제한의 기간 및 지역 및 대상 직종, (ⅳ)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ⅴ)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ⅵ)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판단 유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약정이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 기업간의 경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동력과 정보의 유출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144) 종업원이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면 위 의무의 시간적·장소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주 어려운 해석의 문제 내지 정책적 판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가 계약상 명시적으로 퇴직 후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당연히 그 시간적 효력범위도 근로계약기간과 마찬가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비밀유지의무의 특성상 퇴직 후에까지 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무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배타적 권리의 속성상 퇴직한 종업원도 일정한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에 대하여 다수의 쟁점이 있다.145) 나아가 퇴직후의 경쟁업체에의 취직을 금지하거나 또는 경쟁적인 영업의 수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계약조항(non competition clause)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경업금지조항이 유효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경업금지의무의 기간이나 보상여부 또는 지역 또는 영업의 범위 등이 제한되어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업금지의무의 강제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유효성이 의문시된다.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경업금지의 합리적 기간이나 지역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의 설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146) 이와 같이 근로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혹은 퇴직자의 영업의 자유와 본질적으로 충돌하게 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와 동일한 요건하에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한다 할 것이다.147)
요컨대 퇴직후 경업금지약정의 개별적 내용에 따라서는 근로자 개인 내지 노동시장의 경제적 유연성 내지 이동성을 감소시키고, 근로자 개인이 바람직한 삶의 과정을 추구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148)
한편, IT업종에서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같은 기준을 채용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런 점에서 캘리포니아주법상 관련 규정은 시사점이 적지 않다. 그 규정은 바로 1827년 캘리포니아 시민법에 포함된 Section 16600 of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16600 (이하: 코드 16600) 라는 조항이다. 이 코드 16600에서는 “개인의 합법적인 취업, 거래, 또는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every contract by which anyone is restrained from engaging in a lawful profession, trade, or business of any kind is to that extent void)라고 규정하고 있다.149)150) 이 코드 16600의 의미에 관하여, Ronald J. Gilson에 의하면, 코드 16600에 의해 육성된 노동자의 이동성 내지 노동유연성(employee mobility)은 다른 주에서의 상대적인 노동비유연성과 대비할 때, 실리콘밸리의 초창기 경제활성화를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는 직업문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151) 이에 대하여 실제로는 캘리포니아 노동자들이 ‘코드 16600’에 규정한 것만큼 전직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152)
우리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153)
한편 대법원 판례154) 중에는,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155)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원들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다.
결국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156)
여기서 이 대법원 판결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② 영업비밀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③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 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시한 점에 특색이 있다. 이 판결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 등 노하우 및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즉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 등도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157)
(가) 비밀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내용의 경업금지의무는 ‘합리성’(reasonableness)을 결여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된다. 판례에 의하면,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없다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경업금지조항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158)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전직금지약정)의 ‘합리성’(reasonableness)을 검토하기 위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159) 첫째, 그러한 약정은 숙련된 근로자의 이동성과 경쟁적 경제에 필수적인 정보의 흐름을 모두 제한하기 때문에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160) 둘째, 계약이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협상력이 정교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부과된 제한에 대한 전액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61) 셋째, (비록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크게 의존적이지 않지만), 이러한 약정은 한때 생산적인 사람을 노동력에서 제거할 수 있으므로 경제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162)
(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은 2024년 4월 23일 연방거래위원회법(FTC법)에 따라 “경업금지조항규칙(Non-Compete Clause Rule)”(이하 ‘FTC 규칙’)을 채택하였다.163) FTC 규칙은 2024년 4월 23일 최종 확정되어 2024년 9월 4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된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용계약에서 사실상 모든 경쟁금지약정(a non-compete clause)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규칙을 제안한 것이다. FTC는 경쟁금지계약이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이라고 판단하여 이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은 시행일 또는 그 이후에 근로자와 경쟁금지조항(이하 "경쟁금지조항")을 체결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방법이라고 규정한다. 기존 경쟁금지조항(즉,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경쟁금지조항)과 관련하여 규칙은 고위 임원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다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고위 임원과의 기존 경쟁금지조항은 유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이러한 계약을 다루지 않는다. 이처럼 고위 임원의 경우 기존 경쟁금지조항은 계속 유효하지만, 다른 근로자와의 기존 경쟁금지조항은 시행일 이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164) 고용주는 고위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기존 경쟁금지조항을 더 이상 시행할 수 없다는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칙의 제정 배경에는 네거티브 외부효과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165) FTC 규칙의 취지는 공정한 경쟁의 경업금지조항에 의한 저해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미국에서는 모든 근로자와의 새로운 경쟁금지조항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채택하게 된다. FTC 제910.1.조166)에 의하면 “근로자(emplyee)”만이 아니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등도 포함된다. 즉,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167)
이처럼 FTC 규칙의 시행일(2024년 9월 4일)이후에는 “노동자(worker)168)”에 대한 “경업금지조항”169)의 체결이나 강제가 경쟁법인 연방거래위원회법170) 제5조a항1호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에 해당하는 것171) 등을 정하고 경업금지조항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FTC 규칙이 금지하는 경업금지조항은 계약상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는다.172)
경업금지조항(non-compete clause)의 네거티브 외부효과로서는, ① 노동자가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상당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퇴사 후에는 전문성 없고 생산성이 낮게 되는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점과, 사용자 사이에 우수한 노동자를 둘러싼 경쟁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결과 경업금지조항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점 등에서 노동시장에서 경쟁조건을 저해하는 점, 그리고 ② 퇴직자에 대하여 같은 업종이나 같은 직업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기업과 숙련노동자의 결합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신규 사업설립이나 이노베이션을 억제하는 점 등에서, 제품·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조건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FTC 규칙의 입법 기초에 있다.173)
다만, 2024년 8월 20일 텍사스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는 라이언 사건(Ryan LLC v. FTC)에서 “경업금지조항규칙(Non-Compete Clause Rule)”에 관한 FTC 규칙을 무효라고 하여 이 FTC 규칙의 시행일 이후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174) 다만 ‘라이언 사건’ 판결은 FTC의 항소가 승소하지 않는 한, 2024년 9월 4일 이후 전국 어디에서도 경쟁금지규정이 발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FTC 주장이 제5순회연방항소법원이나 연방대법원에서 더 따뜻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규칙은 무엇보다도 경쟁금지계약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감시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팬데믹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사무실 없는 인력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처럼, 이 규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조항 없는 근로 관계의 가능성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이미 직장 내 경쟁금지조항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주는 2023년 7월 1일부터 직장 내 경쟁금지조항을 금지했고, 인디애나주와 같은 다른 주들도 특정 상황에서 경쟁금지조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175) 결국 이 규칙의 운명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2025년 새로운 대통령인 트럼프 선출에 수반하여 새롭게 임명된 위원에 따라 FTC 규칙이 변경·철회될 가능성도 있다.176)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FTC 규칙의 실무에 대한 영향은 불투명하다. 다만, “경업금지조항규칙(Non-Compete Clause Rule)”을 정한 이번 FTC 규칙은 경업금지조항에 관하여 명쾌한 규칙(rule)이 노동력의 유동화(流動化)를 촉진한다는 분석177)이나, 사용자가 영업비밀보호나 비밀유지특약 등 보다 경쟁제한적이지 아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다는 점178)을 이유로 경업금지조항에 대하여 합리성(合理性)기준이 아니라 전면금지 접근방법을 채용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179) 향후에도 그 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근로자는 고용주와 유사업종 경쟁이 금지되지만, 고용관계의 종료와 함께 경쟁금지도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퇴직 후 경업금지(경쟁금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고용주의 보상과 함께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180) 고용기간 종료 후 피고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약(예를 들면, 거래처를 자신의 고객으로서 권유하거나, 다른 종업원을 종업원 등으로서 권유하는 것의 금지)은 종전의 3년간의 평균 급여의 약 50%의 지불을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상업사용인에 대해서는 독일 상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 상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업금지약정은 영업주가 경업금지 1년에 대해 최소한 상업사용인 직전에 계약상 수령한 급부의 절반(1/2)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상업사용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독일 상법 제74조의a 제1항에 의하면, 경업금지약정이 영업주의 정당한 거래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경업금지약정은 상업사용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에 상업사용인이 직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부당하게 이렵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 그 경업금지약정은 상업사용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경업금지약정은 고용관계의 종료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181)
일본의 경우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재직 중 및 퇴직후에 걸쳐 문제되고 있다.182)
(가) 우선 재직 중 경업금지의무이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존속 중에는 일반적으로 동 계약의 성실의무에 기해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업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업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규정(예컨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등)에 의하여, 종업원은 징계처분, 해고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183). 즉, 재직중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의 하나로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여기에 위반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확실히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점에서 비밀유지의무 즉 수비의무(守秘義務)이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제약 정도가 높다. 그러나 재직중의 근로자가 경쟁회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기업비밀의 누설이나 고객의 탈취를 유인 내지 야기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삼갈 의무는 신의칙상 당연하게 발생하는 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184)
(나) 다음으로,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이다. 일본 학계에서는 퇴직 후의 경업금지의무(경업피지의무)를 둘러싸고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근거로 하여 노사간의 개별적인 합의(특약)를 필요로 하는 입장185)과 취업규칙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견해차가 보인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퇴직후의 경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취지의 특약이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퇴직노동자는 신의칙에 기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기업비밀유지의무를 진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비밀유지의무는 당연하게 경업금지의무(경업피지의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업제한을 위해서는 특약이 필요하고, 그 특약은 노동자의 진정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86) 또, 후자의 입장에서는 노동계약법(이하, 「노동계약법」) 7조에 근거하는 노동계약의 내용이 되는 「노동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다. 유력설(有力說)은 노동계약과의 관련성을 중시하여 '노동조건' 해당성을 인정하고 취업규칙의 합리성 판단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187) 다만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노동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조항에 구속되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188)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의 존재여부는 실제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 즉 경업회사를 설립하거나 하려고 설립준비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종업원을 상대로 퇴직금의 감액·몰수·손해배상청구 및 경업행위의 금지청구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 후의 문제는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혹은 퇴직자의 영업의 자유와 본질적으로 충돌하게 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와 동일한 요건하에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한다 할 것이다.
예컨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전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금 감액 또는 몰수에 대하여는 퇴직금 규정에 그러한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규정의 합리성과 해당 사례에 적용가부는 퇴직 후 경업제한의 필요성과 범위(기간, 지역 등), 경업행위의 양상(어느 정도 배신적인가)등에 비추어 판단된다189). 다음으로 퇴직 후 경업행위의 금지는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법적 조치이므로, 기간·활동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한 경업제한특약이 존재하고 또한 그 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 범위에 비추어 해당 특약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근거로 이행을 구할 수 있다190).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경업행위가 이전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는 양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대규모의 고객탈취, 종업원의 대량 스카우트 등)에는 위와같은 특약에 근거하여 인정되며191), 또는 이전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도 인정될 수 있다192)193). 또한 경업행위가 비밀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동 의무에 근거한 행위의 금지 및 손해상청구도 가능하다.
(다) 일본 판례에서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 노하우 등을 이용당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비밀유지의무(수비의무)뿐만 아니라 경업금지의무(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에도 상당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19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퇴직 후의 경업피지의무는 노동자의 취로(就勞) 자체를 제약하는 것에서부터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일본 헌법 제22조 제1항)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195) 일본 판례에서는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고려하여 경업금지의무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에 있다.
(1)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소송상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보면,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이 있었다는 것의 입증은 곤란한 경우도 많지만 근로자가 경업하고 있는 것의 입증은 그것에 비하여 현격히 용이하다. 그래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의무 지우고 영업비밀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사용자가 다수 있다. 그러나 비밀유지약정은 해당 영업비밀을 누설·사용·공개하지 않으면 종전과 마찬가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에 반해, 경업금지약정은 종전과 마찬가지의 직무를 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직접의 제한이 된다.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한편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원활하게 전직·기업(起業)하고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내지 유효성은 이하의 세가지 점에 유의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196)
첫째, 영업비밀 등 특약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경업금지약정에는 영업비밀에 한정하지 않고 그 주변의 비밀정보도 포함하여 사용·공개하지 않도록 경업자체를 금지하는 특약이나, 단순히 전 근로자의 고객을 가지고 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경업을 금지하는 특약도 있다. 특약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없으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해석할 것이다.
둘째,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의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경업제한의 기간, 장소적 범위, 제한대상으로 되고 있는 직종의 범위, 대상조치(代償措置 ) 등에서 보아 필요하고 상당한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업금지약정은 공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
셋째, 종래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전직금지약정)의 내용을 기존의 약정을 축소하여 합리적인 범위에까지 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전직금지약정)의 기간에 대해 과잉 부분을 무효로 하여 감축하는 판례197)198)가 적지 않고 상당수 축적되어 있다. 전직금지기간의 산정에 관한 우리 판례를 종합하여 현황을 정리 및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199) 무엇보다 구체적인 전직금지기간 산정 시 영업비밀이 인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한 경우와 약정에 의한 경우의 처리결과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거의 없이 거의 1년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크고, 그 영향 등으로 채권자가 스스로 본래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감축하여 퇴직일로부터 1년간의 전직금지만 구하기도 하는 등, 그 기간이 상당 부분 관행화된 느낌이며, 약정이 없는데 법만을 근거로 전직금지를 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히 심리 결과 영업비밀이 인정되는 경우도 보통 전직금지약정에 근거하여 전직금지를 명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분석되고 있다. 우리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이른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一部無效)의 법리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민법 제137조에 의하면, 일부무효에 관하여 민법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지만(제137조 본문), 당사자 쌍방이 법률행위 당시 일부무효임을 알았다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유효라고 한다(제137조 단서).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한 것이라도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법이 효력부여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원칙(原則)과 그것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기하여 잔부(殘部)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예외(例外)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200)
경업금지약정(전직금지약정)에 있어서 명시·특정된 제한범위나 제한대상은 부작위채무인 경업금지의무에 따른 금지내용을 정하는 계약의 중요부분(重要部分)이라고 해석된다. 또 근로자와의 교섭력의 격차에 편승하여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특약을 체결시키는 인센티브를 사용자에게 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도 법원은 안이하게 법률행위의 일부무효(一部無效)의 문제로 처리하는 태도는 가급적 삼가야 할 필요가 있다.201)
생각건대 경업금지약정(전직금지약정)의 기간과 관련하여 법원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기하여 잔부(殘部)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예외(例外)인 점에 입각하여 극히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예외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를 함부로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약의 합리성 판단에 관한 리딩케이스로 평가 되는 일본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수단의 확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여, “(특약)의 합리적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제한의 기간, 장소적 범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종의 범위, 대상(代償)의 유무 등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익(기업비밀의 보호). 채무자의 불이익(전직, 재취직의 부자유) 및 사회적 이해(독점집중의 우려, 그것에 수반한 일반소지자의 이해)의 3가지 관점에 서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두는 것을 요한다”고 하고 있다.202) 그 후의 판례도 동 판결의 내용에 대체로 따라고 있는 것이 많다.203) 이것은 학설에도 지지받고 있다.
최근의 일본 판례는 고용유동화 현상을 염두에 두고,204)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추어 제한의 기간·범위를 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나 일정한 대상조치(代償措置)를 요구하는 등,205)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206) 예컨대 노하우 보호는 근로자에게 수비의무(守秘義務)를 부과하는 것에 족하고, 경업규제의 필요성에 부족하고 대상조치도 없다고 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207), 3년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과된 근로자가 업무상의 비밀을 사용하는 입장에 없었던 점, 무엇인가의 대상조치도 강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서 경업금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208) 등이 있다.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퇴직한 근로자가 원활하게 전직·기업(起業)하여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필요이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는 관점에서라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비밀유지약정으로 족하지 않은가, 업무상의 비밀을 사용하는 입장에 없었던 자에 대하여 경업금지약정을 부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등의 관점이 강조되는 것은 중요하다.
(2) 우리나라 법원은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전직금지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써 종업원이 전직금지를 위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그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ⅱ)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ⅲ) 경업제한의 기간 및 지역 및 대상 직종, (ⅳ)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ⅴ)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ⅵ)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판단 유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209)
그러나 이러한 종래 판례의 태도에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보이는 고용형태 다변화와 노동유연화 현상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근로관계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 나아가 퇴직후 근로자의 취로(就勞) 자체를 제약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해석론상 한계도 존재한다. 종업원의 전직을 금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체결은 종업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판례에 의한 해석론에 그 해결을 맡기고 있음에 그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상이다. 결국 퇴직후 근로자의 법적 안정성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법익균형의 관점에 서 있는 입법적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경업금지의무의 요건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합리적심사론(合理性審査論)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심사론(合理性審査論)에 따르면, ① 노동자의 지위·직무가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데 적합할 것, ② 전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비밀·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할 것, ③ 경업제한의 대상 직종·기간·지역에서 볼 때 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④ 적절한 대가(代償)가 존재할 것의 4가지 점을 종합하여 경업금지의무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다.210) 이러한 합리적심사론(合理性審査論)은 경업금지특약의 유효성 요건에 있어서 최근 일본의 가장 유력한 학설이자 최근 일본 판례도 다수 채용하는 판단의 틀이다.211) 예컨대, 이와키유리외 사건(岩城硝子外事件)212), 토레라자르 커뮤니케이션 사건(トーレラザー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事件)213), 벨 시스템 24 사건(ベルシステム24事件)214), 레전드 전 종업원 사건(レジェンド元従業員事件)215) 등에서 합리적심사론(合理性審査論)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례를 살펴보면 같은 합리성 심사론(合理性審査論)이라도 최근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216)
(4) 노사간 협상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업이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 어떠한 위반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점이 전직(轉職) 이전에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노동자의 예견가능성(豫見可能性)도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경업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퇴직 후의 경업금지의무의 명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독일과 같이,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경업금지의 기간, 범위 등을 서면에 의해 명시하는 등 그 절차에 대해 법적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 상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계약 종료 후 근로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경업금지)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서명한 작성 조건이 포함된 문서의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17)
본래 노동자는 퇴직 후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경업금지의무의 유효성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경업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버리지 않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일정한 직업에 다년간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무를 한정해 경력(커리어)을 형성해 온 사람이 퇴직 전에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살려서 퇴직 전에 종사하고 있던 업무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경업금지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그 선택이 제한되어 버리면 노동자의 주체적인 경력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약되어 버릴 개연성은 높아질 우려가 많을 것이다.218)
요컨대,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이익과 사용자의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필요성 내지 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상(代償)조치를 수반하는 업종, 직종, 기간이 명확해야 하고, 또 퇴직 시에 서면에 의해 명시할 것 등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당장 성문법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의 지침(가이드라인) 등으로 당사자의 계약이나 사적 자치를 촉진 내지 유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Ⅴ. 나가기
비밀유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 둘러싼 유효성 쟁점 등에 대해 판례는 최근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업금지의무를 비교적 엄격한 요건으로 판단하는 판례가 최근 증가 경향에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고용시장도 고용형태 다변화 내지 취업형태 다변화로 인하여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하여 노동유동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과 최근까지 불경기가 거듭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자의 자발적·비자발적 전직(轉職)이나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고용시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유동화” 현상과 더불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의 강화”라는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인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제2조 제2호)의 하나인 ‘비밀관리성’ 요건에 대해 1991년 이래로 2015년 개정과 2019년 개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그 요건이 완화되는 형태로 개정됨으로써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였다.
그렇지만 영업비밀 보호요건 완화 및 영업비밀 보호강화라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련의 개정방향이나 입법취지에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법익균형의 관점을 염두에 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나아가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의 비밀관리성 요건에 대한 2회에 걸친 개정에 따른 영업비밀보호 강화 움직임과 대비하여,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를 과도하게 강화하는 해석론은 고용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익균형을 외면할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의 현황이 고용형태 다변화 내지 취업형태 다변화로 인하여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전직이 일상이 되는 등 고용유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밀유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 둘러싼 유효성 쟁점 등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용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익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비밀유지의무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를 중시하면서, 한편으로 퇴직 후 근로자를 상대로 한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여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관리성 요건에 대해 2015년과 2019년 2회에 걸친 개정에 따른 영업비밀보호 강화를 한 점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 사례에서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219) 특히 우리 대법원 판결 중,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영업비밀에 한정하지 않고 사용자만의 노하우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로 확대하는 취지로 처음으로 판시한 대판결의 태도220)와 그 따름 판결221)의 태도는 향후 재고(再考)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 이전의 종래 판결222)에서는 영업비밀에 한정하는 경향에 있었다.223)
최근 2015년과 2019년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개정으로 인하여 비밀관리성 요건의 지속적 완화 입법으로 이루어 졌고, 영업비밀 보호가 강화가 그 입법취지인 점을 고려하여, 이에 법익균형의 차원에서 향후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바로 사용자의 보호이익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 태도는 재고를 요한다. 고용계약 종료 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과의 법익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그 따름에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요컨대, 퇴직 후 근로자의 전직이나 창업의 자유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퇴직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하는 절실한 과제이고, 우리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의 관점에서 중요하므로, 퇴직 전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와의 법익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