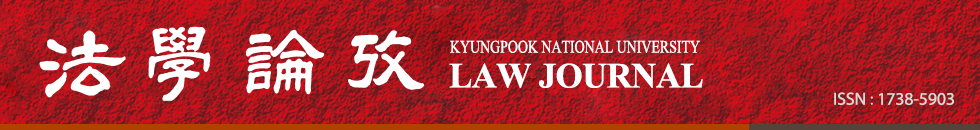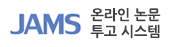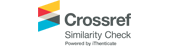I. 서론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주요 임무는 「유럽인권협약」((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이하 ‘협약’이라 함)상 권리의 최소 보호 수준을 정의하여 당사국 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협약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판소는 자율적, 목적론적, 진화적 해석에서부터 적극적 의무의 정의, 일반 기준 및 원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모든 협약 당사국에서 최고 수준의 기본적 인권 보호 이행이라는 최대주의적 접근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는 다자간 국제조약에 기초한 기관이라는 유럽인권재판소의 본질과 한계에 기인한다. 즉 「유럽인권협약」 체계에서 기본적 인권 보호의 1차적 책임은 체약국에 있으며 재판소는 이를 감독하는 보충적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약국이 협약과 재판소 판례가 정한 한계를 존중하는 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 제한 또는 예외를 결정할 재량은 체약국에 있다. 협약 조항의 추상성 내지 불확정성으로 인해 협약상 기본적 인권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체약국 사이 컨센서스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끝으로 기본적 인권 문제를 다투는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복잡한 법적 평가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체약국의 의회, 정책 입안자, 법원이 재판소보다 국내적 맥락과 구체적 상황에 재판소보다 실무상 더 잘 대응할 수 있다.1)
유럽인권재판소는 최대주의 접근을 취하지 않는 동시에, 협약상 권리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협약에 위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체약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 협약상 권리를 규제할 수 있는 재량, 즉 ‘판단 여지(margin of appreciation)’를 인정하는 협약 해석원칙을 발전시켰다. 이를 ‘판단 여지 독트린(Margin of Appreciation Doctrine)’이라고 한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판단 여지 독트린을 적용하는 경우, 재판소가 발전시켜 온 협약의 해석원칙들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재판소의 판단 여지 독트린 적용은 잠재적으로 협약 전문에서 이 협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유지 및 실현 확대’와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하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여지 독트린을 적용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 후 이와 같은 판단 여지 독트린 적용에 대한 비판적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협약상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판단 여지 독트린의 적용 방향을 모색한다.
Ⅱ.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여지 독트린 전개
‘판단 여지’는 당사국이 사실관계를 평가하고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데 갖는 권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스트라스부르 사법기관이 협약상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체약국에 일정한 재량, 즉 변경 가능한 여지(room for manoeuvre)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판단 여지 독트린(doctrine)’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협약 자체의 본문이나 교섭기록(travaux préparatoires)에서 ‘판단 여지’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용어는 전후 유럽에서 만들어져야 할 초국가적 인권 제도, 절차 및 규범의 종류에 대한 토론에서 European Movement가 1949년에 작성한 제안서들에서 처음 등장했다.2)
스트라스부르 기관의 유권해석에서 ‘판단 여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8년 유럽인권위원회의 Cyprus 사건에 대한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3) 이 사건은 키프로스 대반란 작전 중 인권 침해 혐의로 그리스가 영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외에도 IRA 회원이었지만 IRA를 탈퇴했다고 주장하는 Lawless가 아일랜드로부터 영국으로 여행을 하려던 중 아일랜드에서 체포되고, 이후 1940년 국가에 대한 범죄법(Offences against the State (Amendment) Act 1940)에 따라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되자 협약상 권리 위반을 이유로 아일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Lawless 사건4) 등에서 위원회는 국가의 판단 여지를 검토했다. 이상의 사건들은 피청구국이 협약 제15조에 따른 체약국의 의무면제(derogation)를 주장한 사건들이었으며, 위원회는 이 사건들에서 제15조상 “비상사태의 실제 존재”에 대한 피청구국의 판단을 검토했다.5)
유럽인권재판소는 벨기에 내 네덜란드어 사용 지역의 법률에 프랑스어 교육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없는 것을 다툰 1968년 Belgian Linguistics 사건에서6) 판단 여지 법리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협약상 권리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평가하는 재판소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특정 사건에서 자의적 구분(arbitrary distinction)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재판소는 분쟁 중인 조치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해당 국가 내 사회생활을 특징짓는 법적 및 사실적 특징을 무시할 수 없다. 재판소는 그렇게 함으로써 관할 국가 당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에 의해 확립된 집단적 이행의 국제적 장치의 보충적 성격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당국은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재판소의 검토는 이러한 조치가 협약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7)
이후 재판소는 1976년 Handyside 판결에서8) 판단 여지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최초 적용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절을 달리 하여 상론한다.
이 사건은 학교에서 배포될 예정이었으나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국내 법원이 판단한 청소년을 위한 정보가 담긴 “The Little Red Schoolbook”이란 책에 관한 것이다.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이 책의 배포가 금지되었고 모든 사본이 압수되었다. 재판소는 이 금지 및 압수가 협약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다. 이를 위해 재판소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prescribed by law)”,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며(이 사건의 경우 도덕 보호를 목적으로 판단),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것인지 평가해야 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평가를 하기 전에 판단 여지 독트린을 설시했다.
재판소는 협약에 의해 확립된 보호 메커니즘이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 시스템에 대해 보충적임을 지적한다 ... 이 협약은 우선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는 임무를 각 체약국에 맡긴다.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은 이 작업에 자체적으로 기여하지만 쟁송적인 절차(contentious proceedings)를 통해서만 그리고 모든 국내 구제책이 소진된 후에야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제10조 제2항에 적용된다. 특히 여러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도덕에 대한 통일된 유럽 개념(uniform European conception of morals)을 찾을 수 없다. 도덕의 요건에 대한 각국 법률이 취하는 견해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며, 특히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화하는 것이 특징인 우리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국가 당국은 자국의 생명력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러한 요건의 정확한 내용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제한(restriction)’이나 ‘처벌(penalty)’의 ‘필요성(necessity)’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a better position)에 있다. 이 시점에서 본 재판소는 “필요한(necessary)”이라는 형용사는 제10조 제2항의 의미 내에서 “필수적(indespensible)”(제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절대적으로 필요한(absolutely necessary)”, “엄격하게 필요한(strictily necessary)”, 제15조 제1항의 “상황의 긴급성에 의해 엄격하게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to the extent strictly required by the exigencies of the situation)”라는 문구와 동의어가 아니며, 또한 “허용 가능한(admissible)”, “일반적인(ordinary)”(제4조 제3항), “유용한”(제1의정서 제1조의 프랑스어 정본), “합리적인(reasonable)”(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1항) 또는 “바람직한(desirable)”과 같은 표현의 유연성 또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성(necessity)”이라는 개념에 내포된 긴급한 사회적 필요의 현실에 대한 초기 평가를 내리는 것은 국가 당국의 몫이다.
따라서, 제10조 제2항은 체약국에게 판단 여지(margin of appreciation)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여지(margin)는 국내 입법자(‘법률로 규정된’)와 시행 중인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요청받은 기관, 특히 사법 기관 모두에게 주어진다.9)
그러나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판단 여지가 여전히 재판소의 감독하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2항은 체약국에게 무제한의 판단 여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해당 국가의 협약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제19조)는 ‘제한’ 또는 ‘처벌’이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국내의 판단 여지는 유럽의 감독과 함께 진행된다. 이러한 감독은 문제가 된 조치의 목적과 ‘필요성’ 모두에 관한 것으로, 근거법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한 결정, 심지어 독립적인 법원이 내린 결정까지 포함한다 ... 이로부터 관할 국가 법원을 대신하는 것이 재판소의 임무가 아니라 제10조에 따라 그들이 판단 권한(power of appreciation)을 행사하여 내린 결정을 검토하는 것이 재판소의 임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재판소가 이러한 결정들을 개별 검토하는 데 그친다면 재판소의 감독은 일반적으로 허상일 것이며, 재판소는 이 사건 계쟁 출판물과 청구인이 국내 법체계에서 제기한 주장 및 증거를 포함하여 사건 전체에 비추어 검토한 다음 국제적 수준에서 검토해야 한다. 재판소는 이용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당국이 실제 ‘개입(interference)’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사유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적절하고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
Handyside 사건 이후 판단 여지 독트린은 유럽인권재판소의 다수 사건에서 채택되었으며, 재판소의 판례법을 형성하였다. 특히 재판소는 판단 여지 독트린의 계속적 적용을 통해 판단 대상이 되는 제한에 대해 판단 여지를 허용하는 협약상 권리의 종류, 판단 여지가 허용되는 정도인 심사 강도(wide margin of appreciation, narrow margin of appreciation, a or a certain margin of appreciation)를 개별 사건에서 구체화했다. 판단 여지가 적용될 수 있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허용되는 여지의 정도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은 일부 절대적 권리에서는 어느 정도 분리될 수 있지만, 대체로 구체적 사건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제7조 등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되어 회원국에게 절대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권리에 대해서 재판소는 판단 여지를 허용하지 않거나 국가에게 허용되는 판단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한다.11) 그러나 협약 제8∼11조, 제1의정서 제1조 및 제2의정서 제4조의 명시적 및 일반적 제한 조항과 유럽인권협약 제15조의 일반적 긴급조항에 따른 국가의 협약상 권리 제한에 대한 검토에서 재판소는 판단 여지 독트린을 자주 언급한다.
재판소가 묵시적 제한을 인정한 협약 제6조 법원에 대한 접근권, 국내법에 따른 제한이 규정된 제12조 혼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판단 여지 독트린을 적용한다.12)
재판소가 판단 여지를 넓게 인정하는가 아니면 좁게 인정하는가는 분쟁 대상인 국가의 조치에 대한 재판소의 심사 강도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재판소는 S. and Marper 사건에서 이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를 설명했다.
이러한 여지(margin)는 문제가 되는 협약상 권리의 성격, 개인에 대한 중요성, 개입의 성격 및 개입이 추구하는 목적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며, 그 폭은 달라진다. 쟁점이 되는 권리가 개인의 내밀하거나 핵심적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여지는 더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존재 또는 정체성의 특히 중요한 측면이 위태로운 경우, 국가에 허용되는 여지는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유럽평의회 회원국 내에서 이해관계의 상대적 중요성 또는 최선의 보호 방법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여지는 더 넓어진다. 13)
유럽인권재판소는 특히 판단 여지의 허용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협약상 권리의 성격과 개인에게 미치는 중요성’, ‘유럽의 공통 근거(commom ground)’ 내지 ‘유럽의 컨센서스(European Consensus)’의 존부,14) 체약국이 해당 제한에 대해 판단하는데 ‘더 나은 위치’에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15)
재판소는 종종 협약상 권리의 성격과 개인에게 미치는 중요성이 판단 여지의 범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해 왔다. 원칙적으로 협약상 권리의 본질 또는 핵심적인 부분이 영향을 받는 경우 판단 여지는 더 좁아지며, 덜 중요한 측면이 문제가 되는 경우 판단 여지는 더 넓어진다.
허용되는 판단 여지의 폭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상기한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표현의 유형에 의해 정의되며, 이와 관련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에 대한 제한의 범위가 거의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 ... 또한 언론이 공공의 감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대한 민주 사회의 강한 관심으로 인해 그 여지(margin)는 좁아진다 ... 언론 및 기타 뉴스 미디어의 자유는 대중에게 정치 지도자의 아이디어와 태도에 대한 의견을 발견하고 형성하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를 제공한다. 언론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대중도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따라서 재판소는 일반적인 관심 주제에 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언론의 표현 제한의 비례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 현재의 맥락에서 NGO가 공익 문제에 관심을 끌 때 언론과 유사한 중요성을 지닌 공공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상황에서 국가에 부여되는 판단 여지는 원칙적으로 좁은 것이다. 16)
체약국 사이의 공통 근거 내지 컨센서스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넓은 판단 여지가 허용된다. 재판소는 광고 시간을 구매하기 어려운 소규모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텔레비전 광고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한 노르웨이의 조치가 협약 제10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TV Vest 사건에서 공통 근거의 부족을 이유로 노르웨이가 조치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는 넓은 판단 여지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재판소는... 정치 광고의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하여 국내 제도 간의 차이가 넓은 판단 여지를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했다. EPRA가 작성한 비교법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개 유럽 국가 중(1) 13개 국가에서는 방송에서 유료 정치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2) 10개 국가에서는 그러한 광고가 허용되었으며 (3) 11개 국가에서는 선거 운동 중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무료 방송 시간 조항이 있었다(이 중 5개 국가는 (1)항의 13개국 중 하나); (4) 몇몇 국가에서는 무료 방송 시간 할당 시스템이 없었다....
이러한 유럽의 컨센서스 부재가 각국에서 ‘민주적(democratic)’ 제도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재판소는 협약 제10조와 관련하여 정치적 표현의 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것 보다 다소 넓은 판단 여지를 허용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17)
체약국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보아 넓은 판단 여지를 인정한 사례로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포함한다고 봤던 낙태 문제,18) 보조금 삭감이나19) 주택 계획20) 또는 과세21) 등 사회・경제적 문제,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권한22) 등이 있다. 이외에도 후술하는 제15의정서와 연결될 수 있는 사유로 관련 사법 절차 또는 입법 절차 등 체약국의 의사 결정 과정의 질적 수준을 들 수 있다.
협약 제8조에는 명시적인 절차적 요건이 없지만, 개입 조치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은 제8조에서 보호하는 이익을 적절히 존중할 수 있도록 공정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판단 여지는 의사 결정 과정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 절차가 어떤 측면에서 심각하게 미숙한 경우 국내 당국의 결론은 비판에 더 개방적이다. 23)
이상에서 살펴본 협약상 권리의 성격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공통 근거, 더 나은 위치 요소들은 재판소가 판단 여지의 폭을 결정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영국 정부가 영화 ‘Visions of Ecstasy’가 신성 모독적이며 신자들의 종교적 감정을 자극하고 모욕으로 판단하여 배포를 위한 인증을 거부한 것을 다툰 Wingrove 사건에서 재판소는 위에 언급한 세 요소로 전부 고려했다.
재판소는 'Visions of Ecstasy'에 배포 인증서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타인의 권리(the rights of others)’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사안에 대한 심각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개입자들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알 수 있듯이 ... 여러 유럽 국가에서 신성 모독 법안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적용이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으며 최근 여러 국가에서 이를 완전히 폐지한 것은 사실이다 ... 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정치적 표현이나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토론에 대한 제한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반면, 도덕 또는 특히 종교의 영역 내에서 내밀한 개인적 신념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체약국은 더 넓은 판단 여지를 가질 수 있다. 더욱이, 도덕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마도 더 큰 범위에서, 종교적 신념에 대한 공격과 관련하여 ‘타인의 권리 보호’의 요건에 대한 유럽 내 통일된 개념관(uniform European conception)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특히 다양한 신앙과 교파가 존재하는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가 당국은 자국의 핵심 세력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요건의 정확한 내용과 그러한 자료로부터 심각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국제 재판관보다 더 나은 위치(a better position)에 있다. 24)
2021년 8월 1일 모든 협약 체약국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을 개정하는 제15의정서(Protocol No. 15 amending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가 발효되었다. 제15의정서는 협약 전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협약이 개정되었다.
제1조 ‘체약 당사국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과 그 의정서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협약이 정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감독관할에 따라 판단 여지를 향유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판단 여지 원칙의 성문화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법에서 발전되어 온 방식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개념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25) 의정서 발표 이후 내려진 유럽인권재판소의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v. Switzerland 판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판소는 여전히 판단 여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수행하며 관련 법리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가고 있다.
국가가 이 분야에서 일정한 판단 여지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을 때, 위의 고려사항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기후 변화 및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헌신과 이와 관련된 목표 및 목적 설정의 범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 간의 구별을 수반한다. 전자의 측면에 관해서는, 위협의 본질과 심각성, 그리고 계약 당사국들이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 수용한 약속에 따라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통해 효과적인 기후 보호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보장하는 데 관련된 이해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국가에 대한 판단 여지를 줄여야 한다. 후자의 측면, 즉 국제적으로 고정된 목표와 약속을 충족하기 위해 채택된 운영 선택 및 정책을 포함한 수단의 선택에 관해서는, 국가는 넓은 판단 여지를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판단 여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26)
그러나 제15의정서의 내용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인권 보호의 주요 책임이 개별 당사국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모든 청구가 국내 법원에서 적절하게 고려되도록 함으로써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한 사건 집중을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5의정서는 청구기간의 단축,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및 은퇴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7)
Robert Spano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실체적 내재화 단계에서 절차적 내재화의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체약국에 대한 재판소의 절차 기반 검토를 옹호하는데, 여기에서 주요 논거가 보충성의 원칙이다.28) Spano는 절차적 내재화의 주요 요소로 국내적 구제 수단 소진(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국내 수준에서의 협약 기반 평가를 위한 기준 기반 지침 - 폰 하노버 비대체 원칙(Criteria-based guidance for Convention-based assessment at domestic level—the Von Hannover non-substitution principle), 입법 재량에 대한 질적 민주주의 강화 접근법(A qualitative democracy-enhancing approach to legislative deference)을 들고 있다.
Spano는 국내 구제 수단의 소진 요소와 관련하여 Vučković and Others v Serbia 판결29)은 이미 확립된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신청인이 협약 제소를 제기할 때 이전 판례보다 더 성실하게 국내 구제 수단을 제대로 소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청구인은 적어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협약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판사가 협약의 관점에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현실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기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수준에서의 협약 기반 평가를 위한 기준이 되는 지침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체약국의 국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제시한 방향으로 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 재량에 대한 질적 민주주의 강화 접근법은 국가 의회가 협약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을 제정할 때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개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Spano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보충성 원칙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유럽인권재판소의 권한을 빼앗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절차 기반 검토는 절차에 기반한 검토는 결코 유럽 전역의 인권 보호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로 효과적인 절차적 내재화 단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내 수준에서 협약 보호의 일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보층성 원칙에 기반한 유보는 협약 원칙에 대한 선의의 국내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보충성의 원칙은 국가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협약이 제공하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법원과 당사국 간의 권한 배분 규범을 요약한 것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협약 권리 보장을 위한 일상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아니라 당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Spano는 보충성 원칙의 목적은 국가 당국이 협약 권리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장려하여 유럽 법률 공간에서 전반적인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유럽인권재판소의 권한과 관할권은 협약 제19조와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협약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중재자는 바로 유럽인권재판소임을 확인한다. 당사국은 그들의 행동, 특히 국내 법원이 제공하는 추론을 통해 준거법 원칙에 따라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입증한다. 따라서 Spano에 따르면 판단 여지 원칙의 개념적 틀 내에서 국내 의사 결정에 대한 절차적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운용한다고 해서 협약 원칙의 적용 단계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위기준 결과를 검토하는 재판소의 권한이 궁극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30)
이러한 Spano의 입장은 영국이 유럽 평의회 각료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채택한 2012년 브라이튼 선언(Brighton Declaration), 2021년 발효된 제15의정서에서 표현되고 있는 협약상 인권보장의무의 1차적 책임의 이행을 통한 유럽인권재판소 업무 개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판단 여지 독트린에 대한 비판적 대안 이론
판단 여지는 협약 권리와 정당한 공익적 제한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은 좁은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일이 될 수 밖에 없고, 판단 여지의 인정을 결국 문제가 된 조치가 인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판단 여지와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과의 충돌, 판단 여지로 인한 기본권의 실효적 보호의 제한, 판단 여지와 재판소가 사용하는 다른 해석원칙(interpretative principles)과의 관계(특히 비례성과의 관계)는 판단 여지 독트린의 발전과 함께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인권의 실효적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 내 시민의 인권, 체약국의 지배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용인되지 않는 인권이 문제된 경우 재판소가 피청구국에 판단 여지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결국 협약상 권리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재판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31)
일부 비평가들은 독트린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32) 대부분은 그 대신 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33) 이하에서는 Greer와 Letsas의 판단 여지 독트린에 대한 대안 이론 구성 시도를 검토한다.
Greer는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판단 여지가 수용 가능한 한계 내로 제한되는 것이며, 이는 주로 판단 여지가 협약의 primary constitutional principles에 종속됨을 인식하고, 또한 특히 비례성(proportionality)을 포함한 다른 보조원칙들과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Greer가 주장하는 primary constitutional principles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협약 권리는 국내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해 법을 매개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권리’ 원칙, 민주 사회에서 공공재와 공익은 법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민주적으로 책임 있는 각국의 비사법적 공공기관에 의해 추구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 협약 권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민주적 추구에 대해 절차적 및 증거적 우선권을 가지지만, 결정적인 실체적 우선권은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두 원칙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협약 권리의 우선’ 원칙을 말한다.34)
Letsas는 재판소가 사용하는 판단 여지를 실체적 개념과 구조적 개념으로 구분한다. 실체적 개념으로서 판단 여지는 협약 자유에 대한 특정 간섭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며, 재판소는 종종 도달한 결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판단 여지’라는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구조적 개념으로서 판단 여지는 인권재판소가 해당 법적 쟁점에 대해 체약국 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권재판소의 실체적 심사 기준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 Letsas는 판단 여지의 실체적 개념은 유럽인권협약 제8∼11조와 자유권규약(ICCPR) 등 기타 국제 인권 문서에 있는 이른바 ‘수용(accommodation)’ 또는 ‘제한(limitation)’ 조항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가안보, 공공안전, 경제복지, 범죄예방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당국이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Letsas는 판단 여지의 구조적 개념은 채택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는 구조적 개념으로서 판단 여지는 재판소가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취하여 국가 당국의 결정이 국제 법원보다 ‘규범적 우선권(normative priority)’을 갖는다는 생각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기에서 규범적 우선권이라는 개념은 국가 당국이 협약 권리에 관한 불만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제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국제기구보다 더 정당성이 있거나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규범적 보충성 개념을 자주 선택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국가 당국이 원칙적으로 국제 재판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Handyside 사건, Sunday Times 사건 및 Müller 사건에서 재판소의 초기 견해는 국가 당국이 다수의 도덕적 선호가 무엇이고 어떤 제한을 요구하는지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가 당국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도덕의 요건은 장소와 시기에 따라 다르며 국가 당국은 ‘국가의 핵심 세력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by reason of their direct and continuous contact with the vital forces of their countries)’ 이러한 요건을 정의하고 적용하는 데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도덕적 선호(the moralistic preferences of the majority)를 ‘국가의 핵심 세력(vital forces of the country)’이라고 부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누구도 자신의 윤리적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열등하거나 비열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윤리적 견해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공개적인 견해 표현으로 인해 자신의 종교적 감정을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 자체로 모순(contradictio in terminis)이다.35) 권리가 도덕적 선호를 차단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선호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36)
Ⅳ. 유럽연합의 협약 가입 시도와 판단 여지 독트린의 구조적 긴장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라 함)의 「유럽인권협약」 가입 시도는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EU의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은 EU가 협약에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유럽 연합 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2007))」 제6조는 “연합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37) 이는 다층적 인권보호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유럽 내 기본권 보호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시도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계도 중요 쟁점으로 논의된다.38)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여지 독트린 또한 유럽연합의 법질서와 구조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오랜 기간 체약국의 문화적・헌법적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정립하여 온 판단 여지 독트린은 개별 국가가 특정 기본권 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적정한 비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일정 부분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중심의 자율성 인정은 EU와 같이 독자적인 기본권 체계와 사법심사제도를 보유한 공동체가 협약의 정식 당사자가 될 경우, 협약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유럽인권재판소는 EU의 제재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 당국이 터키 항공사 Bosphorus Airways가 임차한 항공기를 압류한 조치가 유럽인권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1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된 Bosphorus 판결39)에서 명시적으로 판단 여지 독트린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핵심 논리와 효과는 판단 여지 독트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여지 독트린은 협약 당사국이 협약상 의무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자국의 헌법 전통이나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해 일정한 재량을 인정받는 구조로, 재판소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국가의 결정을 존중하며 사법적 자제를 행한다. Bosphorus판결에서 재판소는 아일랜드가 EU 법령을 이행하면서 취한 조치에 대해, 해당 조치가 아일랜드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EU 법에서 직접 도출된 구속적 의무의 이행이었다고 보면서, EU의 인권 보호 체계가 「유럽인권협약」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호(equivalent protection)임을 근거로, 협약의 권리 보장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합치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을 설정하였다. 이는 유럽인권재판소가 국가에 부여하는 재량인 판단 여지 독트린을 초국가적 기구인 EU에 대해 기능적으로 확장하여 EU에 대해 자율성을 인정하고 사법심사를 자제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Bosphorus 판결에서의 추정은 기능적으로 판단 여지와 유사하나, 국가가 아닌 EU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추정 번복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에서40) 오히려 판단 여지보다 더 강력한 자율성 부여로 비판된다. 특히 이 판결은 EU가 협약에 가입하게 될 경우, 다른 협약 당사국들과 달리 EU에 대해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이 형성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협약 체계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Bosphorus 사건은 판단 여지 독트린이 개별 국가를 넘어 EU라는 초국가적 법질서로 확대 적용되는 사례이자, 향후 EU가 협약에 가입할 경우 EU 전체 법질서에 대한 판단 여지 독트린 적용의 한계를 미리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렵인권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EU에 대해 사실상 예외적 지위를 부여하고, ECJ의 인권 판례를 일정 정도 자율성과 동등성의 관점에서 평가하였지만 EU가 협약에 가입한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의 판단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U의 협약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Bosphorus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판단 여지 독트린 적용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독트린에 대한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협약 체계 내에서 EU가 다른 체약국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이상, 과거와 같은 차등적 접근이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고, 그 경우 재판소가 활용할 수 있는 판단 여지 독트린이 EU 차원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EU의 협약 가입과 관련하여 판단 여지 독트린이 지닌 구조적 긴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드러난다.
먼저 판단 여지의 전제가 되는 ‘국가 중심적 주권 구조’와 EU의 ‘초국가적 통합 질서’ 간의 긴장이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판단 여지를 허용하는 이유는 각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따른 기본권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EU는 단일 시장과 권리헌장을 통해 이미 일정한 수준의 기본권 보호 통일성과 상호의존성을 제도화한 집합체이며, 회원국과는 구별되는 독립적 법인격을 보유한 주체이다. 따라서 판단 여지 독트린이 EU라는 ‘비국가적 주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이론적으로도 불분명하다.
다음으로 앞서 검토한 Bosphorus 판결이 보여주는 유럽인권재판소의 EU에 대한 ‘제한적 판단’은 장차 협약 체계 내 법적 균형을 위협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EU의 인권 보호 수준이 협약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이유로, 개별 국가의 EU법 이행에 대해 협약 기준의 직접 적용을 유보하였다. 이는 EU를 사실상 협약의 외부에 위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결과적으로 협약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 보호와 사법 심사 체계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Weiß가 지적하듯, Bosphorus 판결 이후에도 동일한 판단 여지를 EU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이는 협약의 다른 체약국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41) EU가 협약의 정식 당사자가 된 이후에도 유럽인권재판소가 동일한 방식으로 자율성과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이는 체약국 간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을 정당화하게 된다. 또한 판단 여지 독트린이 EU와 같이 독자적 기준과 제도를 보유한 초국가적 체제에까지 확장 적용될 경우, 오히려 협약의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판단 여지가 기본권 보장의 후퇴를 정당화하는 구조적 논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약 해석론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유럽연합의 협약 가입은 판단 여지 독트린이 성립해온 전통적 조건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더 이상 국가 간의 문화적 다양성만을 근거로 판단 여지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EU와 같은 다층적 인권 체계 내에서는 보편성과 통일성에 기반한 새로운 해석 원칙을 제시할 과제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소는 EU가 협약에 가입할 경우 다른 당사국에게 동일하게 인정하기 어려운 Bosphorus 판결에서 제시한 접근을 지속하기보다는, 판단 여지 독트린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협약의 직접적 구속력과 일관된 해석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판단 여지는 EU라는 초국가적 법질서 공동체에 불평등한 면책을 부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협약의 헌법적 정당성과 인권보장 기능은 심각한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단일 유럽 법적 공간을 구축하고 유럽 전역에 걸쳐 일관된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는 EU가 협약 가입 목적과도 상충된다.
Ⅴ. 결론
유럽인권협약은 제1조에서 체약국에게 관할에 속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협약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이러한 체약국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제19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를 설립하고, 제32조 이하에 근거하여 협약상 권리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유럽인권협약의 효과적 이행은 결국 각국의 협약 준수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여지는 협약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의 구속력을 각기 다른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체약국에 대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각국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고려, 다수 체약국 사이에서 인권과 공익의 딜레마 해결에 관한 국가적 논쟁 가능성에 대한 고려, 특정 협약 권리와 특정 공익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범유럽적 컨센서스에 대한 판단 등이 필요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각국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구속력을 높이고 점진적 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여지 독트린은 협약 권리는 보편적 인권이지만, 다양한 국가적 맥락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판단 여지의 인정 여부에 주요 논거로 활용되는 “유럽 컨센서스(European Consensus)” 기준은 재판소가 판단 여지를 넓게 또는 좁게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회원국 간에 유사한 패턴의 관행이나 규제가 존재하면 판단 여지는 좁아지고, 유럽적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에 더 넓은 판단 여지가 부여된다. 그러나 이러한 컨센서스 기준은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판결 간 일관성이 부족하여 판단 여지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판단 여지 독트린은 재판소의 다른 해석 원칙, 예를 들어 자율적 해석, 진화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적극적 해석을 제한하며, 유럽인권재판소가 국가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을 정당한 목적, 필요성, 비례성 등을 통해 심사하는 것을 자제하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충성 원칙과 함께 협약의 근간인 기본적 인권의 실효적 보호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
협약 전문에 따르면 이 협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유지 및 실현 확대”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기본적 인권의 효과적인 보호라는 이 목표를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 초기 판결 중 하나인 Belgian Linguistics 판결에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을 매개로 체약국들이 스스로 설정한 일반적인 목표는 기본적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했고,42) 1979년 Airey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오늘날 많은 판결에서 여전히 사용하는 공식으로 실효적 보호 원칙을 “유럽인권협약은 이론적이거나 환상 속의 권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했다.43) 또한 1989년 Soering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재판소가 협약을 해석할 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집단적 이행(collective enforcement)을 위한 조약으로서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 보호를 위한 법률문서로서 협약의 목표와 목적은 그 조항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해석은 민주 사회의 이상과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문서인 협약의 일반적인 정신과 일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44)
이처럼 기본적 인권의 실효적 보호가 협약의 존재 이유이고, 재판소의 존재 이유임은 협약과 재판소의 판례가 증명하고 있다. 판단 여지 독트린이 보충성과 조화될 수 있더라도, 기본권의 실효적 보호와 조화될 수 없다면, 그 적용 범위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일정 유형의 사건에 대해 최우선의 논거로 자동적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제15의정서를 통해 판단 여지가 협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것이 판단 여지 독트린의 원칙적 활용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Spano가 말한 절차적 내재화가 국내 권력기관에 실현됨으로써 협약의 보충성이 협약이 지향하는 바대로 구현되는 것은 협약의 실현이며 필요한 일이지만, 협약상 권리의 실효적 보호를 저해하게 된다면 보충성 원칙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EU와 같은 초국가적 주체의 협약 가입과 관련하여 더욱 심화된다. EU는 단일 시장과 권리헌장, 자체 사법체계를 갖춘 독립적 법질서로,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해석 재량을 인정하는 판단 여지의 전통적 논리로 포섭되기 어렵다. Bosphorus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EU의 인권 보호를 협약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아 ‘합치 추정’을 설정하였으나, 이는 초국가적 체제에 예외적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협약 해석의 일관성과 체약국 간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가 단지 “보완적인 헌법재판소적 기능”만을 수행하며, 국가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재량(margin of appreciation)을 인정한다는 주장을 통해 유럽연합의 법질서와 유럽인권협약 보장 체계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해석론은45)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법기관의 헌법적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며,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실효성 원칙(effectiveness)을 약화시키며, 실제로는 인권 보호의 하한선을 형해화할 위험을 내포한다.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은 유럽인권재판소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이며, 이는 협약 제8조에서 보호되는 사생활의 자유이든,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이든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물론 협약의 적용에서 각국의 헌정 질서와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며, 이를 위해 일정한 판단 여지가 허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단 여지 원칙은 어디까지나 협약 해석의 보조적 수단일 뿐이며, 그것이 국가의 자의적인 결정이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면책 논리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스로 수차례 판시한 바와 같이, 협약상의 권리들은 “이론상 또는 형식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다시 말해, 권리의 존재 자체가 공허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각국이 협약 당사국으로서 자국의 공권력을 통제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재판소는 마지막 보루로서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의 기능의 보충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국가의 입장을 과도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협약상 권리는 최소보장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침해 가능한 권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은 정치적 타협이나 문화 상대주의에 의해 후퇴되어서는 안 되며, 재판소가 이를 적극적으로 관철하지 않는다면 협약 체계의 정당성과 권위는 결정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유럽인권재판소는 단순히 국가 재량을 존중하는 사법기구가 아니라, 각국의 권력작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인권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판단 여지 독트린은 이러한 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향후 EU의 협약 가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판단 여지 독트린의 기능과 한계를 재검토하고 그 적용 범위를 엄격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 여지는 협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차이를 고려할 때, 판단 여지 독트린은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유연한 장치로서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고, 특정 조건하에서 재판소의 판결 수용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협약의 핵심 목적인 인권의 실효적 보호를 저해하거나 초국가적 권력체계에 면책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협약의 헌법적 정당성과 인권 보장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판단 여지 독트린은 협약상 권리의 보편성과 당사국의 특수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정교화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무제한적 재량이 아닌 “예측 가능성 있는 국가 재량”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결국 판단 여지 독트린은 협약의 실효적 보호라는 최종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 재량과 재판소의 통제 간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