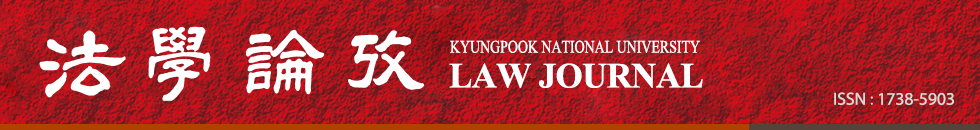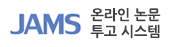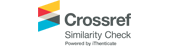Ⅰ. 서론
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 jurisdiction)은 외국적 요소를 갖고 있는 법률관계의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어느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이란 분쟁의 구성요소가 둘 이상의 국가와 관련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당사자의 국적, 주소, 거주지, 분쟁이 발생한 장소, 목적물의 소재지 등과 같은 특정 국가와 연결시키는 요소를 말하는데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2022년 개정 전 국제사법은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대한 원칙적 조항 하나만을 두었으나, 개정 국제사법(이하 ‘국제사법’이라고 함)은 개별적 유형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상세한 관할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국제재판관할합의(이하 ‘관할합의’라고 함)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관할합의가 있다면 이러한 합의에서 지정한 국가의 법원에만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그런데 관할합의가 있더라도 국제사법 제8조1)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관할합의가 무효이므로 관할합의의 유효요건은 매우 중요하고, 실무적으로도 빈번하게 그 유효성에 관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는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국제재판관할합의’가 허용된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허용하거나 또는 해석상 당사자의 합의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2)에만 소송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인 소송상 합의가 허용된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 즉 당사자 자치가 허용된다고 선언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관할합의의 허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관할합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에 관하여만 관할합의3)가 허용된다. 이러한 허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할합의는 효력이 없다.
한편,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만,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네 가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 네 가지의 요건은 관할합의의 실체적 유효성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다. 관할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형식적 유효성은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1항 단서의 실체적 유효요건은 국제사법 개정 전 대법원 판례들에서 요구하던 요건과 동일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본 글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해석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래에서는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관할합의의 허용요건에 대하여 먼저 논한 뒤에 제1항 단서의 실체적 유효요건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어느 경우에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할합의는 효력이 없고, 국제사법에 따라서 결정된 국가의 법원에만 국제재판관할이 인정4)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Ⅱ.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허용요건
관할합의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특정 국가의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속적 관할합의’(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와 ‘비전속적 관할합의’(non-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로 나누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5) 이러한 관할합의는 본 계약과 별도로 체결될 수 있고, 본 계약 중 하나의 조항으로 포함되어 본 계약과 함께 체결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속적 관할합의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헤이그관할협약 제3조a)에서는 전속적 관할합의를 “전속적 관할합의란 일정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c)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다른 국가의 재판권을 배제하고, 하나의 체약국의 법원들 또는 하나의 체약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법원을 지정하는 합의를 의미한다.”6)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국제사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7) 전속적 관할합의의 결과 지정된 국가의 법원에 한정하여 관할이 발생(forum prorogatum)되는 적극적 효력(prorogation)이 있고, 이러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관할이 있었을 국가의 법원의 관할을 배제(forum derogatum)시키는 소극적 효력(derogation)도 동시에 발생한다.8)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국가의 법원도 관할법원으로 추가하는 합의를 ‘비전속적 관할합의’(non-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라고 한다. 하나의 국가의 법원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국가의 법원을 배타적 관할로 지정하는 합의도 하나의 국가의 법원에 관할을 전속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비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9) 금융기관의 금전대출계약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특정 국가의 법원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이 소재한 국가라면 어느 국가의 법원에 대하여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하이브리드(hybrid) 관할합의’10)도 비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 또한 각 당사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만 제소 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관할합의(reciprocal jurisdiction clause)’11)도 비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12)
헤이그관할협약은 전속적 관할합의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전속적 관할합의와 비전속적 관할합의의 구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단순히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라고 규정하여 적용대상인 관할합의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속적 관할합의와 비전속적 관할합의 또는 기타 변형된 형태의 관할합의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관할합의가 허용되고, 국제사법 제8조가 적용된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라고만 할 뿐 그 구체적 의미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관할합의에 외국적 요소(internationality, foreign elements)가 요구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국제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 결과 국제사법 제8조의 관할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에도 외국적 요소가 필요하다. 반면에 외국적 요소가 없는 순수한 국내 사건에서 국내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관할합의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조가 적용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란 분쟁의 구성요소가 하나 이상의 국가와 관련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요소로 인하여 여러 국가에 재판적(또는 연결요소(connecting factor))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국적, 주소, 거주지, 분쟁이 발생한 장소, 목적물의 소재지 등과 같이 사건을 특정국가와 연결시키는 요소가 있다. 계약의 당사자가 각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동일한 국가의 회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계약의 이행은 제3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나, 한국 회사가 한국에서 파산을 하였지만 해외에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외국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헤이그관할협약 제1조 제2항에서도 당사자의 거주지(resident)가 다른 경우뿐만 아니라 분쟁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이 국제적인 경우에도 외국적이라고 한다.
외국적 요소의 요건과 관련하여, 내국인 사이에 외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내국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관할합의가 가능한지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경우 외국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외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했다는 것뿐이다. 만일 외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합의를 외국적 요소로 볼 수 있다면, 굳이 관할합의에 대하여 외국적 요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순수 내국 사건에 대하여 관할합의를 허용하면 국내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합의까지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과 관련이 없는 순수한 국내 사건은 국제사법 제8조가 적용되는 관할합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할합의는 효력이 없다. 헤이그관할협약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고,13) 유럽연합의 「민사 및 상사에서 재판관할과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칙」14)(이하 ‘브뤼셀규칙 recast’라고 함)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다.15)
앞의 문제를 한국 법원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제시된다. 국제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한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관할합의의 유효요건에 제시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과 외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관할합의의 유효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모두 지정된 법원과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국 법원이 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 외국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합리적 관련성의 요구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데,16) 개정 국제사법은 법원과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요구되는지 아닌지에 관하여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위 대법원 판례에 효력은 여전히 유진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석상 법률에는 이를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뿐더러, 한국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도 한국 법원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국제적 요소를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정책적 관점에서는 법률시장의 증진을 위하여 자국과 관련이 없는 사건을 위한 법원까지 설립하는 국가도 있는 마당에17) 굳이 이를 거부하여 스스로 법률시장을 닫을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도 합리적 관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관할합의를 허용한다. 법률관계란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서 채권적 청구와 물권적 청구를 포함한다. 주로 계약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관할합의가 이루어지지만, 국제사법에서는 관할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를 계약상 법률관계에 한정시키지 않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관할합의가 허용된다.18) 다만 국제사법 제10조에서는 국제재판관할에서의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규정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관할합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국제사법에서는 소비자계약(제42조), 근로계약(제43조), 부양에 관한 사건(제60조 제2항), 상속에 관한 사건(제76조 제2항)에 대하여는 관할합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국제사법 제8조에 따른 관할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관할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는 민사 및 상사에 관련한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한정된다.19) 관할합의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당사자자치를 근거로 허용되는데, 형사 및 공법적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자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라마다 법이 달라서 분쟁해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국제거래에서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가능한 넓게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법 및 공법에서 엄격히 규율하는 사항에 한정하여 관할합의가 제한되며, 형사법 및 공법과 관련이 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관할합의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부인의 소는 공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라고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부인의 소를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부인의 소에 관하여 관할합의를 할 수 없다. 반면에 부인의 결과 발생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위 법에 따라서 발생하는 법정채권으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제재판관합의는 허용된다.20)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대하여만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허용하고 있다. 중재법 제3조 2호에서도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국제사법을 개정하면서 참조한 헤이그관할합의협약 제3조 a)에서는 “특정한 법률관계”(particular legal relationship)라고 규정하고 있고, 브뤼셀규칙 recast 제25조(1)에서도 위 협약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국제사법과 차이가 없다.
일정한 법률관계가 요구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제거래관계에서는 예견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당사자가 예견하지도 않은 국가의 법원이 발생하지도 않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갖는 것을 방지함으로써21)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확보하여 당사자의 관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22) 둘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위 ‘갑질’로써 당사자 사이의 향후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관할합의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타방당사자에게 가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가 관할합의를 할 때 합의가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특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본 라이선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한다.”와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한정해야 한다. “본 계약상의 분쟁에 한정되지 않고 향후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와 같은 catch-all clause 조항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이를 허용하는 계약조항은 국제사법 제8조에서 허용하는 관할합의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
헤이그관할합의협약 제3조a)에서는 관할합의의 대상을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a particular legal relationship)으로 규정하고 있고, 브뤼셀규칙 recast 제25조(1)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관할합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도 미리 관할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23)
이에 반하여 국제사법 제8조에서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말미암다’는 사전적으로 ‘원인이나 이유가 되다’라는 뜻이므로 헤이그관할합의협약의 “관련하여”(in connection with)에 해당한다. 헤이그관할협약의 “이미 발생한 분쟁”(disputes which have arisen)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국제사법이 관할합의가 가능한 시적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더욱이 ‘말미암은 분쟁’이 아니라 ‘말미암은 소’라고 함으로써 이미 제기된 소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도 있다. 국제사법 제8조의 해석상 과거에 이미 발생한 분쟁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분쟁이나 모두 관할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은 이견이 없겠지만 굳이 규정 형식을 헤이그관할협약과 달리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분쟁의 범위는 관할합의를 한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 당사자의 의사가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합의의 해석을 통하여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관할합의의 해석은 관할합의의 준거법에 따르게 된다.24) 다만 관할합의를 한 문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어 당사자의 의사를 증거조사를 통하여 밝혀야 하는 경우25)에는 ‘절차는 법정지법에 따른다는 원칙’(forum regit processum)26)에 따라서 적어도 증거조사는 관할합의의 준거법이 아니라 법정지의 증거법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국제계약에서는 통상적으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any disputes arising from this agreement)”을 관할합의의 대상으로 하므로 계약상 분쟁에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의 이행청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계약의 해지, 해제 등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전반적 분쟁이 포함된다.27) 그런데 아래와 같이 좀 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바, 한국법이 관할합의의 준거법이라는 전제에서 검토해 본다.
국제계약에 관한 분쟁에서도 급박한 손해발행의 위험이 있거나 현상 유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관할합의에서 지정한 국가의 법원에 보전처분에 관한 관할이 발생하겠지만, 이러한 관할은 신속성을 요구하는 보전처분의 성격상 전속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합의에서 지정한 국가의 법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면 관할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28) 물론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 보전처분에 관한 관할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할합의에서 한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보전처분에 관하여 관할을 가질 수 있다.
관할합의가 이루어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과 같은 법정채권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도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관할합의에서 적용범위를 명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를 관할합의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말미암은’은 ‘그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라는 사전적 의미이므로 반드시 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합의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법정채권도 관할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계약과 그로부터 발생한 법정채권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나의 국가의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모순된 판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증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적 이유에서도 관할합의가 이뤄진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법정채권에 대하여도 관할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9)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기본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적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독점적 판매계약(exclusive sale of goods agreement)의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 운송방법, 제품의 홍보방법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기본계약에서 합의를 함과 동시에 관할합의를 하고, 그 후 개별적으로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량만 기재한 주문서(purchase order, PO)만으로 거래를 한다. 주문서에 의한 발주도 개별적 매매계약에 해당하는데 기본계약인 독점적 판매계약에서 한 관할합의가 주문서에 의한 개별적 매매계약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1992년 유럽사법재판소30)Powell Duffryn plc v Wolfgang Petereit 결정31)의 사안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 회사인 Duffryn은 독일 회사인 IBH-Holding의 주주였는데, Duffryn이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회사 정관을 채택하였다. 이 회사 정관에는 “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와 회사 및 그 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회사에 관한 소송을 통상 관할하는 법원에 복종한다.”32)라는 관할의 합의가 있었다. 그 후 IBH-Holding은 청산절차에 들어갔고, 청산인은 Duffryn이 인수한 주식의 납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정관에서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Duffryn은 위 조항은 관할합의에 ‘일정한 법률관계’(particular legal relationship)를 요구하는 브뤼셀협약33) 제17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당사자가 관할합의를 한 계약 이외의 분쟁에 대하여도 관할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관할을 갖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불의타(不意打)를 입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률관계’가 요구된다고 보면서, 위 회사 정관상 관할합의에서 언급한 분쟁이 회사와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위 관할합의는 브뤼셀협약 제17조를 충족한다고 보았다.3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요구한 이유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데 취지가 있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관할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기조 하에 앞의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양도일단적으로 관할합의의 유무효를 판단하지 않고 관할합의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35)
앞의 독점적 판매계약의 경우에 기본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동일한 물품구매에 대하여 매매계약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계약에서 체결한 관할합의의 효력을 개별 물품계약에도 미친다고 해석하더라도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일정한 법률관계’의 요건이 충족되는 관할합의라고 본다.
원고의 소 제기에 대응하여 피고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반소(counterclaim) 또는 상계항변(set-off)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반소 또는 상계항변의 근거가 된 청구권에 관하여 관할합의가 있고 여기서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국가의 법원이 원고가 본소를 제기한 국가의 법원과 다른 경우에도 피고가 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거나 상계항변을 하는 것이 관할위반이 아닌지 문제된다.
반소란 원고가 제기한 소송절차에 편승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이고, 본소와 구분되는 독자적이 소송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지를 부착해야 하고, 반소를 제기하면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반소 취하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 하는 등 본소 절차와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반소 제기라고 하여 관할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반소는 별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 소를 편의를 위하여 본소 절차에서 편승하여 진행하는 것뿐이므로 오직 반소원고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반소를 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하여 허용될 수 없다.36)
한편 상계항변에 관하여 유럽사법재판소37)에서는 1978년 당시 브뤼셀협약 제17조가 기초로 하고 있는 당사자의 독립성(individuals rights of independence)의 권리와 불필요한 소송의 방지(avoid superfluous procedure)를 이유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이상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러한 결론에 찬성하기 힘들다. 의사표시만으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송 외에서의 상계와 달리 소송상 상계항변은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야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예비적 항변에 해당한다.38) 그러므로 법원은 상계항변이 있으면 자동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다.39) 이러한 점에서 소송상 상계항변은 소송의 제기와 다름이 없으므로 적어도 한국법에 따르면 자동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관할합의는 상계항변에도 미쳐서 합의된 법원 이외의 법원에서의 상계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
국제사법 제8조에서는 관할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관할법원이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반면에 헤이그관할협약 제3조a)에서는 관할협약의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의 체약국의 법원들 또는 하나의 체약국의 하나 또는 특정된 다수의 법원들(the courts of one Contracting State or one or more specific courts of one Contracting State)”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브뤼셀규칙 recast 제25조 제1항은 “하나의 회원국의 하나의 법원 또는 법원들(a court or the courts of a Member State)”이 관할을 갖도록 관할합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할합의에서 관할법원이 확실하게 특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40) 관할합의는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합의이므로 관할법원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관할합의의 속성이고, 관할법원이 특정되지 않으면 관할합의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국제사법 제8조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관할합의에 관할법원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충분히 도출될 것이다. 국내 관할합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9조도 관할법원의 특정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1977. 11. 9. 자 77마284 결정에서는 관할법원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할합의가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용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합의 당시에 관할법원이 특정되어야 할 것 같지만, 국제계약에서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관할합의 당시가 아니라 소 제기 당시에 관할법원이 특정될 수 있다면 이러한 당사자의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Coreck Maritime GmbH v Handelsveem BV and Others 결정41)에서는 관할합의에서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관할법원이 결정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한 객관적 요소(objective factors)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관할법원을 특정한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국제운송계약에서 화물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면 관할합의 당시에 관할법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소 제기 당시에는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유효한 관할합의이다.
관할합의의 당시에는 관할법원을 특정하지 않고 향후 당사자 일방이 지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관할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언급한 기준을 적용하면, 이러한 합의는 순전히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관할법원이 결정되고 관할합의 당시에는 관할법원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할법원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또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를 관할합의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일방만이 관할법원을 지정할 권리는 갖는 것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고, 공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관할합의는 무효이다.
국내 관할합의에 관한 대법원 1977. 11. 9. 자 77마284 결정에서도 위와 같은 관할합의를 무효로 보았는데, ① 위와 같은 합의는 어느 법원에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라고 볼 수밖에 없어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당사자 일방의 영업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관할합의가 있다. 이러한 경우 관할합의 당시에 관할법원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가 존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앞에서 언급한 유럽사법재판소의 Coreck Maritime GmbH v Handelsveem BV and Others 결정에서는 객관적 요소에 의하여 법정지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선하증권에서 운송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하는 국제재판관할합의도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관할합의 후에 관할법원의 결정기준이 된 영업소가 다른 국가로 이전된 경우에 관할법원도 함께 변경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관할법원에 여전히 관할을 갖는 것인지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관할합의에 관한 대법원 2009. 11. 13.자 2009마1482 결정에서는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한 경우에, 위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조정에 따라서 관할영업소가 이전되면 관할법원이 변경되므로, 결국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를 무효로 하기 보다는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위 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위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위와 같은 관할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되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에 관할합의를 한 후에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면 소가 제기된 때에 영업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지만, 당사자가 관할변경을 목적으로 영업소를 다른 국가로 옮긴 경우에는 관할합의 당시 영업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42)
관할법원이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객관적 요소는 관할합의를 한 때의 객관적 요소를 의미한다.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그 객관적 요소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관할법원이 변경된다면 관할합의 당시에 객관적 요소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힘들므로 이러한 관할합의는 무효이다. 다만, 관할합의를 무효로 보기보다는 관할합의를 유효로 보고서 관할합의 당시에 특정된 관할법원에 관할을 고정시키는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합리적이다.
당사자 쌍방 모두 자신이 소재한 국가에서 제소 당하도록 관할합의를 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제소 당하도록 관할합의를 하는 상호관할합의(reciprocal clause)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관할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법원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효한 관할합의이다.43) 다만 앞서와 같은 이유로 관할합의 이후에 당사자의 소재지가 변경되더라도 관할법원은 관할합의 당시의 소재지의 법원이 된다.
국내 관할합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제1심 관할법원만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급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국제재판관할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제1심 법원의 소속국과 제2심 법원의 소속국을 다르게 지정하는 합의는 심급관할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44)
Ⅲ.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실체적 유효요건
실체적 유효성에 관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는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아래와 같이 네 가지의 유효요건을 규정하고 있다.45)
-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포함한다)에 따를 때 그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
합의를 한 당사자가 합의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아래에서는 각 요건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관할합의도 국제적 요소를 갖고 있어서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므로 관련 국가 중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서 그 유효성을 결정할 것인지 법선택(choice of law)의 문제가 발생한다.46) 개정 국제사법 전에는 관할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47) 한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이나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한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은 모두 관할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준거법을 검토하지 않았다. 위 대법원 판결들이 참고조문으로 국내 관할합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9조와 사회상규에 관한 민법 제103조를 적시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대법원이 준거법에 대한 고민 없이 당연히 한국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하 ‘법정지법’이라 함)을 관할합의의 유효성을 결정할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헤이그관할합의협약 제5조와 브뤼셀규칙 recast 제25조 모두 법정지법에 따르도록 하여 국제사법과 동일한 입장이다.
헤이그관할협약과 브뤼셀규칙 recast에서 법정지법을 관할합의의 준거법으로 지정한 취지는 사건이 제기된 국가에 관계없이 관할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유사하게 나오도록 하는데 있다.48) 위 협약이나 규칙에 따르는 국가의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는지 관계없이 그 법원은 관할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법정지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국제사법은 한국 법원만을 구속하므로 위와 같은 취지가 성립될 수 없다.49) 사견으로는 법정지법의 적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관할합의는 그 법적 성격50)에 관계없이 소송상 합의51)로서 소송절차를 형성하는 효력을 갖고 있고, 형성되는 소송절차는 법정지 법원의 소송절차이다. 따라서 관할합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국가의 법은 법정지법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관할합의는 소송 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절차 그 자체는 아니지만 절차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절차는 법정지법에 따른다는 원칙’의 참조하여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하여는 가급적 법정지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복잡한 법적용을 피하는 방법이다.
한편, 관할합의가 여러 국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비전속적 관할합의인 경우에, 소가 제기된 국가의 법원이 관할합의에서 지정한 국가의 법원 중 하나라면 자신의 법이 법정지법이 되므로 그 법정지법만으로 관할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소가 제기된 국가의 법원이 관할합의에서 지정한 국가의 법원 중의 하나가 속하지 않으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국가 법 모두가 법정지법이 되므로 모든 법정지법에 따라서 관할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52)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정지법에 법정지의 ‘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 즉 국제사법규칙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53) 헤이그관할협약은 본문에서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법정지법에 국제사법규칙이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고,54) 브뤼셀 recast의 경우도 본문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전문 (20)에서 국제사법규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복잡한 법률적용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법정지법에 의하여 관할합의의 유효성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서 법정지법은 법정지 전체의 법을 의미하므로 국제사법규칙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사법규칙을 적용한 결과 관할합의에는 법정지법,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지정한 주관적 준거법, 또는 국제사법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객관적 준거법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중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도 법정지법에 따르게 된다.55)
법정지법의 국제사법규칙에서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반정(Renvoi)의 문제가 발생하면, 제3국의 국제사법규칙을 제외한 실질법만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제3국의 국제사법규칙을 적용하여 다른 제3국의 법으로 지정하는 전정을 허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56) 이러한 문제도 법정지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정지법의 국제사법규칙에서 제3국의 법을 지정하되 제3국의 국제사법규칙을 제외한 실질법만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적용하면 될 것이다.57)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단순히 관할합의의 유효성의 판단에 법정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형식적 유효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1호에서의 법정지법에 따른 관할합의의 유효성은 실체적 유효성을 의미한다. 브뤼셀규칙 recast 제25조 제1항에서는 법정지법이 관할합의의 실체적 유효성(substantive validity)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헤이그국제관할협약 제5조(1)는 법정지법에 의한 규범통제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지만 법정지법은 실체적 유효성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고 있다.58)
이러한 실체적 유효성에서는 민상법 전반의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기, 강박, 착오, 당사자능력 등이 포함된다.59)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유효성과 동일하게 봐도 무방할 것이다.60) 그런데 법정지법의 유효요건과 별도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관할합의를 할 당사자능력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법정지법이 규율하는 실체법적 유효성의 범위에서 당사자능력이 제외되는지 의문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대리권의 존재에 관하여도 법정지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정지법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61) 그러나 대리권수여행위는 관할합의와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관할합의가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법 제32조에서는 대리인의 준거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하고 있다. 대리권의 문제를 대리행위로 본인을 구속시키는 능력의 문제로 봐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와 같이 소가 제기된 국가의 연결규칙에 따라서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다.62)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정지법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칙도 포함된다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법정지로 지정되었다면 국제사법의 연결규칙에 따라서 결정된 국가의 법이 관할합의의 실체적 유효성에 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제사법은 관할합의에 대한 별도의 연결규칙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사법의 관련규정을 가지고 해석에 의하여 연결규칙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법은 당사자자치를 근거로 준거법의 지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할합의에 관하여도 준거법의 지정이 허용된다. 따라서 관할합의에 관하여 별도로 준거법의 합의가 있다면 이 준거법에 따라서 관할합의의 실체적 유효성이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관할합의에 관하여 별도로 준거법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는 주된 계약과 관할합의 모두에 관하여 하나의 준거법을 지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에 맞는 해석이므로63)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서 관할합의의 실체적 유효성이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된 계약과 관할합의 모두에서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객관적 준거법이 주된 계약에 적용될 것인데,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관할합의도 주된 계약과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주관적 준거법의 경우와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법적용을 피하는 방법이다.64) 결국 주된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이 관할합의의 실체적 유효성을 결정한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합의를 한 당사자가 합의를 할 능력(이하 ‘합의능력’이라고 함)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합의의 효력을 부정한다. 합의능력은 개정 전의 국제사법이나 대법원에 판례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요건이었다. 이 합의능력은 한국법의 체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65) 사법상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인지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66) 관할합의가 소송절차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소송법과 긴밀한 관계가 있지만 민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송행위는 법원에 대한 행위인 반면에, 관할합의는 소송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소송행위라고 볼 수 없고 채권계약67)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로 봐야 할 것이다.68)
위 규정에서는 합의능력이 없는 경우만을 언급한 뿐이고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서 합의능력이 없는 경우인지 연결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관할합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법원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합의능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는 관할합의에서 관할법원으로 지정되어 소가 제기된 국가의 법원 또는 당사자가 관할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가 제기된 국가의 법원이 된다. 즉 소가 제기되어 계속된 법원이 소재한 국가가 합의능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 합의능력의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헤이그관할협약 제6조b) 및 제9조b)에서도 제소지법(law of the requested State)에 따라서 능력이 없는 경우를 관할합의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69)
만일 한국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국제사법 제26조와 제28조에서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본국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는 본국법의 결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위 규정들의 연결규칙에 따라서 지정된 국가의 법이 적용될 것이다. 반면에 관할합의를 소송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 민사소송법 제57조에서는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합의능력을 결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도 합의를 할 능력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외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관할합의를 무시하고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정지법인 외국법과 소가 제기된 국가의 법인 한국법이 합의능력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양자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관할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해석된다.70) 하지만 여러 국가의 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용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 이러한 입법에는 의문이 있다.71) 반면에 브뤼셀규칙 recast에서는 관할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법정지법 하나만을 적용하고, 소가 제기된 법원이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72)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를 관할합의의 무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73)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관할에 관한 조약이 없고, 국제사법 이외에 국제재판관할에서의 전속관할을 규정한 법이 없으므로 위의 전속관할은 현재로서는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속관할을 의미한다.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특정한 법원만이 관할권을 갖는데 이를 ‘전속관할’(exclusive jurisdiction)이라고 한다. 국제재판관할에서 전속관할의 근거74)는 국가 행정상 필요 또는 공서양속 등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간략하면 분쟁의 사안이 전속관할을 갖고 있는 나라에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75) 개정 국제사법 전에는 국제재판관할에서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었지만 이러한 전속관할이 인정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었다.7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에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하여 국제재판관할에서 전속관할을 인정하는 등 다수의 판결77)에 전속관할을 인정하였다.
전속관할에 관한 요건은 개정 국제사법 전에도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고 있었다. 외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관할합의에 관한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과 한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관할합의에 관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은 모두 당해 사건이 한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사건이 한국 법원에 전속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국제사법의 경우에는 한국 법원이 전속관할을 갖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법상 제3국이 전속관할을 갖는 경우도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법상 관할합의에서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국가 이외의 제3국이 전속관할을 갖는 경우에도 이러한 관할합의는 한국 법원에서 효력이 없다.
한편, 한국법의 전속관할만 고려하므로 법정지법의 전속관할에 위반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관할합의에 불구하고 한국법상 한국 법원의 전속관할이면 한국 법원은 그에 관한 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법상 제3국이 전속관할을 갖고 있다면 소를 제기 받은 한국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 당사자가 전속관할을 갖고 있는 제3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전속관할과 관련하여 전속관할에 속한 사항과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단지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위 규정은 전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유,무효는 전속관할에 속하지만,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78)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제사법 제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를 관할합의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의 승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사후적 규범통제라면, 위 규정은 사전적 규범통제라고 할 것이다.
개정 전의 국제사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지만 외국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관할합의의 유효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이나 한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관할합의의 유효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모두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여, 개정 국제사법과 문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한 취지라고 본다. 위 규정은 관할합의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법정지의 공서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헤이그관할협약 제6조c)에서는 “관할합의에 효력을 부여하면 명백히 정의에 반하거나 명백히 소가 계속된 국가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81)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과 차이는 “명백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 나라에 따라서 공서양속과 정의를 구분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된 것뿐이지 정의는 공서양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82) 이러한 점에서 위 국제사법의 규정과 그 취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공서양속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파악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 일방의 선택에 따라서 관할법원이 확정되도록 하는 유동적 관할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이미 밝히 바와 같다.
소가 제기된 국가의 강행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을 외국으로 한 경우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이때 강행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에 한정되며 내국적 강행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83) 국제적 강행규정이란84) 준거법에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을 의미하고, 내국적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합의에 불구하고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의 관할합의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어 보인다.85) 문제는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에 있다. 이는 입증의 문제라고 볼 것인데 위 국제사법 규정에서는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라고 하므로 명백한 고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난해할 것이다.
Ⅳ. 결론
관할합의의 유효요건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허용요건, 같은 항 단서의 실체적 유효요건, 같은 조 제2항의 형식적 요건으로 나누어진다. 형식적 유효요건까지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글의 양이 많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형식적 유효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요건에 대하여만 살펴보았다.
국제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국제재판관할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국제계약은 거의 예외 없이 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 등 분쟁해결에 관할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 관할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논의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국제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전적으로 의존했지만 개정 국제사법 덕분에 이제 국제사법을 기초로 해석론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국제사법 제8조가 헤이그관할협약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 결과 국내법에 적절하지 않은 듯한 조문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석상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은 헤이그관할협약에 조속히 가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