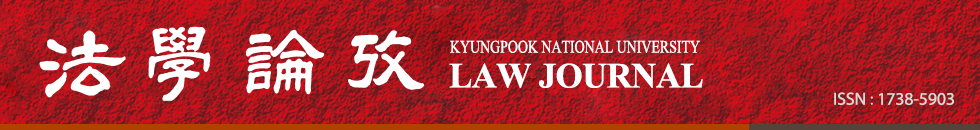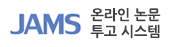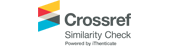Ⅰ. 머리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 이에 대한 구제수단은 대체로 형사적인 구제수단과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양분된다. 그런데 형사책임은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적 손해배상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근래 들어 언론매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인에 대한 명예침해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소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만한 사건이 실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함에도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참고 인내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물론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용서해서가 아닌 그 이유가 배상책임을 묻기까지 그 절차나 방법의 어려움, 혹은 비용이나 시간대비 구제효과의 미미함 때문이라면 그 또한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수단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제14∼15조), 반론보도(제16조), 추후보도청구권(제17조), 정정보도의 공표 및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제30조) 등이 존재한다. 이들 구제방법은 사후적인 방법과 사전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사처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전보,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은 사후적인 구제수단이고, 학설과 판례1)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금지청구(방해예방·방해정지·방해배제청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작용한다.2) 인격권 침해의 경우 한번 침해된 명예가 사후적인 방법으로는 회복되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사전적인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금지청구권은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214조 물권적청구권에 따른 방해예방청구권을 유추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다.3) 다만 금지청구권이 남용된다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를 넘는 인격권 침해와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되, 공표되는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익형량을 통해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4)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대표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고, 명예훼손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고수되고 있다.5) 그런데 손해발생이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면 실질배상의 실현과 예방적 차원의 권리구제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병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으려면 위자료를 넘는 명예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의 전향적인 해석이 필요한 이유이다.6)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2016. 9. 30. 시행된 개정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한편,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범죄화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논의이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차례 합헌 판결을 한바 있으나, 재판관의 의견이 점점 위헌 쪽으로 쏠리는 것을 볼 때 머지않아 명예훼손죄가 형법에서 사라질 날이 다가올지 모른다. 그렇다고 섣불리 비범죄화로 나아가기에는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예상치 못한 때에 위헌판결이 남으로써 인격권 침해의 무분별한 확산이나 인격권 경시태도의 조장이 불러올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격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7) 이러한 측면에서 명예훼손죄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한다면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는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 규정에 포괄적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도입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Ⅱ.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도입 배경
징벌적 손해배상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징벌의 한 형태로 미리 정해진 척도에 따라 손해를 가중 배상하는 원칙은 기원전 2000년경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제8조)에 나오고, 이러한 원리는 기원전 1400년경 히타이트 법과 기원전 1200년경의 히브리 모자이크 법, 기원전 200년경 힌두 마누법전(제320, 322, 329조) 그리고 로마 민법의 몇 배의 손해배상 규정으로 이어진다.8) 가중 손해배상에 대한 최초의 영문 조항은 1275년 영국의회에서 제정된 “종교인에 대한 무단침입자는 두 배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Trespassers against religious persons shall yield double damage)인데, 이 첫 번째 규정 이래 의회는 1275년부터 1753년까지 최소 65개 이상의 2∼4배에 이르는 손해배상 조항을 제정하였다.9)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오랜 기원을 함무라비 법전(The Code of Hammurabi)에서 찾거나 성경의 구약(절도나 간통의 경우)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소나 양을 훔친 경우 몇 배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율법에서 찾거나, 로마법(강박이나 준법률행위의 경우)에서 찾는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가장 첫 번째 명시적 수용은 1763년 영국의 허클 판례(Huckle v. Money)부터라 할 수 있다.10) 영국의 인쇄공 허클(Huckle)은 North Briton, Number 45를 인쇄한 혐의로 6시간 구금되었는데, 석방 이후 무죄판단을 받은 허클은 자신이 구금당함으로써 하루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점과 숙련공으로 얻었던 명성에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당시 허클의 하루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300파운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300파운드라는 금액은 실제 허클이 입은 재산상 피해를 과도하게 상회하는 금액이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가혹한 손해배상(exemplary damages)”이라 지칭하였다.11)12)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리는 미국에 곧바로 수용되어 미국의 판례와 성문법에 반영되었다. 미국은 연방법이나 주법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법원 판례를 통해 150년 전부터 인정해왔고,13)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주마다 다르다.14)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당장의 책임을 묻는 것과 더불어 장래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사적 벌금의 성격을 가진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의 건강, 안전, 생명에 대한 위험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현저한 부주의가 있는 경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15) 역사적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명예훼손(libel and slander), 사기(fraud), 고용차별(employment discrimination),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등에 주로 부과되었다.16)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으로 가장 화제가 된 판례는 Liebeck v. McDonald’s Restaurants 사건이다.17) 사건 당시 79세 이던 스텔라 라이벡은 1992년 2월 27일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49센트를 주고 커피를 구입하였는데 커피에 크림과 설탕을 넣던 와중에 뜨거운 커피를 무릎에 쏟았다. 라이벡은 이 사고로 3도 화상을 입고, 피부이식술을 위해 8일간 입원하여야 했으며, 이 기간 동안 20파운드(9.1kg)정도의 체중이 빠졌다. 사고 이후 라이벡은 영구손상과 2년 동안 부분장애를 이유로 맥도날드에 2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맥도날드는 이를 거절하였고, 부득이 라이벡은 뉴멕시코주 법원에 “지나치게 위험(unreasonably dangerous)”하면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defectively manufactured)” 커피를 판매한 “중과실(gross negligence)”을 원인으로 맥도날드를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소송과정에서 원고 라이벡의 변호사는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점에 화씨 180-190도(섭씨 82-88도)의 커피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화씨 190(섭씨 88도)의 커피는 2∼7초 내에, 화씨 180도(섭씨 82도)는 12∼15초 내에, 160도(섭씨 71도)는 20초 내에 3도 화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맥도날드는 커피 온도가 화씨 140도(섭씨 60도) 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해 다른 유사 커피전문점들은 맥도날드와 달리 상당히 낮은 온도의 커피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맥도날드에 전보배상 16만 달러와 징벌적 배상 270만 달러(맥도날드의 이틀치 매출에 해당한 금액)를 명하였으나, 판사가 징벌적 배상만 48만 달러로 감액하여 전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합산한 총 6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사건이다.18) 이처럼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비용 또한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엄격한 조건하에 인정하여 피고의 악의와 배상손해액 간의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19)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1990년 법무부에 민사특별법제정 분과위원회가 발족된 후 1999년 법무부 산하 법무자문위원회에 ‘민법 개정(재산법) 특별분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2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반론이 있는데,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그간 충분하지 못하였던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21) 반면, 도입을 반대하는 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할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전보보상만 인정하는 우리 민사법 체계와 맞지 않으며, 거액의 배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억지소송과 남소의 가능성만 커질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견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2011년 3월 2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2011년 3월 29일 신설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2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하도급자에게 손해를 끼친 원사업자는 발생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였다.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도입된 이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23) 개인정보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24) 우리나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제법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에 초점을 두었다가 현재는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등 비경제분야의 불법행위 영역까지 폭넓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25) 현재는 24개 법률26)에서 36여개의 특정된 법위반행위에 대한 3∼5 배수 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 있다.27)
영미법은 공사법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은 반면 대륙법은 공사법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대륙법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가 불법행위법의 주된 목적이고, 억지나 제재는 사법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며, 배상 또한 원칙적으로 전보배상에 국한된다.28) 이에 반해 영미법계에서는 공사법의 준별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손해의 전보라는 사법적 목적 외에도 억지와 제재라는 공법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인정해왔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가해자의 주관적 동기 즉 비난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가해자에게 악의 또는 무모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할 경우 혹은 비재산적 손해와 같이 배상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29)
영국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은 일반적 손해배상(general damages), 가중적 손해배상(aggravated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으로 구별되는데, 가중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나 동기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증가되었을 때 그러한 원고의 감정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30)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악성이 존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장래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 억제하기 위한 처벌적인 성격의 손해배상을 말한다. 이 점이 전보적 손해배상인 가중적 손해배상과 응보적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31)
한편, 영국은 검시관 및 사법법(Coroners and Justice Act 2009)을 제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2013년 명예훼손법을 개정하여 심각한 피해(serious harm)를 원고가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명예훼손 소송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다.32) 피고의 항변사유로는 진실, 정직한 의견, 웹사이트 운영자, 공익적 사안에 관한 출판, 과학적 또는 학술적 저널에서 논문심사의 의견이 면책되도록 하였다(Defamation Act 2013 제2조∼제6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영국에서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33) 그 이유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수도 적을 뿐더러 영국 법원이 갈수록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의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법원의 경우 일부 사건에서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손상에 대한 전보적 배상으로 가중적 손해배상이 간혹 인정될 뿐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찾아보기 힘들다.34) 이러한 점에서 미국 법원이 피고에 대한 처벌의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접근하는 것과 영국법원의 판단경향과는 차이가 있다.35)
미국 50개 주 가운데 미시간, 네브라스카, 워싱턴 주는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36) 앨라배마, 알래스카, 조지아 등 28개 주는 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아칸소,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는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37)38)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은 최고액을 정하는 방식, 배수제한을 두는 방식,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등이 있고, 일부 주에서는 배상금의 일정액을 주정부나 공공기관에 귀속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하다.39)40) 또한 캘리포니아와 알라바마 주 등 13개 주의 경우 악의(malice)에 준하는 정도를 요구하고, 알래스카와 콜로라도 주 등 24개의 주에서는 악의는 아니나 중과실은 넘을 것을 요구하며, 플로리다, 일리노이 주 등 6개 주에서는 중과실만 요구하고, 루이지애나 및 메사츄세추 주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정기준을 법에 명시해두었다고 한다.41) 미국의 Common Law에서는 배심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재량도 가지는데, 배심원이 아닌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배상액 한도42) 또한 법규에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우리나라와 이 점에서 차이가 난다.43)
주관적 요건의 측면에서 미국의 판례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악의(malice)를 요한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malice)의 개념에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에서부터 발전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44))와 보통법상 악의(common law malice45))가 존재한다. 현실적 악의46)란 “유포된 발언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경솔하게(recklessness) 무시한 것”을 뜻하고, 보통법상 악의는 “의사소통 이루어진 상황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앙심이나 악의에 기인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전자는 명예훼손에, 후자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이다.47)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발전해온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는 원고가 공인인 경우 가해자에게 현실적 악의가 존재해야만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며, 사인의 경우에는 과실만을 요구하되 오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 악의까지 요한다. 보통법상 엄격책임의 원칙의 경우 명예훼손 사실이 공표되었다는 것만으로 손해를 추정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던 것을 현실적 악의의 원칙의 도입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13개주는 여전히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인정하고 있다.48)
민·형사책임의 준별과 전보배상이라는 대륙법계의 원칙에 따라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침해에 대해 배수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계약법, 담보법, 특허법, 근로계약법 등의 경제나 노동 관련 법률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조금씩 수용되었다.49) 일본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민사소송의 원칙과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최고재판소가 판시한바 있으므로 도입에 소극적이라 평가된다.50) 독일 또한 민법상 정신적 손해배상과 노동법상의 차별금지법(동일금지법)에 징벌적 요소를 일부 가미한 것 외에는 손해배상에 있어 징벌을 고려하지 않는다.51)
같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개별 법위반행위의 특성에 맞게 해당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행위를 규정하는 형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사실에 법위반행위자의 주관적 악성이 강조되지는 않고, 법위반행위는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행위도 포함되며, 인격적 이익의 침해뿐만 아니라 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3∼5배 방식의 배수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52)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5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는 ‘명백한 고의’를 요구하며, 특허법(제128조 제8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6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항)에서는 고의만을 요구한다. 미국법과 우리나라의 법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영미법계에서 발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려다 보니 법체계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라 평가된다.54) 물론 우리 법체계상에 고의, 악의, 중과실 외에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intentional, malicious, oppressive, evil motive, reckless indifference와 같은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55) 이처럼 주관적 악성이 덜 고려되는 이유는 개별 법률에 규정된 법위반행위의 면면이 이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유형화이기 때문이다.56)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새로운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관적 개념요소의 도입으로써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법위반행위의 적발가능성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15배 정도의 배상은 인정해야 효율적인 억제효과가 존재한다고 한다.57) 징벌적 손해배상의 궁극적 목적은 법위반행위의 억제이므로 합리적 인간이 법위반행위의 통해 얻는 편익이 기대제재 수준을 상회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다.58) 그런데,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9. 4. 30. 기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수집 가능한 판결은 총 12건59)이었고, 이 중 2건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는데, 그 금액은 모두 2배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60) 즉, 경제적 기본권에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렇게 인색할진대,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는다면 금지청구가 더 효율적인 억제책이 된다고 볼 여지가 높다. 아울러,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용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는가 여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SNS 등의 사용빈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의 경우 인격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나 재산관련 사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 법위반행위의 효율적인 억제책으로 폭넓게 수용되어 가고 있다 할 수 있다.
Ⅲ. 명예훼손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가능성
징벌적 손해배상은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과 징벌적 기능을 동시에 갖는 손해배상방법이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책임을 충족하였다는 통상의 고의·과실 이상의 악의성과 같은 특별한 가중적 책임요소가 존재하여야 한다.61) 우리 민법이 기본으로 삼는 전보배상은 징벌이 중심이 아니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케 하는 위하적 요소나 윤리적 책임요소를 곧바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교육·처벌·억제기능, 불법이익 환수를 통한 법질서의 수호기능, 응보감정의 충족기능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6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전보가 본질적인 목적이고, 예방 및 제재는 부수적인 기능을 가진다. 그럼에도 한번 침해된 명예는 침해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 힘들기 때문에 인격권의 침해의 경우 손해전보보다는 사전적 구제수단이 더 필요하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효율성이나 원상회복에 가장 근접한 치유책은 금지청구권이라 할 수 있으나 금지청구권이 남용된다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금지청구권의 과도한 수용은 인정될 수 없다.63) 이러한 이유로 영미법계의 특유한 손해배상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전적 예방적 구제수단의 하나로 고려된다.64)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악의적이거나 고의적 행위에 대한 징벌을 통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65)66)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보다 훨씬 큰 배상액을 부과하므로,67)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충분치 않은 데 대한 구제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경제적인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그 배상액을 결정하는 보편적 방식은 명예훼손과 같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산정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손해산정의 어려움은 비단 인격권 침해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꺼리는 요인이 되었지만, 최근 거짓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명예훼손에 있어서도 범죄억지적인 측면과 위하적인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유인책이 되었다.
그럼에도 명예에 관한 죄의 존폐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헌소지뿐 아니라 만약 형사처벌을 폐지한다면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에 더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 간통죄를 2015년 폐지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만으로 대응수단을 삼았을 때 그것이 과연 부부관계의 정조의무를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었는가에 관한 회의적 생각마저 드는 것을 고려한다면 인격권의 보호를 위하여 명예에 관한 죄의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순전히 전환한다는 것은 법익보호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증거수집 및 입증의 곤란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간통죄만 보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자 더 이상 수사기관을 통한 불법행위의 증거수집이 불가능해졌고, 더불어 통신사들조차 통화내역의 공개를 꺼림으로써 간통이 오히려 정당화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부간 의무나 가정의 평온보다 더 중시되는 가정 해체적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거경험에 빗대어 본다면 명예에 관한 죄의 완전한 대체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법적안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손해배상금의 제한기준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필요하다.68)
언론기관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는 필연 언론에 대한 과잉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한다.69)
형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벌적 성격을 내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명예침해보다 표현의 자유침해가 더 크므로 법익균형성에도 반한다.70)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형사상 고의를 넘어서는 악의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와 맞지 않으며, 악의적이라는 의미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부추기게 되고, 국가기관이나 유력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71) 무엇보다 허위 왜곡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이 이미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 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자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72) 위법성의 관점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피해자를 넘어 사회일반을 향하고 있다는 위법성의 확장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킬 법리적 근거나 사회경제적 타당성이 없다.73) 징벌적 손해배상의 과거 개정안들은 배상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특정 사건에 과도한 위자료 산정의 소지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형사처벌적 성격으로 인한 이중처벌(일사부재리 위반)의 문제 또한 발생한다.74)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사법상 구제수단인 전보적 손해배상과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제재시스템이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수단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불법행위법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거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을 통한 교정적 정의가 중심이었다면 현대사회는 사전적 구제수단을 통한 인격권의 보호와 배분적 정의의 실현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모되고 있다.75) 즉, 기존의 제도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공정하고 올바른 언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중처벌적 성격을 띠어 위헌적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용한 우리나라의 20개 정도의 개별법 중 형사처벌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꼭 위헌이라 할 수 없고, 과거 영국이나 미국76)의 일부 주에서도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양립을 위헌의 절대적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명예에 관한 죄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77) 징벌적 손해배상은 자유형을 전제로 한 형벌과 비교할 수도 없다.78)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감정)과 사익(언론출판사의 표현의 자유침해)을 비교할 때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침해되는 공익이 사익보다 월등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79)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이버공간에서 허위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 및 개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80) 언론은 보도의 파급효를 바탕으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올바른 언론문화를 정착하고 그를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을 유도하는 것이다.81)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5배의 형태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원에서 인용하는 명예침해에 대한 평균적인 손해배상액수인 500만원의 3∼5배가 2,000만원 안팎에 불과하므로 언론사의 경우 이러한 위자료로 인하여 위축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더불어, 국민의 여론 또한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여론조사 때마다 과반수를 넘는다는 국민적 정서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82)83)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현황을 보면 등록된 간행물은 2024년 기준 26,048개에 이른다. 인터넷신문으로 한정해도 12,059개나 된다. 제대로 된 취재가 가능한 언론사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규모 영세단체들이 난립해 있고 이들에 의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는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나 피해확산의 방지를 입법목적으로 한다면 영세 언론사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와 대규모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를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영세 언론사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는 개인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와 큰 차이를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 언론사를 매출액, 발행부수, 점유율 등을 통해 제한함으로써 과잉규제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정부정책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 언론의 존재이유에 대한 보장이자 언론의 자기검열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견해84)는 적절한 지적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고 해서 명예에 관한 죄를 반드시 폐지할 필요는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명예훼손죄의 목적이 다소 중복되는 측면은 있으나 현행 사법시스템 내에서 형사처벌은 민사처벌의 근거이자 증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한바, 형사법정에서 유무죄 판단을 통하여 1차적인 가해자의 고의가 입증되고, 일반적인 고의를 넘어선 현실적 악의나 중과실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요구되는 악성을 민사법원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용이한 입증과 정확한 판단 잣대로 형사재판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에 관한 죄를 비범죄화한 후 전보배상에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담을 민사법원에 전적으로 지울 필요는 없다.
Ⅳ. 명예 관련 사건에 있어 손해배상 액수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준형사처벌이라 할 만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불공정한 행위의 시정이나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일면 타당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라면 그러한 필요성은 더 절실할 것이다. 그런데, 명예훼손 사건 중 2021년에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판결 210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들의 평균청구액은 9,030만원, 원고 승소율은 대략 34.3%, 평균 인용액은 약 882만원이고, 인용액이 5백만원 이하인 사건이 전체의 61.1%를 차지하며,85)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보도의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86) 비판보도를 막기 위한 공인이나 국가기관, 대기업의 일부 봉쇄소송을 제한다면 대다수의 사건은 기각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작은 금액만 인용된 셈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의 피해는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한번 보도되면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구제수단이 미흡한 것이 사실임에도 피해규모에 비해 손해배상 액수가 너무 미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실무적 차원의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가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87) 단순한 개인의 자유를 넘어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여한다는 자치정체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88)는 점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도입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한다면 과잉금지원칙상의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유무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실상 폐지되어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여지가 높으나,89)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벌규정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더해 준형사벌의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보탠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 존립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제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명예훼손죄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명예에 관한 죄를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때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는 실제 그러한 변화를 겪어보기 전에는 속단할 수도 없다. 악성댓글에 국한한 것이기는 하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악성댓글을 작성한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언어적 표현을 개선에 법적규제 여부가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54.4%, 법적 규제가 존재한다면 댓글 작성 횟수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13.8%에 이르렀으나, 악성댓글을 작성해본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오히려 법적규제 여부가 언어적 표현 개선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4.9%, 댓글 작성 횟수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1.9%로 나타났다.90) 이러한 여론조사는 조사대상과 조사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형사처벌의 정도가 올라간다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의견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은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댓글이나 발언을 SNS상에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벌강화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경험이 이미 있는 사람일수록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준법의식이 강한 일반 평균인은 특정 발언이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형량하여 행동하므로 처벌강화는 분명 인격권 침해를 제한하는 수단이 됨이 명백하나, 일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은 처벌의 존부나 강약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91) 특히 유튜브를 통한 개인채널 운영자의 경우 유명인에 대한 자극적이거나 조작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뿐 아니라 운영수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경우도 심심찮으므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병행을 통하여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적 효과를 강화할 필요성이 분명 존재한다.
명예에 관한 죄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법유형을 살펴볼 때, ① 명예에 관한 죄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② 명예에 관한 죄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병존하는 경우, ③ 명예에 관한 죄는 인정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정하는 경우, ④ 명예에 관한 죄는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만 인정하는 경우, 이상 4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③에 해당하고 영국과 미국은 ④에 해당한다. ③, ④의 경우는 명예에 관한 죄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체관계 혹은 상반관계를 나타내는 표지일 수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우위를 둔다면 ①이 이상적일 것이고,92) 인격권의 보호에 치중한다면 ②가 적합하다.
명예에 관한 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의 주된 논거 중 하나는 형법의 보충성과 과잉금지원칙이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행정벌은 형벌이 주는 범죄억제 효과를 완전히 대체하기 힘들다. 부유한 자에게는 형벌, 특히 자유형이 주는 위하력이 금전배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93) 형벌의 대체수단으로 논의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현실적 손해를 보상하여 불법행위 이전 단계로 회복하기 위한 보상적 손해배상과 다르고,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위자료와도 다르면서도 벌금과 유사한 성질94)을 가진다는 점은 분명하다.95) 물론 일수벌금제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안으로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일수벌금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와 사실상 동일하면서 형사처벌의 전력을 남겨두는 것이므로 명예에 관한 죄의 폐지와 상반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한 측면에서 명예에 관한 죄의 비범죄화를 장차 고려한다면 일수벌금제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더 합리적 해결책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을 대상자의 명예정도에 따라 달리 정한다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고, 피해에 비해 재산박탈의 정도가 과하다면 책임원칙에 반할 수 있다.96) 실제 대부분의 징벌적 손해배상사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도 배상액이 실제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부당이득’, ‘사무관리’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가해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소위 American Rule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승소하였음에도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배상액은 이러한 점까지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97)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배상액 산정기준이 명확하고 적정한지, 원고에게 과도한 부당이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항상 문제될 수밖에 없다.98)
명예에 관한 죄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미국의 법경제학자들의 견해99)에 따르면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면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현저히 감소하고 그로 인해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중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한다.100)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기준으로는 가해자의 면책확률과 재발가능성의 상관관계가 제시되기도 하는데, 법경제학자인 Cooter 교수는 이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전보적 손해배상 대비 징벌적 손해배상의 비율을 산정하였다.101)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BMW of North America, Inc. v. Gore 판결102)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과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비난가능성의 정도(the degree of reprehensibility of the defendant’s conduct),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비율(the ratio between the plaintiff’s compensatory damages and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유사한 사건에 있어 민·형사적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과의 차이(the difference between the punitive damages and the civil or criminal sanctions authorized or imposed in comparable cases)를 제시한 이후,103) Campbell 판결104)을 통해 비난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 신체적 또는 경제적 손해인지 여부, 고의적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혹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인지 여부, 피해자가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지 여부, 불법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하고자 하였다.10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맞물려 대체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희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형사처벌의 삭제 없이 행정적인 제재에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것은 법익균형성에도 반하므로 명예에 관한 죄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서로 상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06) 그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명예에 관한 죄가 일방을 폐지하는 대신 다른 한쪽을 수용하는 대체관계에 있다고 쉬 단정할 수는 없다.107)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에게 형벌이 주는 위하력이 금전배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형벌이 주는 위하력이 그만큼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민사재판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상대방이 아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집행당할 재산도 없고 앞으로 재산을 모을 생각도 없는 사람은 민사재판의 승패에 그리 연연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상으로 잃을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벌 모두 상당한 위하력을 갖겠지만, 금액이 아무리 과다하다 할지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나 반대로 가진 것이 전무한 사람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은 유명무실할 수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벌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책임에 비례하여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입법안이 21대 국회108)에 제출되어 상임위 소위원회까지 통과하기도 하였고,109)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법안이 제출되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110)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입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액수가 증액되지는 않겠지만 형법 규정에 있어 최고형의 규정은 거기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함에 있어 신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더불어 언론 등에 의한 무책임한 허위보도나 일탈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최선은 무엇일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미국과 달리 ‘악의(malice)’111)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악의란 일반적 고의(General Intent)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불법에 대한 인지와 실행의사를 말한다.112) 우리나라의 각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와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를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악의를 구성요건으로 추가하여 불법에 대한 인식이 고의나 과실에 불과하면 일반 민사불법행위로, 악의가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특별법을 적용함으로써 전략적 봉쇄소송과 남소의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다.113) 앞서 언급한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114)은 허위조작정보를 통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서 ‘허위조작’이란 미국법에서 말하는 악의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함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악의를 추가하자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언론기관이 실수로 잘못 보도한 것이라면 진실성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면책될 수 있으나, 허위조작은 보도하는 자가 이미 진실이 아님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접하는 대중이 진실로 오인하도록 사실을 가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허위조작보도의 경우에 한하여 언론기관의 금전배상책임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하여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무절제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유에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하였다면 그가 남용한 권리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 또한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하되 악의를 추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입법화하자는 것은 허위조작보도라는 악의적 언론에 국한하여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청할만한 견해라 생각한다. 22대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입법안에는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언론사의 ‘악의’를 요구하고 있다.115)116)
반면, 새로운 주관적 악성 개념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현재와 같이 개별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유형화를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장은 새로운 주관적 악의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크게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법체계상에 고의, 악의, 중과실 등 외에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intentional, malicious, oppressive, evil motive, reckless indifference와 같은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117) 다만, 일반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포괄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면 고의(미필적 고의를 배제한 의사설적 고의)와 중과실(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현저한 위반)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주관적 악성의 개념이 요건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118)119) 일반적 의미의 주관적인 악성 개념의 도입과 그에 대한 해석은 법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할 위험이 도사린다.120)121) 이러한 체계상 문제점은 향후 포괄적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과정에서 새로운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관적 개념요소의 의미를 구체화함으로써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포괄적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없이 법위반행위를 개별 법률에 구체화하고 객관화한다면 새로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없이도 기존의 의사설적 고의나 중과실의 개념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122)123)
더 나아가, 민법이나 상법에 포괄적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둔다면 주관적 악성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필요할 것인바 그 의미를 두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여러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는 비방의 목적이 주관적 악성의 대안일 수 있다. 이에 반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 법률에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할 경우 개별행위 태양이 명시될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보다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불러올 수 있는 위축효과와 그로 인한 민주사회의 근간인 공론의 장의 차단이라는 과잉금지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이 쟁점이 될 여지가 높다. 입법에 있어 이러한 점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포괄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악의를 구성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악의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의, 과실, 중과실 등과 구별되는 악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악의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124)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유책성의 정도가 낮은 단순 과실은 주관적 요건으로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125) 단순 과실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본래의 목적인 피해자가 원래의 상태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익취득 금지원칙에 반하고, 과실만으로는 징벌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126)
특히 허위사실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는 이를 세분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신뢰할만한 정보원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 악의를 추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함이 타당할 수 있다. 여기서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자면, ① 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받은 형사처벌 정도, ② 신뢰할만한 정보원의 존재 여부, ③ 허위사실 여부, ④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확산 여부(광고상실, 드라마 출연배제, 직장상실 등), ⑤ 침해행위의 수단(SNS, 동영상 플랫폼), ⑦ 침해행위 기간과 반복성, ⑧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세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악의를 추정할만하다.127) 악의가 추정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되, 배상의 범위는 위에서 ①을 기준금액128)으로 하여 ②∼⑧에 열거된 조건을 하나씩 충족할 때마다 피해배상의 범위를 1배씩 늘리는 방법도 실질적이면서 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129) 이러한 방식에 따른다면 굳이 새로운 주관적 악의 개념을 정의함 없이 기존 대륙법의 고의·중과실의 개념을 그대로 둔 채,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산정 방식과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개별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산출할 수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 명예의 침해로 인한 손해는 대개 정신적 손해에 국한되는데, 일반인과 달리 공인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의 예측 가능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인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반대로 사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허위사실 여부, 정보원의 존재 여부, 명예훼손의 횟수와 반복성 정도, 그로 인한 피해확산 여부, 악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족하는 조건이 많을수록 2∼7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배상금액에 있어 공·사인 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실례로, 최근 배우 김수현 사건에서 배우 김수현이 광고회사로부터 위약금 청구130)를 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적극적 손해나 촬영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극적 손해는 현실적일 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 금액으로 산출이 가능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재산손해는 산출하기 힘들며 대체로 위자료를 통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위자료는 대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곤란으로 인한 손해전보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131)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는 대상은 일반인인 것이다.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죄의 형사적 처벌 또한 현실적 악의의 원리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명예훼손죄의 성립 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달하기 쉬우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굳이 공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연예인과 같은 직업인 보다는 정치인과 같이 자신의 유명세가 금전적인 이익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공인으로 국한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자료의 규정을 이용하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하다는 견해도 제시된다.132)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 따르면 침해된 권리가 비재산권일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인정해왔으므로 위법성의 정도가 극히 높은 경우 법관이 각 사건에서의 효과적인 억제력을 가지는 배상액의 기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고액의 위자료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뿐 아니라 ‘제재적 기능’과 ‘일반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133)134) 이는 민법 제763조가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고, 민법 제393조는 특별손해에 있어 예견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손실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특별손해(징벌적 손해배상)를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35)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비교적 경미한 손해배상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발표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고의·중과실에 의한 명예훼손 시 ‘일반피해’의 경우 기준금액은 5,000만 원, ‘중대피해’의 경우 기준금액이 1억 원이고,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의 2배를 가중금액으로 하되, 특별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사유의 정도가 중하여 가중금액만으로 손해의 전보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중범위(2배)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도 있다.136) 이러한 대법원 위자료 산정방안 등을 보면 명예에 관한 죄에 있어서도 위자료 규정을 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에 부합한 적용이 가능하므로 꼭 법 개정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이 위자료의 규정을 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면 일리가 있기는 하나, 실무상 행위자의 악의가 입증되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2∼3배 가중하기 쉽지 않고, 개별사안의 담당판사에 따라 적용기준이 들쑥날쑥해질 우려도 있다. 애초 법 규정을 통해 가중된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두는 것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입장에서 이견을 줄이고, 가해자 또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것이 결국 언론의 자정노력으로 이어져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 나아가 자유민주사회의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토대를 만들고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가는 첩경이라 하겠다.
Ⅴ. 결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나 인격권 중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우위에 둘 수는 없겠지만 특히 정치나 언론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은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가치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는 이익형량이 쉽지 않은 법익이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명예에 관한 죄가 대체관계라거나 상반관계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현대사회에서 SNS 매체를 통해 폭넓게 그리고 손쉽게 침해받는 개인의 인격권을 더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고려할만한 선택이다. 개별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할 경우 주관적 악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개별 법률에 규정된 법위반행위의 면면이 이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유형화이기 때문이다.137) 다만 포괄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경우 악의를 구성요건에 추가하는 것도 필요한바, 악의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의, 과실, 중과실 등과 구별되는 악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악의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격권 침해행위에 국한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기준을 구체화하자면, ① 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받은 형사처벌 정도, ② 신뢰할만한 정보원의 존재 여부, ③ 허위사실 여부, ④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확산 여부138)(광고상실, 드라마 출연배제, 직장상실 등), ⑤ 침해행위의 수단(SNS, 동영상 플랫폼), ⑦ 침해행위 기간과 반복성, ⑧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세 가지 이상을 충족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만한 악의를 추정할 수 있고, 그 배상의 범위는 ①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위 각 요건을 몇 개나 충족했는가에 따라 정하면 될 것이다.139)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공인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산정된 금액 또한 다액임이 일반적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전보배상으로 국한하되, 반대로 사인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여부, 정보원의 존재 여부, 명예훼손의 횟수와 반복성 정도, 그로 인한 피해확산 여부, 악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족하는 조건에 따라 많게는 2배에서 7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함으로써 배상금액의 실질적 형평 및 배분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