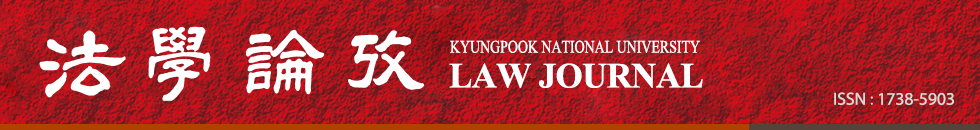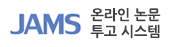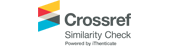Ⅰ. 서언
우리는 동아시아 전근대 왕조사회 법제도를 흔히 ‘律令’체제로 특징짓곤 한다. ‘율령체제’의 정비는 고대국가 기반에 결정적인 핵심요소로 여겨진다. 한편 전통 법문화는 흔히 ‘外儒內法’이나 ‘禮主法從’ 또는 ‘德主刑輔’의 특성으로 일컬어진다. 夏·殷·周 삼대에 덕치와 예치 중심의 통치 질서는, 춘추 말에서 전국 초기에 걸쳐 각 제후국들이 부국강병을 도모하여 변법개혁을 단행하면서, ‘刑’이 주된 통치수단인 ‘율령’ 기반의 법치로 대전환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는 부국강병과 겸병통일이라는 시대적 대세와 역사적 사명에 부응하여 제자백가의 사상을 현실정치의 실용적 수요에 맞게 종합 재구성한 ‘법가’ 사상가들의 활약이 크게 공헌하였다.
상앙의 변법개혁으로 선진적 부국강병의 기반을 마련한 후발 秦은 순자의 제자 李斯와 한비자의 법가 사상을 전폭 수용하여 시행함으로써 마침내 6국을 병탄하고 전국을 통합하여 중원의 정치사회적 대통일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법가 사상은 오로지 겸병통일만 지향한 효율적 수단으로서 농경생산과 전쟁승리를 독려하여 지나친 혹독한 엄형중벌 법치를 관철하였고, 그 결과 秦은 분서갱유로 상징되는 각박하고 잔인한 통치로 민심을 잃고 통일대업 완성한 15년만에 망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사상적 연원에서 보면, 전통 왕조사회 ‘율령’체제는 이미 秦 때 확실한 기반과 틀을 형성하였지만, 극단적인 사상적 제도적 성향과 중원 통일 후 짧은 존립수명으로 인하여, 그 성숙한 법문화를 후대에 모범적 유산으로 전승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하고 불완전하였다. 秦을 대체해 등장한 漢은 武功으로 인한 창업을 文德으로 守成하기 위하여 율령을 정비하고 예제를 수찬하면서, 법가사상에 기초한 秦의 율령과 유가사상에 기반이 된 周의 德禮 문화를 조화롭게 융합하여 통일 천하에 새로운 통치규범을 완성하였는데, 이는 이후 약2천년간 동아시아 전통 왕조사회에 기본질서인 ‘율령’체제로 확고부동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본고는 전통 왕조사회에 핵심기본 규범질서로서 2천년간 장수한 ‘율령’체제 법문화의 연원을 탐색하려는 목적의 일환에서, 秦의 ‘율령’을 기반으로 漢대에 유가 덕례 문화를 ‘外儒內法’, ‘禮主法從’, ‘德主刑輔’의 특성을 지닌 새로운 ‘율령’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특히 한무제 때 ‘獨尊儒術’을 건의하고 천인감응 및 천재지변 이론으로 왕권의 정통성 확립 및 정당성 요청을 강조하며, 덕주형보 사상과 춘추절옥 자문으로 철학사상 및 재판실무 양방면에 혁혁한 공훈을 남긴 동중서의 법사상 전반을 연구하고자 한다.
동중서는 정확한 생몰년대는 불분명하나1), 春秋를 공부하여 효경제 때 박사가 되고 무제 때 유명한 ‘天人三策’으로 발탁되어 활동하다가 무제보다 먼저 별세한 것은 분명하다. 동중서가 3년간 집과 농장(舍園, 살림)을 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학문에 정진한 일화는 유명한데, 만년에 귀향해서도 죽을 때까지 끝내 생업을 돌보지 않고 학문수양과 저서를 일삼았다. 그는 동아시아 2천년 전통왕조의 통치이념을 확립한 공적으로 예로부터 각 분야 대가들의 연구와 평론이 끊이지 않았고, 근대에 들어서는 봉건유산의 원흉처럼 매도되기도 하였지만, 21세기 전후해서 긍정적인 재평가 분위기로 돌아선 느낌이다. 특히 춘추결옥이나 원심정죄 같은 주제는 법사상 관점에서 일찍부터 조명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법사상이나 법철학적 관점의 연구도 등장하여 눈길을 끈다.2) 본고는 「史記」와 「漢書」 本傳 및 「春秋繁露」 원전을 바탕으로, 기존 주요 연구를 참조하여 동중서의 법사상을 탐구한다.
Ⅱ. 獨尊儒術 大一統 사상의 등장과 그 시대적 배경
흔히 로마가 무력·기독교·로마법으로 세 번 세계를 통일했다고 일컬어지는데, 진시황이 정치군사적 영토적 통일과 함께 문자·도량형·율령의 제도적 통일을 이루고, 분서갱유로 대표되는 사상적 통일까지 3차원 전면통일을 획책하다 망했다. 秦을 이은 漢도 군사적 영토통일에 이어 율령예제의 정비를 이루고 무제 때 중앙집권적 군주제의 확고한 안정을 꾀하여 현량대책을 자문하면서, 동중서가 이른바 “罷黜百家, 獨尊儒術”3)의 大一統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통치이념의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는데, 이는 로마제국의 경우처럼 시대적 역사적 요청이기도 하였다.
우선 고조·혜제·문제·경제 4대에 걸쳐 황로 무위사상 주도로 휴식번영을 취하면서 북방 흉노에 대해서도 전략적 포용양보 정책을 취하고, 궁정의 솔선수범 절약으로 국고재정이 충실해지면서 민생경제가 풍요로워져, 무제 때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전환의 발판이 되었다. 정치상으로는 秦이 군현제로 쉽게 망하자 한초 종친과 공신들한테 제후왕을 봉한 것이 도리어 지방권력 강화로 중앙조정을 위협하는 화근이 되어, 吳楚7국의 반란을 평정하고 각종 빌미로 지방제후왕의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중앙집권이 최고조로 강화되었다. 이를 발판으로 대외정책도 적극적 정벌로 전환하여 중원 역사상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철학사상 및 학술문화상 그에 상응하는 통치이념이 필요하였다.4)
즉, 동중서의 ‘독존유술’ 대일통을 위시한 사상 전반은 이러한 전반적인 시대배경 아래서 역사적 필연으로 선택된 것이다. 전국시대 백가쟁명 이래 상호 교류 및 영향 과정을 거치면서, 秦이 정치적 통일을 이룩한 뒤 문자·수레 등의 통일과 함께 사상적 통일까지 이루려고 분서갱유를 자행했지만 시기상조로 실패하고, 呂氏春秋와 한초 회남자 및 황로사상 등을 거치면서 유가·도가·법가·음양가가 서로 융합하여, 賈誼와 陸賈 등을 통해 무르익은 시절인연이 동중서에 의해 집대성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5)
무제가 조종 대업을 계승하여 천하만사 통치의 책임을 무겁게 느껴 제후들에게 현량 천거를 명하여, 친히 제서로 改制의 원칙, 왕조교체의 근거, 천재지변의 원인, 인성의 선악, 백성화락의 정치비결 등을 책문하면서, 후환을 염려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배우고 연구한 대도의 요점을 조리 있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론해달라고 당부하자, 이에 동중서가 이른바 ‘天人三策’을 상론하여 아뢰면서 맨 마지막에 종합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한 것이다.
“春秋에 大一统은 천지에 항상 불변하는 경론이며, 고금에 회통하는 의리입니다. 지금 스승마다 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의론이 다르며, 百家의 방도가 다르고 취지가 같지 않아서, 군주께서 一统을 견지할 수 없으며, 법제가 자주 변해 아래에서 무얼 준수해야할지 모릅니다. 신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공자의 학술로서 육예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그 道를 단절하여 다시는 올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간사하고 편벽된 논설이 식어 사라진 연후에 통치기강이 하나로 정리되고 법도가 밝아지며 인민이 무엇에 복종할지 알게 됩니다.”6)
이렇듯 한초 안정에서 전성으로 비상하려는 역사적 전기를 맞이하여 무제의 주동적 자문요청에 부응하여, 동중서의 춘추 대일통의 철학사상이 ‘독존유술’의 건의로 중앙집권적 전제황권의 확립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춘추공양학을 바탕으로 본인의 천인감응이론도 체계적으로 정립하면서, 유학이 유교로 발전하여 향후 2천여년 동아시아 전통왕조 율령체제의 정신적 이념적 지주가 되는 획기적 전기가 된 것이다.7)
로마가 제국 팽창과 세계주의 확대에 따른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의 이성인 영원법을 보편타당한 이성으로 인식 가능한 자연법에 근거한 만민법을 확립하였듯이, 동중서도 유가 고유의 관습적 禮 대신 제자백가 공통의 보편성인 ‘하늘(天)’과 사람의 합일에 근거한 형이상학적 우주론으로 통일제국의 새로운 통치이념을 성공리에 제시했다고 평가된다.8) 이러한 의미맥락에서 다음에 살펴볼 천인관계론은 그 철학사상에 핵심기초를 이룬다.
Ⅲ. 天人感應의 天賦왕권론과 천벌 災異論
동중서가 주창한 獨尊‘儒術’은 공자·맹자·순자의 정통 유가를 계승한 것이지만,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니고 시대환경 변화와 역사적 요청에 따른 변화발전을 도모한 ‘漢’대 특유의 유술이다. 전국말기 순자 때 이미 공맹의 원시 유가에서 상당히 변화해 당시 변법개혁운동을 반영하는 시대적 특성이 가미되어, 그 제자인 李斯·한비자가 그를 바탕으로 법가사상을 집대성하였듯이, 동중서 유술도 법가사상에 의한 진시황의 통일과 전국말기 이래 시대를 풍미한 음양오행이론 및 한초 황로사상까지 반영하는 시대적 종합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9)
동중서는 殷·周 이래 인격적 의지의 天을 계승하여 思孟학파의 천인감응 관념을 흡수하여 ‘天人合一’ 이론을 구성하여 君(王)權‘神授’설 또는 ‘천부(天賦: 하늘이 부여한)’ 내지 ‘천명(天命: 하늘이 명한, 하늘의 명을 받은)’ 왕권론을 제시해 한 무제의 중앙집권적 절대왕권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10) “하늘은 온갖 신의 위대한 임금이라, 하늘 섬김이 갖춰지지 않으면 비록 온갖 신이라도 전혀 도움이 없다.”11) “하늘은 온갖 신의 임금이자, 지상 군왕이 최고로 존경하는 대상”이다.12) 옛날 천자 예법은 郊祭보다 중대한 게 없었다. 郊祭는 항상 온갖 신에 앞서 제일먼저 정월 상순 辛일에 봉행하여, 예법상 3년상에 설령 조상한테 제사지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감히 郊제를 폐할 수 없었다. 郊제가 종묘보다 중요하고, 하늘이 사람보다 존귀하기 때문이다.13) “春秋 大義는 國喪에 종묘 제사는 멈추어도 郊祭는 멈추지 않는다. 父母 喪으로 감히 천지를 받드는 예를 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 喪은 지극히 애통하고 슬프고 괴롭지만, 오히려 감히 교제를 폐할 수 없거늘, 어찌 교제를 폐할 명분이 있단 말인가?”14)
뿐만 아니라, 하늘은 만물의 시조인지라, 차별 없이 두루 덮고 모두 포함하여, 해와 달과 비바람으로 조화롭게 하고, 음과 양과 추위와 더위로써 완성한다.15) “하늘은 만물의 시조이니, 만물은 하늘이 아니면 생기지 못한다. 만물은 陰 혼자만으로도 생기지 못하고, 陽 하나만으로도 생기지 못하니, 음양과 천지가 함께 참여한 연후에 생긴다.”16) 따라서 “왕도 또한 하늘의 아들인지라, 하늘이 천하를 堯舜에게 주어 堯舜이 하늘의 명을 받아 천하에 왕이 되었으니, 堯舜이 사적으로 천하를 전하여 함부로 선양하지 못함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17)
“천자는 하늘에게 명을 받고, 제후는 천자에게 명을 받으며, 아들은 아비에게 명을 받고, 臣妾은 임금에게 명을 받으며, 아내는 지아비에게 명을 받으니, 명을 내리는 모든 주체는 존귀함이 하늘이라서, 하늘에게 명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천자가 天命을 받들 수 없으면 곧 폐하여 公이라 부르니, 바로 왕의 후예들이다. 公侯가 천자 명을 받들지 못하면 명분이 끊겨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니, 衛侯 朔이 그렇다. 아들이 아비 명을 받들지 못하면 토벌의 죄가 따르니, 衛 세자 蒯聵가 그러하다. 신하가 君命을 받들지 못하면 비록 선량해도 반역자라 말하니, 晉 趙鞅이 晉陽에 들어간 걸 반란이라 부른 게 그렇다. 아내가 지아비 명을 받들지 못하면 지아비와 의절해 말도 안 한다. 하늘 명을 받들어 순종하지 않는 죄는 이처럼 중대하다.”18)
여기서 이미 삼강의 골격이 나타나는데, 요컨대 “오직 천자만 하늘에 명을 받고, 천하는 천자한테 명을 받으며, 한 나라(인민)는 임금한테 명을 받는다.”19) 이렇듯 천자의 왕권은 하늘이 명하여 받은 것이니 ‘천부’왕권 또는 ‘천명’왕권이라 할 수 있는데, 보통 왕권신수설로 불린다.
동중서에 의하면, “옛날 글자를 만들 때 3획을 긋고 한 가운데를 수직 관통하여 ‘王’이라 한 것은, 3획이 天·地·人을 뜻하고 가운데 수직으로 이은 것은 그 道를 통함을 뜻하여, 天·地·人 셋의 한가운데를 꿰뚫어 셋을 통달했다는 의미이니, 王이 아니면 누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20) 이는 王이 道 및 天·地와 함께 우주에 四大에 속한다는 老子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정의다.21) 따라서 “王은 天意를 받들어 인민의 성품을 성취하는 임무”를 지닌다.22) 王은 위로 삼가 하늘 뜻을 받들어 천명에 순응하고, 아래로 인민의 밝은 교화에 힘써 ‘性’을 완성시키며, 법도를 바로잡고 상하 질서를 잘 분간해 욕망을 방지해야 한다. 이 셋을 잘 닦으면 큰 근본이 바로 선다. 요컨대, “王은 하늘 뜻을 받들어 정치에 종사”하는 자다.23)
동중서에 의하면, 사람이 사람을 낳을 수는 있으나 만들 수는 없으니,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늘이다. 사람의 근본이 하늘에 있으니, 하늘은 사람의 증조부이고, 사람이 위로 하늘을 닮은 까닭이다. 사람의 희노애락 감정은 春秋冬夏와 유사하니, 기쁨은 봄, 분노는 가을, 즐거움은 여름, 슬픔은 겨울에 각각 상응한다. 하늘의 副本이 사람에게 있으니, 사람의 감정과 성품은 하늘로부터 유래하여, 하늘에서 받았다(受)고 부른다.24) 이러한 ‘天人相副’와 ‘天人同一’은 흔히 ‘天人合一’로 부르는데, 하늘에도 희노의 기운과 애락의 마음이 있어 사람의 감정과 유사하게 부응하여, 천인이 하나다. 봄에 희기는 낳고, 가을에 노기는 죽이며, 여름에 樂氣는 기르고, 겨울에 哀氣는 갈무리한다. 네 기운감정은 하늘과 사람이 공동으로 지니며, 작용하는 원리는 하나로 통한다. 따라서 하늘과 같이하면 크게 다스려지고, 하늘과 달리하면 크게 어지러워진다. 군주의 도리는 자신에게서 하늘과 똑같은 것을 적용하여 다스려야 하니, 천인이 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25)
동중서의 천인합일 왕권천부 이론이 중앙집권적 절대왕권 확립에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지고한 천명의 절대권위로 왕권을 제약하여 도덕인의의 교화를 통한 민본적 위민정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위협적 경종의 의미도 동시에 함축한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분명히 “춘추필법은 인민이 군왕한테 수순하고 군왕이 하늘에 수순한다.… 인민을 눌러 군왕을 펴주며, 군왕을 눌러 하늘을 펴준다.”26) 군왕은 인민에 절대 우선하지만, 하늘에는 절대 순종해야 한다. 나아가 동중서는 “하늘이 인민을 내신 게 王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늘이 王을 세운 게 인민을 위해서다. 그래서 그 덕행이 인민을 안락하게 다스리기에 충분한 자한테 하늘이 천하를 주고, 그 죄악이 인민을 해치기에 충분한 자는 하늘이 천하를 빼앗는다.”고 직접 엄중한 경종을 울린다. “夏가 무도해지자 殷이 정벌했고, 殷이 무도해지자 周가 정벌했으며, 周가 무도해지자 秦이 정벌했고, 秦이 무도하자 漢이 정벌했다. 有道가 無道를 정벌함은 바로 天理로서, 그 유래가 오래 되었으니, 어찌 湯武에 이르러서만 그러하겠는가?”27) 이러한 논리문맥을 추론하면, 漢도 무도해지면 하늘이 왕권을 빼앗아, 새로 천명을 받을 자가 漢을 정벌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역사적 진리의 함의가 자명해진다.28) 아무리 강철심장 한무제라도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까?
‘천인합일’의 천부왕권론은 ‘천인감응’의 재이론으로 이어진다.
“春秋에서 살피건대, 前世에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늘과 인간이 서로 더불어 감응하는 관계를 관찰하면, 몹시 경외할 만합니다. 국가가 장차 도덕을 잃고 정치에 실패하려면, 하늘이 먼저 災害를 내려 견책하고 경고하는데, 그래도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면 또 더욱 괴이한 현상을 보여 두렵게 경책합니다. 그래도 스스로 변화할 줄 모르면 큰 손상과 낭패가 이르게 됩니다. 이로써 天心이 仁으로 人君을 사랑하여 혼란을 멈추게 하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 무도한 세상이 아니라면, 하늘은 최대한 부축하여 안전하게 유지시키려고 하시니, 군주가 할 일은 강하게 부지런히 힘쓰는 것입니다.”29)
동중서에 의하면, 공자의 유가 사상 핵심은 당연히 인간사랑 仁에 있지만, 인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도 현명한 지혜통찰이 필수다. 지혜로운 자는 禍福을 멀리 보고 그 이해득실을 일찌감치 알기 때문이다. 동중서는 천지만물에 정상을 벗어난 변화를 ‘異’라 하고, 작은 걸 ‘災’라 부른다. 통상 ‘災’가 먼저 오고 ‘異’가 뒤따른다. 災는 하늘의 견책이고, 異는 하늘의 위엄이다. 견책해도 알아채지 못하면 위엄으로 두렵게 한다. 무릇 災異의 근본은 모두 국가실정에서 생긴다. 국가실정이 처음 싹틀 때 하늘이 재해를 내려 견책 경고하고, 그래도 변화할 줄 모르면 怪異함을 드러내 깜짝 놀라게 한다. 그래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면 재앙허물이 닥친다. 이렇듯 天意는 자상하게 인자함을 보이니, 사람을 갑자기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자 함이다. 즉, 災異로 드러나는 天意는 하늘의 意欲과 不欲이 있다. 사람이 안으로 자성하여 스스로 마음에 징계하고, 밖으로 사정을 관찰해 국가에 효험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天意를 제대로 보는 자는 災異에 대해 경외하되 혐오하지 않으니, 하늘이 내 허물잘못을 떨쳐 알려 내 실수를 구제하고자 나한테 알려주신다고 겸허히 수용한다. 춘추필법은 군주가 고대 법제와 전통을 바꾸어 天災가 발생하면 다행스런 국가라고 부르고, 공자는 ‘天幸을 보고도 不善을 계속 행하면 그 죄가 극도에 달한다.’고 경고한다. 楚莊王은 하늘이 재해를 보이지 않고 땅이 요얼을 보이지 않자, 산천에 나가 ‘하늘이 장차 나를 멸망시키시려나? 내 잘못을 말해주지 않아 내 죄를 극도로 몰아가는가?!’라고 기도했다. 天災는 잘못에 호응하여 오고, ‘異’가 뚜렷이 나타나면 경외할 일이니, 이는 하늘이 나를 구제하시고자 함이라, 춘추에서 오직 천행으로 여긴 바요, 초 장왕이 기도한 간청이다. 성왕현군은 오히려 충신의 간언도 즐겨 받아들이거늘, 하물며 하늘의 견책경고를 마다하겠는가?30)
이렇듯, 동중서의 재이론은 유생들의 정치참여 및 議政의 중요한 사상도구로서 매우 강력한 사회비판기능을 지니고, 미약하지만 민주권리의 표현이었다. 확실히 군권신수설과 재이경고설은 상호 표리관계로 온전한 사상체계를 이룬다.31) 천부왕권론으로 절대왕권의 정통성에 이론근거를 제공하고 천인감응 재이론으로 仁義에 기초한 정당한 왕권행사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왕권제약의 기능도 수행한 것이다.
Ⅳ. 전통예법의 근본인 三綱五常
현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강오륜’은 본디 한 단어가 아니라, 고래로 전해오던 ‘오륜’에 전국말 한초에 확립된 ‘삼강’이 합쳐지면서 본말과 순서가 도치된 이념적 용어다. 근대 이후 삼강오륜은 전제왕권을 옹호한 사상이란 논리로 극렬한 부정과 비난을 받아왔는데, 동중서의 이론체계에서 천인합일 재이론과 함께 절대왕권을 제약하려는 목적의식이 강하게 공존했음을 간과하고 시대조류에 편승한 감정적 편견의 소치로 여겨진다.32)
‘오륜’은 현전하는 고전으로는 맹자에 처음 등장하는 最古의 인륜인데, 舜이 설(契)을 司徒로 삼아 백성을 가르친 ‘五敎’로서 부자유친·군신유의·부부유별·장유유서·붕우유신의 기본 윤리라고 한다. ‘오륜’은 ‘五常’으로도 불리는데, ‘常’은 ‘經’처럼 항상 불변의 떳떳한 도리·진리를 가리키며, ‘오상’은 ‘오륜’ 말고도 ‘五典’ 또는 ‘五敎’로서 아비의 의로움(父義), 어미의 자애(母慈), 형의 우애(兄友), 아우의 공손(弟恭), 자녀의 효도(子孝)를 가리킨다고 한다. 순이 직접 펼치도록 분부한 ‘오교’의 해석이 맹자와 좌전이 다른 학설을 보인다.33) 이와 달리 후대 일반보편으로 일컫는 ‘仁義禮智信’ 五常은 한초 동중서가 처음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새로운 통일 중앙집권 봉건왕조에 통치이념으로서 등장한다.
“무릇 仁·誼·禮·知·信 五常의 道는 王이 마땅히 닦고 신칙해야 하니, 五常을 잘 닦아 신칙하면 하늘의 보우를 받고 귀신의 영험을 누리며, 德이 널리 퍼지고 중생까지 미칠 것입니다.”34)
이 오상은 맹자의 사단에 ‘信’을 추가한 것인데, 오상 가운데 세 가지 핵심만 간추려 부각한 ‘三綱’이 2천여년 전통왕조 통치윤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아비는 아들에게, 군주는 신하에게, 지아비는 지어미에게 각각 벼리(綱)가 된다는 의미로, 綱은 본디 그물 둘레에 둘러친 굵은 밧줄로서, 그물눈이 헝클어지지 않고 잘 펼쳐지게 해주는 골격 근간이다. 핵심중추로서 주도적 지위와 권력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면에는 솔선수범하는 표준으로서 책임과 도의도 포함하여 양면성을 띠는 쌍방윤리의 규범적 범주다.35) 삼강에 해당하는 윤리는 본디 전국말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에 이미 등장한다. 전국말엽 법가사상이 秦의 천하통일에 중요한 사상적 이념을 제공하면서, 그 절대군주론이 효와 충의 이념적 결합에 가세하게 된다. 그 사상은 중용조화를 중시하는 유가사상을 취하고, 도가의 道의 절대성을 교묘히 결합시켜 군주의 절대 권위를 새롭게 창출한 것이다. 한비자는 ‘忠孝’ 편에서 군주에 대한 ‘충’과 부모에 대한 ‘효’의 자리를 맞바꾼 다음, 절대 군주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신하가 군주를,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각각 섬기는 세 윤리가 천하의 항상 불변의 도덕으로서, 인민통치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전제라고 강조한다.
“신하는 임금을 섬기고, 자식은 어버이를 섬기며, 아내는 지아비를 섬기는데, 세 인륜이 유순하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거역하면 천하가 혼란해진다. 이는 천하의 항구적 道로서, 현명한 임금과 어진 신하는 감히 범할 수 없다. 만약 총명한 자식이 어버이를 위하지 않는다면, 어버이가 집안에서 매우 괴로울 것이다. 또 총명한 신하가 임금을 위하지 않는다면, 임금 자리가 매우 위태로워진다. 그렇다면 어버이에게 총명한 자식과 임금에게 총명한 신하는 단지 해가 될 뿐,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충신은 임금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효자는 어버이를 비난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36)
이것이 ‘삼강’의 원형인데, 漢代에 그 이념이 삼강의 기본구조로 발전한다. 한비자의 절대군주론 사상이 유가의 禮論을 명분으로 표방하면서, 漢의 통치이념으로 자연스럽게 삼투해 들어가는데, ‘紀綱’의 비유개념을 매개로 동중서는 군신·부자·부부의 관계를 천지음양의 상대적 결합에 비유하며, 인간윤리의 기본 道義이자 ‘王道의 三綱’이라고 규정한다.
“君臣、父子、夫婦의 도의는 모두 陰陽의 도리에서 취한다. 君은 양, 臣은 음, 父는 양, 子는 음, 夫는 양, 妻는 음이니, 음양은 홀로 다니지 않고, 맨 처음에도 홀로 생기지 못하며, 끝마침에도 功을 따로 나누지 못하여, 서로 겸하여 공유하는 이치를 지닌다. …그래서 仁義制度의 수는 모두 하늘에서 취한다. 하늘은 君이 되어 덮어주고, 땅은 신하가 되어 실어주며, 陽은 지아비가 되어 낳고 陰은 지어미가 되어 보조하며, 봄은 아비가 되어 낳고, 여름은 아들이 되어 기르며, 가을은 죽음이 되어 棺에 넣고, 겨울은 애통하여 상례를 치르니, 王道의 삼강은 하늘에서 구할 수 있다.”37)
“三綱五紀에 순응하고 八端의 도리에 통달하여, 忠信과 博愛를 함께 갖추고 敦厚하게 禮를 좋아하면 善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진짜 聖人의 善이다.”38)
삼강윤리의 구체적 작용과 기능은 춘추번로 도처에 산재하여 나타나는데, 동중서의 ‘삼강’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三綱六紀’ 사상을 집대성한 것은 白虎通이다.39)
“三綱이란 무엇을 일컫는가? 君臣·父子·夫婦를 이른다. 六紀란 諸父·형제·族人·諸舅·師長·朋友를 이른다. 含文嘉에 보면, 군주는 신하의 기강이고, 부친은 자식의 기강이며, 남편은 아내의 기강이라고 한다. 모든 父兄을 공경하면, 六紀가 두루 통행하여, 외숙부에게 도의가 있으며, 族人에게 질서가 있고, 형제에게 친근함이 있으며, 師長에게 존엄함이 있고, 벗에게 의리가 있게 된다. 무엇을 綱紀라고 부르는가? 綱이란 펼침(張)이고, 紀란 다스림(理)이다. 큰 벼리가 綱이고, 작은 벼리가 紀인데, 상하관계를 펼쳐 다스려 人道를 가지런히 하는 규범이다. 인간은 모두 五常의 본성을 타고나서 친애하는 마음이 있는 까닭에, 紀綱으로써 교화할 수 있다. 마치 그물에 벼리가 있어 그물눈이 정연하게 펼쳐질 수 있듯이.”40)
오륜에서 ‘父子有親’이 첫째 윤리인데, 한비자 이후 삼강에서는 줄곧 ‘君爲臣綱’이 최우선 윤리도덕이 되었다. 또 부자·군신 상호간 상대적 쌍방관계가, 君·父의 臣·子에 대한 우월적 주종관계로 탈바꿈한다. 효와 충의 이념적 결합이 삼강에 이르러 최고 結晶을 이룬다. 게다가 후발 통치이념인 ‘삼강’이 ‘오륜’보다 우선하면서, 법가사상과 유가명분이 교묘히 결합한 ‘삼강오상’의 통치이념은 2천여년 전통 왕조에 핵심윤리로 확고부동한 권좌를 누리게 되었다.
현대 들어, 삼강에 대한 평가는 현대화 건설에 여전히 권위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통합에 건설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론(소위 ‘시황제’로 불리며 종신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는 현 집권자 구미에 적합할 것임), 상하급 간에 대등관계를 소홀시하고 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멸시하였다는 부정론, 윤리적 구속력은 사람의 자각에 근거하므로 우수한 점만 선별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절충론이 대립하나, 오륜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대적 비판계승을 통해 창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한다.41)
Ⅴ. 德主刑輔와 민생중시의 왕도정치론
동중서 법사상에 가장 중요한 핵심근간은 역시 ‘德主刑輔’ 사상이다. 통일왕조의 중앙집권적 절대권력 체제에서 춘추 대일통 사상에 근거한 대의명분 제공과 군주 중심의 ‘천부’왕권론(왕권‘신수’설)의 헌책은 시대적 요청이며 역사적 한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오로지 그 점만을 부각하여 동중서 철학사상을 봉건질서 유지에 앞장선 어용이라고 맹비난하고 전면 부정하는 것은 객관·공정한 학술적 평가가 아니다. 생명과 생존·생계·생활 자체가 위협받는 전제왕권 시대에 적어도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도 안전핀으로서 현실적 타협책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거의 모든 지식인의 숙명 같은 한계임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게 역사를 역사 자체로서 존중하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학문적 태도일 것이다.
그러한 기본적 절대적 제약 속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운신의 폭을 확보하여, 나름대로 절대왕권을 견제하고 제약하려는 철학사상적 고민궁리와 이론적 체계 구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 평가와 계승발전을 도모함이, 현재와 미래 발전을 향한 역사학의 임무이자 적극적 기능효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중서의 덕주형보 법사상은 덕례의 교화를 중시하는 전통 유가사상을 충실히 계승하여, 절대왕권의 원천인 ‘天道’와 ‘天命’에 연결함으로써 정통성과 정당성의 문제로 승화시켜 절대왕권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건전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후대 동아시아 각국 왕조에서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하여 失政과 暴政을 비판하고 善政·仁政을 호소한 명약처방이자 비결로서 재이론과 더불어, 덕주형보는 강력한 비판견제적 언론(상소)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사실 ‘덕주형보’는 요·순·우·탕과 하·은·주 삼대에는 성왕들이 스스로 자각·반성하는 왕도정치의 표준으로서 수시로 등장하고 강조되는 법사상 표어나 다름없다. 주공의 明德愼罰이나 呂刑의 법사상 등을 보면 통치자의 자발적 자각적 주도적 성찰과 선언이 특히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42) 그러한 법사상이 춘추전국 혼란을 거치고 잔인무도하고 각박한 진시황 통일을 거치면서, 중원을 재통일한 한에 계승되어 무제 때 중앙집권적 절대권력 전성기에 당면하여, 동중서가 천인감응과 ‘천부’왕권론(왕권신수설)을 기본으로 대일통 절대왕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재이론에 근거해 왕권의 자각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덕주형보 등 교화 우선의 민생중시 정치를 강조함으로써, 절대 권력에 상응하는 고도의 도의적 책임(왕도 의무)을 대등한 수준으로 요청한 것은 성현의 깊은 고심이라 할 것이다.
왕조 교체기마다 전 왕조 멸망의 교훈을 정리하여 새 왕조 守成의 귀감 및 자량으로 삼으려는 사상적 이론 정비가 있어 왔다. 殷도 夏桀의 멸망을 귀감으로 삼고, 周公도 殷紂의 멸망을 교훈으로 강조하였다. 혼란한 전국시대 제후 겸병전쟁에서 최종 승리한 秦은 유감스럽게도 딱히 周 멸망의 원인을 귀납할 필요와 시의성이 현저히 적었던 탓인지, 통일의 승리에 도취하여 엄형중벌의 가혹하고 각박한 법치를 가속한 결과 탄성한계 임계치를 벗어난 무쇠처럼 부러져 무너지고 말았다. 다행히 漢은 바로 눈앞에서 秦의 엄청난 획기적 대성공 직후 극적인 멸망을 목도하고 체험한 덕분에, 그 역사적 귀감과 교훈을 절실하게 명심할 강렬한 자극이 생생하게 펄펄 살아 있었다.
한초 현인 智者들이 이구동성으로 진 멸망의 교훈을 귀납 건의했듯이, 동중서도 무제가 자문을 요청한 현량대책에서 역사적 귀감과 현실적 정책상의 환골탈태 대책을 제시했다.
“秦에 이르러 신도와 상앙의 법을 스승 삼고 한비의 논설을 시행하여, 제왕의 도를 증오하고 이리처럼 게걸스런 탐욕이 습속이 되었으니, 결코 文德으로 인민을 교화하지 않았습니다. 명분만 따져 책망하되 실질은 살피지 않으니, 선행을 해도 반드시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죄악을 범해도 반드시 형벌을 받는 게 아니니, 문무백관이 모두 실질은 돌보지 않고 빈말만 요란히 꾸며대며, 겉으론 군주를 섬기는 예처럼 보여도 안으론 배반하는 마음을 품으며, 위조와 사기로 꾸며대 이끗만 쫓아가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또 잔인하고 혹독한 관리를 기용하여, 조세부역 수취에 절도가 없어 인민의 재력을 고갈시키니, 백성이 농경과 방직의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흩어져 달아나고, 도적떼만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형자가 몹시 많고 사망자가 마주보게 즐비해도 간사한 죄악이 그치지 않았으니, 풍속 악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정치명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인민이 빠져나가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43)
“聖王이 혼란한 세상을 이어받아 그 흔적을 모두 말끔히 소제하고 다시 교화를 회복하여 높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교화가 밝아지니 좋은 습속이 이루어져 자손들이 물려받아 행하니 오륙백년이 지나도 퇴패하지 않았습니다. 周의 말세에 크게 무도해져 천하를 잃자, 秦이 그 뒤를 이어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문학을 엄중히 금지해 도서를 갖지도 못하게 하고, 예의를 모두 저버려 듣기조차 싫어하며, 옛 성왕의 도를 완전히 말살하여 멋대로 방자하게 포학을 일삼은 까닭에, 천자가 된 지 14년만에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자고로 혼란으로 혼란을 구제한답시고 秦처럼 천하인민을 크게 패망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그 혹독한 영향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습속은 각박하고 악하며 인민은 어리석고 완고하여 온갖 저촉과 범죄를 무릅쓰고 항거하니, 누가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똥거름으로는 담장을 쌓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漢이 秦의 뒤를 이어받아 썩은 나무와 똥거름 담장 같으니, 비록 잘 다스려보고자 한들 어찌할 수 없는 격입니다. 法이 나오면 간사함이 생기고, 명령이 내려지면 사기가 횡행하니, 열탕으로 끓는 물을 식히고 땔감을 껴안고 불길에 뛰어드는 격이니, 갈수록 더욱 무익할 뿐입니다. 가만히 비유하자면, 거문고가 조율이 안 되면, 심한 경우 반드시 줄을 풀어 다시 긴장(更張)시켜야 비로소 탈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가 행해지지 않음이 심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통해서 다시 교화를 해야 이내 다스릴 수 있습니다. 更張을 해야 하는데 更張하지 않으면, 비록 훌륭한 악공이라도 잘 조율할 수 없으며; 다시 교화해야 하는데 다시 교화하지 않으면, 비록 위대한 현인이라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漢이 천하를 얻은 이래 항상 잘 다스리고자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잘 다스리지 못한 원인은, 마땅히 다시 교화(경장)해야 하는데 다시 교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古人이 ‘연못에서 물고기를 보고 부러워해보았자, 물러나서 그물을 엮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였으니, 지금까지 70여년 잘 다스리길 원한 정치에서 물러나 다시 교화함만 못합니다. 다시 교화하면 잘 다스릴 수 있고, 잘 다스리면 재해가 날로 사라지고 복록이 날로 몰려올 것입니다. 詩에 ‘마땅한 백성 마땅한 사람, 하늘에 복록을 받네!’라고 하였으니, 정치가 인민에게 적합하면 진실로 하늘에 복록을 받을 것입니다. 무릇 仁·誼·禮·知·信의 道는 王이 마땅히 닦고 신칙해야 하니, 五常을 잘 닦아 신칙하면 하늘의 보우를 받고 귀신의 영험을 누리며, 德이 방외까지 퍼지고 뭇 중생에까지 미칠 것입니다.”44)
앞서 기술한 삼강‘五常’의 윤리교화도 바로 진 멸망의 귀감을 현실화하는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거문고 줄의 ‘更張’에 비유한 혁신적 변법으로서 ‘更化’ 이론도 후세 변법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상이다. 이전까지 전 왕조 멸망의 역사적 귀감론은 통치자의 자각적인 주동적 정책입안이었다면, 동중서는 황제의 자문에 응하여 신하로서 대책을 조심히 건의하는 겸허하고 신중한 문체로 치밀한 이론구성을 한 점이 독특하다. 썩은 나무에 조각하고 퇴비로 담장 쌓아 보았자 금세 무너져 헛수고만 하게 된다는 공자의 비유를 인용하여, 얼굴만 바꾸는 ‘小人革面’처럼 사상누각 건축할 안이한 생각은 아예 버리고, 기초부터 완전히 새로 파는, ‘大人虎變’과 ‘君子豹變’의 근본적 혁명을 요구하는 改制 변법론인 셈이다.45)
정치사회적 혼란과 범죄의 횡행은 민생불안이라는 경제적 토대와 상호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동중서도 여러 선현처럼 잘 간파하였다. 무제가 대외정벌을 일삼고 안으로 공사를 일으켜 부역비용이 크게 늘고 민생이 부족해지자 동중서가 상소로 간언했다. 우선 春秋에서 오직 밀·보리와 벼가 익지 않으면 반드시 기록하는 이유가 聖人이 민생 필수 곡식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인데, 關中 인민이 밀·보리 경작을 기피하는 습속은 민생 식량의 결핍을 초래하니, 大司農을 통해 가을에 밀·보리를 제때 파종하도록 권농책을 건의하였다. 법가에서 부국강병책의 쌍두마차로 농경과 전쟁을 엄형중벌로 강제 독려했는데, 동중서는 민생안정과 국정치란에 직결하는 경제적 토대로서 식량재배를 권농 정책교화로 건의한 것이다. 나아가 조세 및 부역 등 경제제도 전반의 민생 개혁을 요청하였다.
“옛날에 과세는 십분의 일(什一)로 쉽게 바칠 수 있었고, 부역은 매년 사흘이라 쉽게 감당했습니다. 재력이 안으로 노인 봉양에 충분하고 밖으로 납세에 넉넉하며 아래로 처자식 사랑에 족하여, 인민들이 즐겨 복종하였습니다. 秦이 商鞅의 법을 적용해 帝王의 제도를 바꾸어, 井田을 제거해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되자, 부자는 논밭이 한없이 이어지고, 빈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어졌습니다. 시내와 연못의 이익을 독점하고 山林의 혜택을 단속하며, 황폐한 음란이 범람하고 호화사치로 경쟁하여, 도읍에 군주처럼 존귀한 자가 나타나고 향리에 公侯처럼 부유한 자가 속출하니, 서민들이 어찌 빈곤하지 않겠습니까? 군현에 매달 교대할 병졸(更卒)은 1달 더 근무한 뒤 교대하여 다시 中都官에 복역하는 병졸(正卒)이 되어야 하니, 한 해는 변방에 국경 수비하고 한 해는 부역에 종사해 옛날보다 30배나 무겁습니다. 논밭 조세와 인구 부역 및 염철 전매의 이익은 옛날보다 20배나 많습니다. 호족의 논밭을 경작하면 세금으로 절반을 바칩니다. 빈민은 항상 마소 옷을 입고 개돼지 음식을 먹습니다. 게다가 포학하고 탐욕스런 관리가 함부로 형벌 주륙을 일삼으니, 인민이 무료하고 수심에 차서 산림으로 도망해 도적떼가 되어 붉은 옷 입고 길거리에 출몰하여, 형옥재판이 해마다 수천·수만에 이릅니다. 漢이 흥성한 뒤로도 진의 적폐를 인습하여 못 고치고 있습니다. 옛날 井田法을 갑작스럽게 시행하긴 어렵지만, 옛날에 조금 가깝게 인민의 점유경작 면적을 제한하여, 빈자들이 부족하지 않게 보태주고 부호들의 토지겸병을 막아야합니다. 국가가 독점하던 염철 매매의 이익은 모두 인민에게 귀속시키되, 奴婢를 없애고 살인을 전횡하는 위세를 제거하며, 조세수취를 가볍게 하고 요역을 줄여, 인민 노동력을 조금 느슨히 풀어주어야 비로소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46)
동중서가 사망한 뒤 국가 재정낭비가 더욱 심해져 천하가 소진하자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기에 이르렀고, 무제가 말년에야 정벌전쟁을 후회해 “당장 급선무는 농사!”라고 권농 조서를 내렸다.47) 성현의 선견지명 간곡한 타이름을 무시한 오만한 권력은 후회막급하기 마련이다.
맹자는 일정한 직업(생산)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 없이 방벽·사치해져 죄악의 함정에 빠져 형벌로 그물질하게 되니 민생안정이 범죄예방에 절대 긴요하다고 역설하였는데,48) 동중서는 민생파탄과 유랑범죄의 직접 원인이 되는 빈부격차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자연생태계의 천부적 생존본능도구의 공평성으로 비유한다. “날카로운 이를 주면 뿔을 없애고, 날개를 달아주면 두 다리만 남기니, 큰 것과 작은 것을 겸할 수 없다.”49) 옛날에 봉록을 먹는 자는 말리를 얻지 않았다. 부귀한 자본과 능력으로 서민과 이끗을 다툰다면, 노비와 마소로 전택과 산업을 확장해 끊임없이 축적하여, 서민은 날로 크게 곤궁해지는데, 궁박하고 다급한 근심고통을 군주가 구해주지 않는다면, 서민은 삶이 괴로워 죽음과 범죄도 피하지 않으니, 바로 형벌이 번잡해지면서도 간사함이 그치지 않는 이유다. 공자가 “국가 위정자는 가난을 근심하지 않고 빈부격차를 염려한다.”고 말한 소이다. 그래서 국록을 받는 집안은 서민과 생업을 다투지 않는 청렴윤리가 절대 필요하다. 그래야 이익이 고르게 배분되어 서민도 넉넉해지는 上天의 진리이다. 어찌 현인 자리에서 서민 짓을 한단 말인가? 황급히 재리를 구해 항상 결핍을 두려워함은 서민의 뜻이고, 황급히 仁義를 구하여 인민을 교화하지 못할까 두려워함은 大夫의 뜻이다. 易에 “등에 지고 수레에 타니, 도적을 불러들이네.”라고 하니, 수레에 탄 군자가 소인처럼 등짐을 지면, 환난과 재앙이 반드시 이른다는 뜻이다.50)
동중서에 따르면, 현격한 빈부격차가 민생안정을 해쳐 범죄발생과 천하혼란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도록, 성인이 부자는 존귀함에 만족하고 교만에 이르지 않으며 빈자도 생계를 영위해 근심하지 않도록 설계한 “法度로 균형 있게 조절하면, 재화가 결핍하지 않아 상하가 평안하여 다스리기 쉬운데, 세상이 그러한 度制를 저버리고 자기 욕망만 좇으니… 다스리기 어렵다.” “하늘의 분수(天數)”에 근거해 상하 차등의 人道로 절도 있게 인민을 예방해도 인민은 오히려 義를 잊고 이끗을 다투어 패가망신하므로, 현명한 성인이 天理를 본받아 정한 “제방과 같은” ‘制度’는 ‘度制’ 또는 ‘禮節’이라 부르는데, 貴賤의 차등, 의복상 규제, 조정의 지위, 향당에 차례 등, 모두 감히 다투지 못하고 겸양으로 이끄는 통일된 법규범 질서이다. “만약 그 度制를 제거해 사람마다 자기 멋대로 통쾌하게 욕망을 부려 끝없이 방종하게 내버려둔다면, 인륜을 크게 어지럽혀 재화의 효용을 다하지 못하고 예절문화를 도입한 당초 의도를 잃게 된다.”51) 비록 고대 신분사회 등급질서를 전제로 한 예절제도이지만, ‘度制’는 각 신분과 개인의 권리의무 한계를 정한 당시의 배분적 정의의 기준으로서 법철학적 의의가 크며, 특히 통치계층이 적정한 분수와 정도를 넘어 인민을 지나치게 수탈하면 민생경제(생산력과 생산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는 자각적 경종을 울린 점은 진보적인 정치법사상으로 높이 평가된다.52)
한편, 동중서는 교화가 서지 못해 만민이 바르지 않아 범죄혼란이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예방 교화를 전담할 학교 설립을 주장하면서 홍수범람을 예방하는 제방에 비유한다.53)
“무릇 만민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 이익을 좇기 마련인데, 교화의 제방으로 막지 않으면 멈출 수 없습니다. 교화가 제대로 서서 간사함이 모두 그침은 제방이 완전함이요, 교화가 폐지되어 간사함이 속출하고 형벌로도 다스릴 수 없음은 제방이 붕괴한 것입니다. 옛날 왕들은 이러한 도리를 밝히 알아 천하를 다스림에 교화를 최대 급선무로 삼았습니다. 太學을 세워 국가를 교화하고 학교(痒序)를 설치해 향읍을 교화하여, 인민을 인의로 어루만져 물들이고 禮로 절제하니, 형벌이 몹시 가벼워도 금령을 범하지 않아서 교화와 습속이 아름답습니다.”54)
전반적인 경제흐름을 잘 통찰한 동중서의 상소는 역시 그가 이론적 관념론자가 아니라, 지행합일의 명실상부한 선비로서 경세치용의 실천적 애국애민 사상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휘황찬란한 선진적 혜안과 식견은 “노비 제거(폐지)”와 제후·왕이나 관리의 살생전횡 위세의 제거를 건의한 점이다. “노비 제거(폐지)”는 봉건왕조시대에 거의 전무후무한 유일의 혁명적 사상이자 상소일 텐데,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으며 형식적인 관례적 인용만 있는 듯하다. 링컨의 노예해방 남북전쟁과 청말 변법개혁 및 구한말 갑오경장을 통하여 비로소 노비제도가 폐지된 사실에 비추어보면, 무려 2천년이나 앞선 선견지명 혜안통찰의 인도주의 사상인데, 이를 주목하고 인정하여 칭송하는 글이 거의 없는 편이다.
물론 전통 왕조시대에 노비의 인권을 존중한 인도주의 정책과 법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대 관노비는 대개 범죄인·피정복민과 모반대역죄에 연좌되어 몰관한 자들이다. 漢代에 관노비를 서민으로 해방하는 사면조치를 시행하고, 노비 자신의 贖錢 납입에 의한 해방도 허용했다고 전한다. 서민이 된 구노비나 양민을 약취해 노비로 삼으면 중형에 처하고, 노비매매 시장을 가축과 함께 개설한 秦代의 폐습을 혁파하기 위해 漢律은 인신매매를 금지했다고 한다. ‘天心을 거역하고 人倫에 어긋나며 천지간 생명 중에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는 道義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후한 光武帝는 “천지간의 생명 중에 인간이 가장 존귀하므로, 노비를 살해한 죄는 감형할 수 없으며”, “노비를 감히 불로 지지는 자는 律대로 논죄하되, 불로 지짐을 당한 노비는 서민으로 해방한다.”는 칙령도 내렸다.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청말 沈家本은 인격 존중의 남상으로 극구 칭송하며, 그 뒤 이 정신을 계승한 군주가 없음을 애석하게 여기는데,55) 아쉽게도 동중서의 ‘노비제거’ 정책건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최근 들어 동중서의 천인감응 이론에 근거한 재이 대책과 均富安民 정책, 특히 限田 및 부세요역 감경과 함께 ‘去奴婢, 除專殺’ 건의를 사회구제의 관점에서 주목해, 그중 ‘去奴婢, 除專殺’은 그가 처음 제기한 진보적 구제 사상이라고 높이 평가한 견해가 나왔다.56) 아쉽게도 ‘去奴婢’는 노비를 ‘없애는’ ‘禁絶’이 아니라 ‘줄이는’ ‘減少’이며,57) ‘除專殺’은 주인이 자의로 ‘노비’를 살해함을 금지하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공감하기 어렵다. 이는 당시 절대군주 황제한테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금기사항이라고 단정하여, 史實과 문맥의 의미를 곡해하는 주관적 편견이다. 여기서 ‘去’나 ‘除’는 명백한 ‘제거’ ‘철폐’의 의미로 해석해야 맞다. 다만, 漢代 관노비가 관청에 예속해 ‘직책’명칭으로 불렸다면, 형식명분상 ‘노비’에 들지 않고 오로지 사노비에 국한하는 개념으로 쓰였을 수는 있겠다. 또 ‘除專殺’은 굳이 ‘노비’에 대한 자의적 살해에만 국한할 이유는 없으며, 당시 지방의 강력한 제후왕들이 양민을 몰살하거나 중앙조정에서 임명한 이천석 관리까지 함부로 남살하는 권력남용을 엄단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함께 담긴 건의로 보아야 맞다.58)
동중서는 ‘春秋’에 첫 문장 “春王正月”을 이렇게 풀이한다. “王道의 실마리는 正에서 얻는데, 正은 王 다음에 오고, 王은 春 다음에 온다. 春은 하늘(자연)의 행위이고, 正은 王의 행위이니, 왕은 위로 하늘의 행위를 받들어 아래로 자기 행위를 바르게 하니, 王道의 실마리를 바르게 함을 뜻한다.” 즉, 왕이 하고 싶은 일은 하늘에서 단서를 구해야 한다.59) 그는 천지음양사시의 원리로 덕교와 형정의 관계를 설명한다.
“天道의 위대함은 음양에 있으니, 陽은 德이고 陰은 刑이며, 刑은 살륙을 주관하고 德은 생명을 주관한다. 양은 늘 한여름에 거하여 생육과 성장을 일삼고, 음은 늘 한겨울에 거하여 공허하여 쓸모없는 곳에 쌓인다. 하늘이 德에 맡기지 刑에 맡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늘(자연)의 순리를 보면, 양은 위로 떠올라 빛(에너지)을 널리 베풀어 한해 수확(歲功)을 주관하고, 음은 아래로 기어들어가 때때로 나와 양을 보좌한다. 陽이 陰의 보조를 받지 못하면 혼자서는 한해를 이룰 수 없으나, 끝내는 陽으로써 한해(歲)를 이루는 것이 하늘 뜻(天意)이다. 王은 하늘 뜻을 받들어 정치에 종사하므로, 德教에 맡기고 형벌에 맡기지 않는다. 刑에 내맡겨 세상을 다스릴 수 없음은, 마치 陰에 맡겨 한해를 이룰 수 없음과 같다. 형벌에 내맡긴 정치는 하늘에 순응하지 않기에, 先王께서 꺼려한 것이다. 지금 先王이 德教를 행한 관직을 폐지하고, 오로지 법 집행 관리한테 내맡겨 인민을 다스리니, 이는 형벌에 내맡긴다는 뜻 아닌가? 공자가 ‘교화하지 않고 주륙하면 학정이다.’고 말했는데, 아래서 학정을 시행하면 德教가 사해에 펼쳐지기 어렵다.”60)
여기서 유명한 ‘前德而後刑’과 ‘大德而小刑’의 명제가 나왔는데, 더 유명한 ‘德主刑輔’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동중서는 “나라에 道가 있으면 비록 형벌을 부가해도 형벌(집행할 일)이 없지만, 나라에 道가 없으면 비록 죽여도(사형으로 위협해도) 이길 수 없다.”는 공자 말을 인용하여, 道의 존재 여부는 德行 여부에 달려있다며 덕정을 형정에 훨씬 우선하여 중시한다.61) 이는 “정치명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요행히 빠져나가고도 부끄러움이 없는데;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부끄러운 줄도 알고 또 바르게 된다.”는62) 말과 같은 의미로, 漢代까지만 해도 論語에 수록되지 않은 공자 말들이 많이 전승된 반증으로 보인다. 동중서는 공자 사상을 충실히 계승하여, 덕정과 형정의 主從관계를 특히 천인합일 관점에서 반복해 역설하는데, 도처에서 누차 천지·음양·사시의 자연법칙 원리에 빗대어 ‘천인감응’의 당위성과 정통성으로 ‘덕주형보’와 ‘大德小刑’ ‘前德後刑’을 강조한다.
특히, 형과 덕을 음양과 사시 天氣 운행으로 비유하는 언론은, 동중서 법사상의 철학적 이론기초로서 매우 중요하여 춘추번로 여러 편에 자주 등장하는데, 간략한 도표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63)
| 春(氣) | 暖 | 愛(氣) | 生物 | 生 | 喜 | 四時之行 | 父子之道 | |
| 秋(氣) | 淸 | 嚴(氣) | 成功 | 收 | 憂 | 天地之志 | 君臣之義 | |
| 夏(氣) | 溫 | 樂(氣) | 養生 | 養 | 樂 | 陰陽之理 | 聖人之法 | |
| 冬(氣) | 寒 | 哀(氣) | 喪終 | 藏 | 悲 | 以夏養春, 以冬藏秋 | 大人之志 |
요컨대, 양은 덕이고 음은 刑이니, 刑은 德에 반하지만 德으로 나아가 순응하니 임기응변의 權이다. 즉, 형은 덕(經)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權이다. 하늘은 經을 드러내고 權을 숨기며, 德을 앞세우고 刑을 뒤로 하며, 德을 크게 중시하고 刑을 작게 경시하는 뜻이며, 經을 우선하고 權을 뒤로하며, 양을 귀중시하고 음을 천시함이다. 군주는 하늘이 친근함을 친근하고 하늘이 멀리함을 멀리하며, 하늘이 크게 중시하는 것을 크게 중시하고 하늘이 작게 경시하는 것을 작게 경시해야 한다. 하늘의 도수는 양과 덕에 힘쓰고, 음과 刑에 힘쓰지 않는다. 刑에 맡겨서는 세상을 성취할 수 없으니, 음에 맡겨서는 한해 농사를 이룰 수 없음과 같다. 정치를 함에 형벌에 맡김은 하늘을 거역한다(逆天)고 말하니, 王道가 아니다.64) 여기에서 ‘大德而小刑’과 ‘務德而不務刑’이 나온다.
동중서가 보기에, 春氣는 사랑스럽고 秋氣는 엄하며, 夏氣는 즐겁고 冬氣는 슬프다. 사랑의 기운은 만물을 낳고, 엄한 기운은 공을 성취하며, 즐거운 기운은 생명을 성장시키고 슬픈 기운은 상실로 끝나니, 하늘의 뜻(자연섭리)이다. 봄에 기쁘고 여름에 즐겁고 가을에 우울하고 겨울에 슬프니, 죽음을 슬퍼하고 삶을 즐거워하여, 여름이 봄을 성장시키고 겨울이 가을을 저장함은 大人의 뜻이다.65) 하늘에도 희노애락의 운행이 있고, 인간에도 춘추동하의 기운이 있으니, 천인합일의 부류를 일컫는다. 양에 친근하고 음에 소원하며, 德에 맡기고 刑을 멀리하는 이치에서, 하늘의 뜻(자연섭리)은 항상 음을 빈 곳에 두고 조금씩 꺼내 보조로 쓴다. 그래서 “刑은 德의 보필이고, 陰은 陽의 보조이며, 陽은 한해의 주인공이다.”66) 여기서 “刑者, 德之輔”가 그 유명한 ‘德主刑輔’의 근원 출전이다.
그에 의하면, 양은 나와서도 들어가도 튼실한 자리인데, 음은 나와서도 들어가도 텅 빈 자리이니, 하늘이 양에 맡기고 음에 맡기지 않으며, 德을 좋아하고 刑을 좋아하지 않는다.67) 천지에는 항상 1음1양의 도리가 존재하니, 양은 하늘의 德이고, 음은 하늘의 刑이다. 하늘에도 희노의 기운과 애락의 마음이 있어, 사람과 서로 부합하여 비슷하니, 하늘과 인간이 하나(天人合一)이다. 양이 음보다 훨씬 많아 한해 공을 이루듯이, 德이 刑보다 훨씬 중후하게 베푸는 것이다. 하늘의 음기 운행을 보면, 조금만 취해서 가을의 공을 이룰 뿐, 그 나머지는 모두 겨울에 귀속시켜 쌓아 저장한다. 聖人의 음기 시행도 조금만 취해서 엄숙함을 세울 뿐, 그 나머지는 모두 喪에 귀속시키니, 喪도 사람의 겨울기운인 것이다. 고로 사람의 太陰은 刑에 적용하지 않고 喪에 적용하며, 하늘의 太陰은 만물에 적용하지 않고 텅 빈 空에 적용한다. 空도 喪이고 喪도 空이라, 그 실질은 하나이니, 모두 잃고 죽어 없어지는 의미이다.68)
동중서는 하늘이 양에 친근하고 음에 소원하여, 德에 맡기고 刑에 맡기지 않는다고 본다. 하늘이 양의 따스함으로 만물을 낳고, 땅이 음의 맑음으로 성장시키니, 따듯하지 않으면 나지 않고 맑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로를 비교하자면, 따스함과 더위가 백이라면 맑음과 추위는 하나이니, 德敎와 刑罰의 관계도 이와 같기에, 성인은 사랑이 많고 엄숙함이 적으며, 그 덕이 중후하고 형벌이 간소하여, 하늘의 도에 짝(배합)한다고 한다.69)
이렇듯, 하늘의 운행에 부응한 성인의 정치에서, 慶은 따스한 봄, 賞은 더운 여름, 罰은 맑은 가을, 刑은 추운 겨울에 각각 해당한다고 동중서는 말한다. 慶賞罰刑은 王이 덕정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慶賞罰刑 四政과 春夏秋冬 사시는 부절처럼 딱 합치하여, 왕은 하늘에 짝(배합)한다고 한다.70) 한편, 천지사시의 도덕적 속성으로 왕정의 경상형벌에 공평무사한 도덕성을 강조한 비유가 특기할 만하다.
“하늘에는 和、德、平、威가 있으니, 봄은 하늘의 和, 여름은 하늘의 德, 가을은 하늘의 平, 겨울은 하늘의 威이다. 하늘의 질서는 반드시 먼저 온화한 연후에 德이 피어나고, 반드시 먼저 평정한 연후에 위엄이 피어난다. 和가 아니면 慶賞의 德이 필 수 없고, 平이 아니면 형벌의 위엄이 필 수 없다. 또 德은 和에서 생기고, 위엄은 공평에서 생기니, 不和하면 德이 없고, 불공평하면 위엄이 없다. 이러한 하늘의 道는 통달한 자가 알아볼 수 있다. 내가 비록 유쾌하고 기쁠지라도, 반드시 먼저 온화한 마음으로 합당함을 구한 다음 慶賞을 발행하여 德을 세워야 하며, 비록 분하고 노여워도 반드시 먼저 평정한 마음으로 행정절차를 구한 다음 형벌을 발동하여 위엄을 세워야 한다. 항상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늘의 덕(天德)’이라 부르고 天德을 행하는 자를 聖人이라 부른다.”71)
그에 따르면, 희노애락 감정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性命이니, 하늘의 기운인 따듯함·맑음·추위·더위가 제때 저절로 발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봄에는 어짊을 닦아 착함을 구하고, 가을에는 의로움을 닦아 혐오를 구하며, 겨울에는 형벌을 닦아 청명함을 구하고, 여름에는 德을 닦아 관대함에 이르니, 이것이 천지에 순응하여 음양을 체득하는 성인의 덕정이다.72)
이렇듯, 동중서의 덕주형보 법사상은 천인합일 천인감응 이론체계 속에서 철저하게 천지·음양·사시의 자연운행법칙과 상관하여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춘추번로 9편 제목에 ‘오행’이 들어가지만, 법사상과 관련해서는 ‘음양’에 비해 비중이 훨씬 작다. 물론 禮記 月令 편이나 呂氏春秋처럼, 당시 오행이론에 근거하여 오행의 변괴와 刑政의 관계를 언급한 내용은 일부 나온다. 예컨대, 무릇 물은 법을 집행하는 司寇인데, 법 집행이 편파적이고 불공평하며 법을 빙자해 사람을 처형하면, 司營이 그를 주륙한다. 그래서 흙이 물을 이긴다(土勝水)고 말한다.73) 물(水)은 겨울이니, 지극한 음을 저장한다. 성과 마을 문을 닫고 대수색을 벌여 형벌을 단행하고 죄인을 체포하며, 관문과 교량을 단속하여 밖으로 이사하지 못하게 막는다.74) 오행에 변괴가 닥치면 마땅히 덕으로 구제해야 하니, 천하에 덕을 베풀면 허물이 사라진다. 德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3년이 안 되어 하늘에서 돌비가 내린다. … 이는 법령이 느슨해지고 형벌이 시행되지 않음이니, 이를 구제하려면 감옥에 갇힌 죄수를 긍휼히 여기고 간사한 도적을 심판하며 중죄인을 주륙하고 닷새간 수색한다.75) 요컨대, 왕의 통치가 유능하면 정의가 바로서고, 정의가 바로서면 秋氣가 제자리를 얻는다. 고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가을을 주관한다. 秋氣가 비로소 숙살하면, 왕은 작은 형벌을 시행하고, 인민이 범하지 않으면 禮義가 이루어진다.76)
동중서의 덕주형보와 예악교화 사상은 비록 예악과 덕정의 주도 아래 형벌의 보조적 수단만 인정한 것이지만, 거꾸로 보면 형벌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음이 없이 양만으로 세공(歲功)을 이룰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듯이, 동일한 논리맥락에서 형벌 없이 예악덕정만으로는 왕도정치를 원만히 성취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주 武王이 대의로 殷紂를 평정하고 周公이 예악을 제정해 문화를 이루어, 성왕강왕의 융성 시기에 40여년 감옥이 텅 빈 것은 점진적 교화와 인의의 영향이긴 하나, 동중서는 분명히 “聖王이 천하를 다스림에 어려서 학문을 익히고 자라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며, 爵禄으로 덕행을 함양시키고 형벌로 죄악에 위엄을 보여, 백성들이 예의를 분명히 알고 윗사람 범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게 한다.”고 말하여, 성왕조차도 형벌의 위하적 범죄예방 효과를 활용했다는 역사인식을 피력하고 있다.77)
심지어 법가에서 절대 군주권 확립을 위하여 강조하였던 法·術·勢의 통치방도까지 적극 제시하며, 이끗을 좋아하고 해악을 싫어하는(好利惡害) 감정을 역이용한 권세 강화의 권모술수도 필요하다고 긍정한다. 그에 따르면, 인민이 좋아함이 없으면 군주가 권세를 누릴 수 없고, 인민이 싫어함이 없으면 군주가 두렵게 할 수가 없다. 군주가 권세와 위엄이 없으면 인민의 언행을 금지·통제할 수 없고, 서로 비등한 세력이 되어 복종할 리 없다. 그래서 성인은 천지자연의 性情과 感官의 호오에 착안하여, 매혹적인 온갖 맛과 빛깔과 소리로 입·눈·귀를 유인하되, 관직과 작록을 설치해 존비귀천에 차등을 두고 영예와 모욕을 확실히 대비시킨 상벌제도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다. 인민이 좋아하는 이익으로 포상하여 권장하고, 싫어하는 해악으로 형벌을 삼아 두렵게 위협한다. 권장과 위협이 통해야 통제가 가능하니, 통제란 좋아함을 포상해 권장하되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싫어함을 형벌로 위협하되 과도하지 않는다. 특히 포상과 형벌이 과도해 자칫 상벌 담당관이 그 권한으로 민심을 얻고 위세를 부리면 군주는 백성들한테 실권과 은덕이 없고, 천하가 서로 원망하고 도적질하게 된다고 그는 강조한다.78)
“성인이 인민을 통제함에는 욕망을 부리되 지나치지 않게 절제하며, 돈독하고 순박하게 교화하되 완전한 무욕에 이르지 않게 한다. 무욕과 욕망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군주의 도가 온전해진다. 나라가 나라인 까닭은 德이 있어서고, 임금이 임금인 까닭은 권위가 있어서다. 德은 공유할 수 없고, 권위는 나눠가질 수 없다. 德을 공유하면 은혜를 상실하고, 권위를 나눠가지면 권력을 잃는다. 권력을 잃으면 군주는 비천해지고, 은혜를 상실하면 인민은 흩어진다. 인민이 흩어지면 국가가 혼란해지고, 군주가 비천해지면 신하가 배반한다. 따라서 군주는 그 덕을 고수해 인민이 달라붙게 하고, 그 권력을 확고히 장악해 신하를 바로잡아야 한다.”79)
그는 군주가 無爲의 자리에서 不言의 교화를 시행하여, 소리 없고 모습 없이 고요히 하나에 집중해 국가의 원천(샘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국가를 몸으로 삼고, 신하로 마음을 삼아서, 말소리의 메아리와 모습의 그림자를 허심탄회하게 관조해 상벌의 법을 시행하면, 모든 신하가 질서정연하게 각자 직분을 다하고 훌륭한 공적을 이루어 좋은 명예를 현양하려고 다투기 때문에, 군주는 유유자적 자재하면서 功은 신하에게서 나오고 명예는 군주한테 귀결하는 무위자연 통치술이 펼쳐진다는 것이다.80) 이쯤 되면 전국부터 진시황 때까지 성행한 법가의 심리강제 상벌이론이나 한초 유행한 황로학파 남면통치술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81)
실제로 황로학은 로자 도덕경에서 직접 연원하였으며,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도 ‘解老’편과 ‘喩老’편에서 도덕이론을 깊이 해석하고 그 바탕 위에서 法과 術數와 權勢의 삼위일체 종합 법치주의를 완성한 것인데, 老子 도덕경은 5천여자의 간명한 문자에 심오한 함축적 의미를 담았는바, 도덕진리 자체가 음양·動靜·剛柔 등 상대적 대우범주의 변증법적 통일로 이루어진 것인지라, 본디 양면성을 온전히 갖추고 주관적 관점과 시대적 수요에 따라 다채롭게 해석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머금고 있다. 老子가 도의 객관·중립적 담박한 무위자연 본성을 관조하였다면, 춘추 말엽 공자는 현실사회 통치교화의 작용 관점에서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덕과 인의예악 교화의 필요성에 치중하였고, 전국 초기 맹자는 공자 사상을 충실히 계승해 부연하였다. 순자에 이르면 겸병통일 전쟁의 태풍과 변법개혁의 급류 속에서 공맹의 순진한 유학만 가지고는 시대풍조와 너무 동떨어진 무용지물이 되겠기에, 성악설을 부각해 인위적 禮와 法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그 제자인 李斯와 한비자의 법가사상에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러한 철학사상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동중서는 老子의 도가와 황로남면술은 물론 법가의 법술세 사상과 전국 이래 성행한 음양오행이론까지 종합적으로 흡수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제군주론의 철학사상적 기초로서 새로운 ‘獨尊儒術’을 창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82) 물론 ‘음양’은 주역의 핵심범주이고, ‘오행’은 서경 홍범구주 가운데 첫 번째 으뜸 범주이니, 유가 철학사상의 핵심근간이다. 음양가는 두 범주를 결합해 천(자연)-인(사회) 관계의 이론 기초로 활용한 것이다. 어쨌든, 군주는 하늘의 강건함을 본받아 견고하고 강단 있는 통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동중서의 통치론은 이러한 시대맥락에서 이해된다.
“군주는 하늘형상(천문현상, 상징)에서 법을 취한다. 존귀한 작위로써 국민을 신하로 삼아 다스리니 인자하고, 은밀하게 깊이 거처하니 신비하며, 어질고 유능한 자를 임명해 사방을 돌보도록 부리니 현명하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수여해 어진 이와 어리석은 자를 차등 대우하니 위계가 분명하며, 현인을 불러 팔다리로 삼으니 강단 있고, 진실한 업적공과를 고찰하여 평가하니 세상풍속이 바로 서며, 유공자는 승진하고 공로가 없으면 퇴출하니 상벌이 공정하다. 하늘은 그 도를 집행해 만물의 주인이 되고, 군주는 항상적 법도를 집행해 국가의 주인이 된다. 하늘은 강건하지 않을 수 없고, 군주는 견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하늘이 강건하지 않으면 별들의 운행이 혼란해지고, 군주가 견고하지 않으면 사악한 신하들이 관직을 어지럽힌다. 별들이 혼란해지면 하늘이 망하고, 신하가 혼란해지면 군주가 망한다. 그러므로 하늘은 기운을 강건히 유지하기에 힘쓰고, 군주는 정치를 견고히 행하기에 힘쓴다. 강건하고 견고한 연후에 陽道가 명령을 통제하게 된다.”83)
Ⅵ. 덕례 교화의 대외정책 화친론
동중서의 덕주형보 예악 교화론은 대외정책에서도 회유무마 정책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한초 文景之治 덕분에 사회경제적 안정과 풍요를 누리며 무제가 적극적 대외정벌에 나서는 가운데, 특히 북방 흉노에 대한 방책이 조정에 뜨거운 의론주제이기도 하였다. 사마천이 흉노에 투항한 李陵을 변호한 죄로 사형을 가까스로 면하고 궁형을 당해 발분하여 사기를 저술하였듯,84) 흉노에 대한 견해는 아주 민감한 정치외교군사 문제였다.
반고에 의하면, 漢 고조 때 劉敬, 吕后 때 樊噲、季布, 문제 때는 賈誼、朝错, 무제 때 王恢、韓安國、朱買臣、公孫弘、董仲舒 등 훌륭한 충신 책사들이 대외정책에 관하여 서로 쟁론하였는데, 대강 총평하자면 문관·유생들은 和親 방안을 고수하고 장군·무사들은 정벌을 주장하였다. 흉노와는 문덕을 닦아 화친한 때도 있고 무력으로 정벌한 때도 있으며, 비굴하게 섬긴 때도 있고 위엄으로 굴복시켜 신하로 삼은 때도 있다. 화친론은 천하가 막 안정되어가던 즈음 平城의 난을 만나 劉敬이 和親하고 예물을 보내 변방을 안정시키자고 주장한 데서 비롯한다. 혜제와 려후 때도 그대로 준수하고 문제 때는 關市를 개설해 漢女를 처로 주며 후한 뇌물을 보태 해마다 천금이나 보냈으나, 흉노는 교만해져 약속을 어기고 변경을 자주 침해하였다. 이에 文帝는 중년에 의연히 발분하여 몸소 군복을 입고 친히 말안장을 갖추어 六郡의 양민 군사들과 함께 上林에서 말을 달리며 활쏘기를 하고 전술진법을 강습하였다. 천하에 정예 병력을 모아 廣武에서 열병하며 馮唐에게 자문하고 장수를 논하면서 장탄식하였는데, 반고는 화친이 무익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평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중서는 4세대 일을 목도하고 화친론을 계승하면서 더욱 발전시켰다.
“仁義는 군자를 움직이고, 이익은 탐욕스런 소인을 움직인다. 흉노 같은 자들은 仁義로 설득할 수 없으며, 오직 후한 이익으로 기쁘게 하여 하늘에 묶어둘 수 있다. 후한 재물을 주어 정신 팔리게 하고, 하늘에 맹서해 약속을 굳게 지키게 하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인질로 삼아 그 마음을 묶어 둔다면, 흉노가 비록 침입하고자 하나 중후한 이익을 어찌 잃을 것이며, 맹세한 하늘을 어찌 속일 것이며, 사랑하는 아들 인질을 어찌 죽게 내버려둘 것인가? 무릇 재화를 좀 모아 뇌물을 주어 봤자 三軍의 전쟁비용보다는 훨씬 적고, 성곽을 견고하게 쌓아 지켜봤자 올곧은 선비의 약속보다 특별히 낫지 못하다. 가사 변경에 성곽을 지키는 백성들 부모형제가 허리띠를 끌러놓고 어린애들이 칭얼대며 젖을 먹으며, 오랑캐 병마가 만리장성을 엿보지 않고, 화살격문과 봉화가 중국에 나돌지 않는다면, 천하에 이보다 평안한 방편이 또 있으랴?”85)
이러한 동중서의 의론에 대해, 반고는 당시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후세에도 결함이 있다고 폄하한다. 흉노 인민이 漢에 와서 투항하면, 单于도 곧장 漢의 사절을 억류해 보복할 정도로 오만한 심보였는데, 그들이 사랑스런 아들을 인질로 보내길 기대함은 당시 정황에 맞지 않고, 만약 인질을 잡지 않고 빈말로 화친을 약속한다면, 효문제의 회한을 답습하고 흉노의 끊임없는 사기행각을 조장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변방성곽 방어에 지략이 뛰어난 무신을 선발 배치하여, 방어용 전술적 도구들을 잘 갖추고, 긴 창과 억센 활과 병기들을 마련해 대비해야 하거늘, 믿을 만한 변방 대비책이 고작 백성들 재화를 거둬 멀리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치는 것이라면, 이는 백성을 착취해 도적한테 바치는 꼴이니, 달콤한 말을 믿고 빈 약속을 지키면서 오랑캐 병마가 엿보지 않길 바란다면, 이미 지나친 허황된 믿음이라는 것이다.86)
반고의 총평은 오만무도한 중화제국주의 근성에서 비롯한 전형적인 현실적 강경론이다. 무제 당시에 비록 정벌로 승리하여 노획이 많았지만, 병사와 군마의 상실도 그에 상응하여 상당하였다. 비록 河南의 벌판을 개척하고 朔方의 군현을 설치하였지만, 또한 造陽 이북 9백여리를 포기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불사 강경론자들은 대개 전쟁으로 인한 정치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얽힌 경우가 많다. 반고는 “백성 재화를 착취해 변방 도적한테 예물 바치는 굴욕”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논조인데, 그러면 그 막대한 전쟁비용과 사상자들의 희생은 백성들이 감당해도 좋은가?
옛날 문왕의 조부 고공단보가 邠에 거주하는데, 狄人이 침입해와 폐백으로 섬겨도 면할 수 없고, 犬馬로 주옥으로 섬겨도 면할 수 없자, 자기 부족 원로들한테 ‘狄人이 욕심내는 것은 우리 토지요. 듣자니 군자는 사람을 봉양하는 수단(토지)으로 말미암아 사람(목적)을 해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어찌 임금 없는 게 걱정이겠소? 내가 떠나겠소!’ 라고 말하고는 邠을 떠나 梁山을 넘어 岐山 아래 거했는데, 邠 사람들이 어진 사람 놓칠 수 없다고 감탄하며 구름처럼 따라왔다. 그 어진 마음과 덕행이 周 왕조 창업의 기반이라고 역사는 전한다.87)
염구는 季氏의 가신이 되어, 간언으로 계씨의 德은 개선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조세수취를 전보다 배로 늘렸다. 그래서 공자가 ‘求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는 북을 울려 그를 공격해도 된다.’고 힐난했다. 이에 맹자는 임금이 仁政을 시행하지 않는데 더 부유하게 만드는 자들은 모두 공자한테 버림받았다며, “군주를 위해 강경한 전쟁론을 주장하여, 전쟁으로 땅을 빼앗고 인민을 죽여 벌판을 가득 채우며, 전쟁으로 성을 빼앗고 인민을 죽여 성을 가득 채운다면, 이는 토지를 거느려(땅한테) 사람고기를 먹이는 꼴이니, 그 죄가 죽음(사형)으로도 모자란다.”고 성토하였다. 전쟁을 잘하는 손빈·오기 같은 병가가 최고형에 해당하고, 소진 장의 같은 합종연횡론자가 그 다음 형에, 황무지를 개간해 토지경작으로 농경과 戰功을 독려하는 상앙 같은 법가는 그 다음 형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88)
한편, 춘추필법에 따르면, 흉년에는 신축은 물론이고 기존 건축물도 수리하지 않으니, 인민을 괴롭히지 않으려는 의도다. 인민을 괴롭힘도 싫어하거늘, 하물며 인민을 상해하고, 더더구나 인민을 죽인단 말인가? 흉년에 기존 건축물 수리를 힐난하고, 새 성읍 건설은 기록조차 않는데, 인민을 조금 해치면 조금 싫어하지만, 크게 해치면 죄악이 커서 아예 감춰버린다. 그런데 인민을 대량 살상하는 전쟁정벌은 얼마나 막대한 죄악인가? 무력에 내맡겨 인민을 전쟁에 내몰아 살상으로 잔인하게 해치는 죄악보다, 만일을 대비해 군대나 형벌을 설치는 하나 사용하지 않고 仁義로써 복종시키는 덕례 교화를 동중서는 절대 지지한 것이다.
“무릇 덕망이 측근도 친근하게 못하고, 문덕이 먼 곳 사람이 찾아와 귀순하게 못하면서, 결단코 무단으로 전쟁정벌을 벌이는 자는 진실로 춘추에서 몹시 질시하니, 이는 모두 불의여서 비난하는 것이다.”89)
동중서가 무제의 대외 정벌전쟁을 극력 반대하고 만류한 철학사상은, 춘추에 정의로운 전쟁이 없다는 맹자의 견해를 전폭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공맹의 仁政과 민본을 충실히 계승한 정통 유학자로서, 명실상부한 인도주의 철학사상을 현실정치에 지행합일로 실천궁행하고자 노력한 성현이었다. 특히 ‘노비제 폐지(去奴婢)’ 건의는 공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Ⅶ. 春秋折獄과 原心定罪의 司法
‘덕주형보’인지라 덕과 인의예악의 교화가 훨씬 중요하고 형정은 말단지엽이지만, 형정을 관장하는 사법재판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박탈하는 직접적 위협인지라, 민심의 득실에 결정적 요인으로서 때론 왕권과 국가의 흥망성쇠에 직결된다. 이점을 동중서도 잘 인식했다.
“절옥이 옳고 합당하면 도리가 더욱 분명해지고 교화가 더욱 널리 시행되지만, 절옥이 그르고 부당하면 불합리와 부조리가 대중을 미혹시켜 교화에 오히려 방해만 된다. 교화는 정치의 근본이고, 절옥은 정치의 말단지엽이라서, 두 정사의 영역과 비중은 서로 다르지만, 그 작용은 한가지인지라, 상호 보완하여 순조로워야 한다. 그래서 군자가 이들을 모두 중시한다.”90)
위정자가 민사 聽訟과 형사 折獄을 삼가 잘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데, 춘추공양학을 중심으로 천인합일 재이론을 펼친 동중서는 의심스러운 중대한 재판에서도 ‘춘추’의 經義와 정신에 의거한 명쾌한 판결로 유명하였다. 춘추결옥과 원심정죄에 대하여는 역대 오해와 비난이 숱하게 쏟아져 왔는데, 동중서 원전과 본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 크다.
“春秋에서 聽獄은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뜻(志)을 살펴낸다. 뜻이 사악한 경우 (범죄)완성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죄악의 수괴(주범, 주모자)는 죄와 형벌을 특별히 가중하며, 본래 정직한 자는 감경으로 논죄한다. 이러한 까닭에 逢丑父는 마땅히 참수해야 하고, 轅濤塗는 체포해서는 안 되며, 魯季子는 慶父를 추격했고, 吳季子는 闔廬를 풀어주었다. 이 네 사건은 罪는 같은데 논죄(형벌)는 다르니, 그 본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둘 다 三軍을 기만했으나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았으며, 둘 다 군주를 시해했으나 누구는 주륙하고 누구는 주륙하지 않았다.”91)
이것이 ‘原心定罪’로 유명한 ‘춘추절옥’ 또는 ‘춘추결옥’인데, 동중서의 문헌 표현에 의하면 ‘春秋聽獄’과 ‘原志定罪’라 할 것인바, 후대 문헌기록을 통해 일반 관용어로 형성된 것이다. 춘추절옥은 동중서의 독창적 발명일 수 있으나, 진시황 분서갱유 이후 잿더미와 흙벽 속에서 찾아낸 경전의 복원 과정에서 성행한 학풍의 결과 자연스레 형성된 시대적 산물로 보인다. ‘춘추’ 3傳 가운데 상세한 사실관계에 치중한 좌전이나 경전해석에 주력한 곡량전과 달리, 공양전은 춘추필법의 대명사로 알려진 공자의 ‘微言大義’를 위주로 역사에 담긴 성인의 ‘정신’을 밝혀 선양하였는데, 이점이 정통 유학의 계승자로서 자임한 동중서의 ‘독존유술’ 주창과 춘추절옥 성행의 본질적 요인이 되었다.92)
歐陽生한테 尙書를 배우고 박사가 되어 孔安國한테 수업을 받은 兒寬은 무제 때 廷尉 張湯의 휘하에서 “옛 법의 정신으로 의심스러운 옥안을 잘 판결”하여 칭송을 받고 어사대부까지 올랐다고 전한다.93) 또 昭帝 始元6년(기원전 81) 각지 현량문학들을 소집하여 어사대부와 조정에서 벌인 정책현안토론회의 내용을 기록한 桓寬의 鹽鐵論에는, “春秋에 형사재판(治獄)은 마음을 의론해 죄를 정하니, 뜻이 선량하면 법에 어긋나도 면죄해주고, 뜻이 사악하면 법에 부합해도 주륙하였다.”94)는 현량문학의 주장이 실려, 당시 한대 춘추절옥과 ‘論心定罪’의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편, 후한 말 董卓의 혼란으로 왕실이 동천하면서 진시황 분서갱유 못지않은 참혹한 변란으로 문물전장이 모두 불 타버려 許都에서 惟新을 도모하는 가운데, 建安元年 應邵가 律令을 刪定하여 漢儀를 편찬해 바치며, “載籍은 嫌疑를 결단하고 是非를 밝히며 포상과 형벌의 적정한 중용 기준을 제시하여 후세인들에게 길이 귀감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데, 膠西 승상을 지낸 동중서가 연로하여 질병으로 사직해 귀향한 뒤에도, 조정에서 매번 중요한 의심스러운 형정 의안이 생기면 여러 차례 廷尉 張湯을 파견하여 정위가 친히 누추한 마을거리를 찾아가 득실을 자문하여 춘추결옥 232사례가 이루어진바, 매번 경의 정신으로 대답하여 상세하게 의론”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였다.95)
동중서의 춘추결옥 232사례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른 문헌에 6건 정도 인용되어 전해질뿐 모두 산실되어 매우 안타깝다.96) 객관적 행위 결과보다는 주관적 심정 동기를 중시하는 춘추결옥의 정신은 그의 재이론과 함께 후대 동아시아 전통왕조의 사법실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근대화 이래 서유럽 형법사상에 비추어 신랄하게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역사발전론 관점에서 고대 법제도와 문화를 보면 미개하고 전근대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 한계와 시대적 제약을 감안하고, 동서양과 고금의 법원칙과 철학정신이 상이한 데서 비롯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97) 더구나 근대 서유럽 개인주의의 궁극적 뿌리가, 죄와 도덕을 판단할 때 행위 중심의 전통 종교가 아니라 동기에 의해 따지라고 설파한 예수 가르침에 있다고 여기는 에밀 뒤르켕이나 막스베버의 견해에 대비해본다면,98) 고대 동양의 원심정죄 사법원칙은 시대를 초월한 선진 법사상임을 알 수 있다.99)
혹자는 “더러 죄가 같은데 의론(형벌)이 달라서, 간사한 옥리들이 이를 기화로 뒷거래를 하여, 살리고자 하면 감면으로 의론하고, 죽이고자 하면 사형으로 비부해, 의론하는 자들이 모두 원통하게 상심하였다.”는100) 한서 형법지 기록이 바로 논심정죄의 동기론과 관련되며, 무고한 인민을 임의로 처형하면서 지배층의 죄책은 면죄부를 주는 자의적인 ‘이현령비현령’ 재판관행을 낳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101) 한편, 전제권력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에 빌미를 준 해악도 크지만, 혹리들의 잔인하고 참혹한 형벌이 유행하던 시기에 객관상 인민에 대한 형벌의 감경을 유도하여 적지 않은 인명을 구활한 공로도 크다는 공평한 평론도 눈에 띈다.102)
살피건대, 동중서는 명백히 ‘법에 의한 형벌’을 주장하고, 법의 상징인 물처럼 執法도 저울대 형평을 이루어 청렴·공평하여 뇌물이나 청탁을 받지 않고 오직 법에 의거해 소송을 심리·판단하여 편파적인 阿曲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공자가 魯 司寇가 되어 단옥할 때 대중과 함께 인정과 사리에 부합한 판결로 죽는 자도 원한이 없고 산 자도 원망이 없는 경지를 이상으로 여겼다.103) 또“사실관계를 기본으로 그 뜻을 살피는” 전제에서, 구체적 범죄사실에 적용할 율령이 없는 疑案에 대하여 조정의 자문에 부응하여 춘추 경의를 인용해 판단한 것으로, “결코 법률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단지 법률조문의 적용에 유가가 제창한 人情머리가 풍부하게 스며 ‘情理’에 합당하고, 그 결과 經義를 인용한 그 판결은 모두 형벌을 감면한 것이다.”104)
그리고 이는 근대 사법의 기본원칙과 절차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재판이다. 예컨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條理에 의한다는 규정에서, 재판의 직접 준거가 될 법령의 흠결 시 관습과 최후의 보충 법원으로서 ‘條理’는 “당시 입법자라면 제정했음직한 자연법적 합리적 법리”로서, 전통시대에는 당연히 성현의 경전 義理와 정신이 원용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에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는 심심치 않게 성경이나 셰익스피어 같은 대문호의 고전 내용이 일상다반사로 인용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법 실천관행은 사실 인간의 성문 실정법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동서고금에 당연히 예기되는 합리적·합정적 법문화 현상인 것이다. 실제로 후한 왕충은 “동중서가 올린 春秋의 義리가 모두 律에 계합하여 어그러지거나 다른 게 없었다.”고 전하면서, 춘추는 공자가 제작하여 漢에 물려준 經으로, 단지 법가만 존중하고 춘추의 고상함을 무시하는 건 어리석은 편견이라고 꼬집는다.105) 원심정죄를 빌미로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법권을 농단하는 간교한 혹리에게 원죄가 있지, 춘추결옥 원심정죄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이다.106)
사실, 독존유술 대일통 사상이 시대적 요청으로 등장한 필연적 산물이듯이, 춘추절옥도 당시 사회와 통치계층의 현실적 수요에 기인한 시절인연으로 출현한 것이다. 우선 기록상 분명히 동중서는 조정의 의안에 대한 자문 요청에 부응하여 춘추의 정신(經義)으로 답변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문제 때 張釋之가 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민심과 여론에 맡겨 형벌이 크게 줄고 단옥이 4백건밖에 안 되어 ‘형벌이 필요 없던(刑错)’ 풍조와는 대조적으로, 무제 때 중앙집권 강화와 대외정벌 강행에 잦은 징발과 부역으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간사한 범법이 폭증하자, 이에 대처할 廷尉로 기용한 張湯·趙禹 같은 酷吏들이 秦의 가혹한 법치유풍을 되살려 강력한 법령제정과 준엄한 재판으로 법망이 조밀해져, 律令 359章에 사형(大辟)이 409조 1882요건에 이르고 사형죄 판결사례만 무려 13,472건이나 되어 문서가 전각에 넘쳐 담당법관이 다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107) 그 결과 혹리들의 자의적 법적용이 횡행하는 가운데, 동중서는 조정의 자문요청을 계기로 법관의 ‘법에 의거한 청송과 처형’을 강조하면서, 덕주형보 사상에 부합하는 ‘정의에 의거한 법 적용’ 및 춘추결옥을 주창한 것이다. 이에 당시 가혹한 漢律을 부정·수정하고 백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비록 유심주의라는 힐난을 받긴 하지만 범죄사실과 동기 및 목적을 함께 살펴 고의범과 과실범을 분간하고, 예비·미수·중지범과 주범 및 종범을 구분해 형벌을 차별화하여 상당히 섬세한 법학이론을 구성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도 있다. 이는 후대에 오해하는 이른바 내심의 동기목적을 겨냥한 사상범 처벌과는 전혀 무관하며, 후대 왜곡과 오남용 부작용 폐해까지 동중서의 춘추결옥에 덮어씌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나마 유가 경전에 근거한 춘추절옥이 오히려 법가의 각박한 엄형중벌 재판을 상당히 제약하는 건전한 견제기능을 하고, 그 구체적 실제사례들이 축적되어 유가의 예를 율령에 공식 편입하는 ‘納禮入律’의 결과 隋唐律에 이르러 전통 율령체계의 완성을 이룩한 셈이다.108) ‘법의 유교화’든 ‘禮의 법제화’든, 유교경전을 통치이념으로 승화하여, 율령의 보완을 넘어서 율령의 정당성을 판별하고 개폐까지 촉구하는 권력제한의 기능도 수행한 것이다.109)
관점을 바꿔서 보면, 춘추결옥은 유학자의 言權(담론권력)의 실천이라는 막강한 기능을 수행한 통로가 되었다. 춘추시대부터 군자의 주요 立言 방식으로 애용된 ‘信而有徵’(春秋左傳, 昭公8年, 叔向의 말)의 경전인용은 주로 詩·書와 ‘君子曰’이 주류였는데, 사실 이는 합리적 논증이 부족한 권위에의 오류로 의심을 살 수 있지만, 동중서의 춘추결옥은 經義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가치관을 함께 인용하여 합리적 比附유추로 인정받는다. 비록 ‘君子原心’이 자의성의 빌미를 야기할 신비주의 색채가 짙긴 하지만, 천벌의 경고로 강조한 재이론과 더불어 조정의 정치의론에 유학자의 발언권을 강화한 역사적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110)
사실 근대 죄형법정주의와 고대 전통(書經) 법제에는 ‘의심스러운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라는 확고한 원칙이 공통인바, 현전하는 동중서 춘추결옥 구체사례 4건은 정확한 적용 법률 부재 시 춘추 경의를 인용하여 감면 방향으로 의론했는데, 근래 부정적 폐해 못지않게 인도주의 흠휼정신이 강하여 오히려 진보적이라는 긍정 평가가 높아진다.111) 사실 한무제 때 동중서와 사마천이 시기질투에서 비롯한 참소(讒訴)로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서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도 춘추결옥의 정신과 원심정죄 원칙을 자주 들어 훈습한 무제가 두 현인의 마음과 동기에 악의가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없다는 내적 자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Ⅷ. 결어
지금까지 동아시아 2천여년 전통왕조의 통치체제 확립에 직간접으로 지대한 공헌을 한 동중서의 시대적 배경과 다양한 법사상을 대강 살펴보았다. 한의 중원 재통일과 초기 사회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무제의 확장발전에 필요한 통치이념을 동중서가 춘추공양학의 대일통 정신으로 제공하면서 ‘독존유술’을 주창했지만, 그 사상에는 공맹의 정통 유학 이외에 전국 및 진한 초기에 성행한 제자백가의 학술성분도 상당히 녹아들었다. 특히 음양오행이론과 老子의 道論 및 법가의 통치술까지 융합되어 경세치용의 종합학문으로서 재탄생한 신유학이라고 불릴 만하다.
그가 제시한 삼강오상은 이후 전통왕조 예법의 핵심근간으로서 2천년을 지배하였고, 천인감응에 근거한 災異의 천벌론과 덕주형보의 법사상 및 춘추결옥의 원심정죄 사법원칙도 2천년 율령체제의 운영에 확고한 나침반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중서는 공자와 맹자를 이어 역사상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거유로서 명실상부한 유학의 정통 계승자로 평가된다. 누구나 시대적 소명이 있고, 개인이 초극할 수 없는 시대적 한계와 제약이 있기 마련이다. 비록 그가 근대화 이후 봉건 가부장제 유지에 기여한 어용학자라는 낙인과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의 ‘독존유술’의 대일통 사상이 당시 사회모순의 해결에 유익하고 사회발전을 촉진했다면 적극적 긍정평가가 마땅하며, 권력층의 왜곡이용이나 후대 사회변화로 인한 부작용폐해까지 그한테 책임을 전가함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다. “현대인이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을 고대 현인이 지는 것은 비현실적이다.”112) 예컨대, 화약무기 사고나 핵전쟁의 책임을 노벨이나 아인슈타인에게 덮어씌운다면 공정하겠는가?
더구나 대제국 한무제가 지엄한 위세로 생살여탈권을 휘두르던 당시는, 자유민주주의 현대는 물론 공자맹자가 활동하던 춘추전국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역사적 현실을 감안하면, 수천년을 생동해온 성현의 학술사상을 비천하고 경박한 필설로 쉽게 폄하할 수 없다. 역지사지해보면, 그런 비판자 중에 당시로 돌아가서는 물론 현재 자신이 처한 정치적 배경에서조차 지식인으로서 양심에 떳떳하게 소신껏 언행일치를 자신할 자가 과연 있기나 할까?
민본적 인도주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흉노에 대한 무력정벌보다는 화친회유가 훨씬 우수하다고 반전평화론을 강력히 주장하고, 절대지고한 하늘의 아들로서 천자의 천부왕권을 승인하면서도, 하늘이 인민을 위해 왕을 내린 뜻을 받들어 민생안정과 예악교화에 진력해야 할 도의와 책무를 강조하고, 특히 노비 제거(노예해방)까지 건의한 선구적 현량대책은 누구도 감히 흉내 내기 어려운 동중서의 훌륭한 업적이다. 다만 그의 대일통론은 후대 중화제국주의 확산에 결정적 대의명분을 제공하며, 역사적으로 왕조 교체에 따라 위구르·티벳·내몽고·연변간도 등을 차례로 강제 합병하고, 현대에는 중공 정권이 일대일로 차관제공 및 세계적 부정선거 기획으로 親中·從中 정권을 수립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사회주의 전략전술, 그리고 동북공정으로 우리 역사를 침탈함은 물론 괴뢰정권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속국화하려는 제국주의 야욕 등에 다양하게 왜곡·각색·악용되어 개탄스럽지만, 이 역시 동중서의 원죄라기보다는 확대지향적인 비열한 권력자들의 눈먼 탐욕 소치이니 이를 어찌하겠는가? “하늘의 그물은 아주 성글고 드넓어서 텅 빈 듯하지만 빠져나가는 놈이 없다.(天網恢恢, 疏而不失.)”는 老子의 자연법 인과응보에 맡기는 수밖에!